
경찰과 술 마시며 무면허 보철치료 단속 피해
사람들 의식 수준 높아져 돌팔이 점점 안찾아
1970년 영흥도 염전 사들여 소금 만들기 시작
분단 후 정부 장려정책에 민영 염전 우후죽순
대부도서는 옹기조각 까는 '옹기판' 아직 사용
발전소 들어서 염전과 함께 모친 묘소도 잃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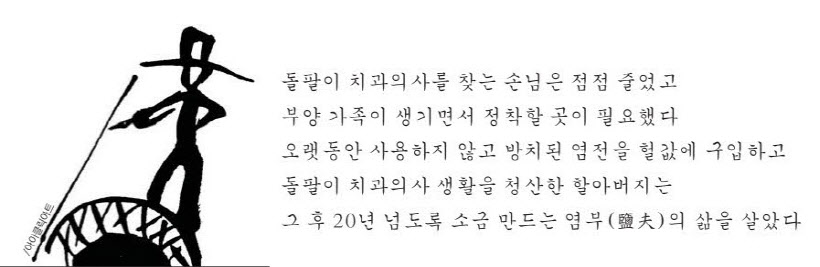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속 시원히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얘깃거리지만 당시 보건당국과 경찰의 감시가 삼엄한 가운데서도 길을 뚫었다.
김완수 할아버지는 단속을 피하려고 마을마다 있는 파출소 경찰부터 매수했다. '말이 통할 것 같은' 경찰에게 접근해 술을 사주면서 자신을 소개했다. "조용히 있다가 떠날 테니 모른 척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였다. 당연히 '경찰 사모님'은 무료로 시술했다.
"그럭저럭 일을 하다가 만석동 파출소장이랑 친해졌는데, 그때 파출소장이 '소개장'이란 것을 써주면 덕적도에 가서 거기 순경에게 보여줬어. 일단 술집으로 데려가서는 미안한데 몇 명만 치료하다 가겠다고 하면 처음에는 거절했지. 근데 안 되는 게 어딨어. 담뱃값 호주머니 찔러주고 술 한잔 사주면 다 해결됐지."
일단 경찰을 내 편으로 만들면 손님 끌어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가 아픈 사람을 수소문해 찾아가 공짜로 고쳐주면 그이가 다른 환자를 알아서 집으로 데려왔다. 할아버지는 이 하나당 쌀 한 말 값을 받았다. 일반 치과 진료비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싸게 박아 넣을 수 있는 의치를 '산뿌라치'라고 불렀다. 정확히 '산프라치나'인데 니켈과 크롬을 섞은 합금으로 가격이 싸 백금 대신 많이 사용됐다. 1959년 신문 기사를 보면 돌팔이 의사에게 '산뿌라치' 하나 박는데 1천환 정도 했다고 한다.
그때 단위가 가장 큰 지폐가 이승만 대통령 초상이 그려진 1천환이었는데 쌀 1가마(80㎏)가 1만1천600환 정도 했고, 신문 1개월 구독료는 500~600환 정도였다. 지금 신문구독료가 1만원대이니 요즘으로 치면 2만원대면 이 하나를 박는 셈이었다. 남몰래 '야매'(やみ)로 하는 것이니 그렇게 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순금 한 냥에 구리 서 푼을 섞어서 18K 금을 만들어야 돼. 순금은 너무 물러. 그리고 롤러로 밀어서 얇은 편철을 만든 다음에 이빨을 앞뒤로 찍어서 오려 붙이는 거야. 종이짝 반보다 얇은 차이가 나도 이가 아파서 못 씌워."

할아버지는 당시 의료당국 모르게 의료상에서 마취제를 구입해 사용했다. 김완수 할아버지가 쓴 마취제는 프로카인(Procaine)이었다. 노보카인(Novocain)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치과에서 국소마취제로 리도카인(Lidocaine)을 사용한다고 한다.
게다가 일반인이 마취제를 구입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프로카인 주사기는 쇠로 된 주사기로 해야지 유리 주사기는 터진다고. 그걸 두세 번 찔러서 마취시키고, 마취가 되면 '드라이버'처럼 생긴 걸로 잇몸을 쭉쭉 밀고 그러면 이빨이 빠지거든…."
치과가 흔치 않던 시절 시골 마을에서는 일반 의사가 치과 의사 역할을 대신했다. 평안북도 산주군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경제학 박사 최기일(1922~)의 자서전 '자존심을 지킨 한 조선인의 회상'에는 그의 유년기 시절 이를 뽑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노보카인도 사용하지 않고 집게로 그냥 내 아픈 이를 뽑아냈다. 그가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썩은 이가 호두처럼 쪼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의사라기보다는 목수였다.'
오늘날 불법 의료행위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존재한다. 가천대길병원 치과보철과 배정윤 교수는 "지금도 간혹 '야매 치료'를 받고 부작용으로 치과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며 "야매 보철치료는 처음에는 이에 맞는 것 같아도 잇몸과 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김완수 할아버지는 인천에서 떠돌이 치과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가 있는 충남 서산을 근거지로 뒀다. 1959년 서산에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부인을 만나 6남매를 뒀다.
결혼 후 의치를 만드는 작업은 집에서 했는데, 정교한 작업이라 아이들은 방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젊은 시절이야 돈 모으는 재미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떠돌이 의사생활을 하는 것이 버틸 만했다.
하지만,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 돌팔이 의사를 찾는 손님은 점점 줄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기면서 한 군데 정착할 곳이 필요했다. 할아버지는 1970년 무면허 치과를 하면서 번 돈으로 영흥도 염전 3정보(9천평)를 평당 200원씩 180만원에 샀다.
1950년대 생긴 염전은 소금장려정책을 펼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져 조성 원가가 그리 비싸지 않았다. 게다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염전이라 할아버지는 헐값에 구입할 수 있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970년 금 1돈이 약 2천800원이었으니 금 640돈 값을 주고 염전을 산 셈이다. 돌팔이 치과의사 생활을 청산한 할아버지는 그 후 20년 넘도록 소금 만드는 염부(鹽夫)의 삶을 살았다.
김완수 할아버지의 인생에서 염전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소수압도와 연평도를 거쳐 도착한 당진에서 염전 만드는 일에 동원됐고,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게 해 준 일도 염전이었다. 할아버지의 염전은 옹진군 영흥면 외2리에 있었다. 지금의 영흥화력발전소 근처다.
영흥도에 처음 천일염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라고 한다. 1950년대 분단 이후 정부의 소금생산 장려정책에 따라 서해안을 따라 민영 천일염전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인천의 대표적인 염전인 주안·소래·남동 염전은 모두 관영으로 운영됐지만, 당시 부천군이었던 대부도, 영종도, 영흥도 등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민영 염전이 들어섰다.
염전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조직한 인천염업조합의 가입자 숫자는 1949년 1곳에서 1956년 67곳으로 늘었다. 옹진군청이 관리하고 있는 폐염전 현황을 보면 영흥면에서 가장 오래된 염전은 1954년 3월 1일자로 신고된 염전이다. 할아버지는 영흥도에 '고씨네' 염전이 제일 유명했다고 기억했는데, 옹진군 폐염전 현황 속의 가장 오래된 염전의 주인이 바로 고씨였다.
천일염전 이전의 영흥도 염전 역사는 아주 길다. '옹진군향리지'(1996)는 '영흥도는 선재도 서쪽 7리 거리에 있으며 길이가 25리이고 넓이가 10리이다. 염부가 5호 있다'는 세종실록지리지 남양도호부 도서조(島嶼條) 기록을 인용해 500여 년 전부터 영흥도에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당시는 지금처럼 햇볕으로 바닷물을 건조시켜 소금 결정을 얻어내는 천일염이 아니라 가마에 짠물과 소금기 머금은 개흙을 끓여 소금을 얻는 자염(煮鹽)식이었다. 소금 굽는 터를 '염벗'이라고 했는데, 영흥면 내리에 염벗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인천의 연안 섬 지역 사람들이 소금 굽는 풍경은 당대의 문장가들에 의해 많이 그려졌다. 조선 후기 학자 이해조(1660~1711)는 그의 형 이희조가 1696년 인천부사로 부임하자 영종도 일대를 유람하며 '백운사조발(白雲寺早發·백운사에서 새벽에 출발하면서)'이라는 시를 남겼는데, 여기에 "어부의 집에는 가을날 배를 고치고 소금 굽는 집에는 저녁에 연기가 난다(漁家秋理舶 鹽戶晩生煙)"는 구절이 있다.
할아버지의 염전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처음에는 둑이 무너져 바닷물이 흘러들어 한 해 소금농사를 망치기도 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소금창고의 소금이 다 녹아버린 일도 있었다. 김완수 할아버지가 처음 염전을 넘겨받았을 때는 바닥이 지금의 타일식이나 장판식이 아닌 흙으로 된 토판이었다. 토판은 소금에 갯벌이 섞여 검은색을 띄었다.
타일이 도입되기 전에는 깨진 옹기조각을 바닥에 까는 '옹기판'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영흥도 바로 옆에 있는 대부도 동주염전은 지금도 옹기판에서 소금 생산 과정을 거친다. 할아버지는 1년에 60㎏짜리 1천500가마를 생산해 인천에 있는 소금 도매상에게 팔았다.
할아버지는 소금값을 얘기할 때 꼭 쌀값을 기준으로 했다. 평소에는 소금 1가마에 쌀 반가마 값을 받았지만, 소금 수요가 급증하는 김장철에는 소금 1가마에 쌀 1가마 값을 받았다고 한다. 임진왜란 시기 선비 오희문의 피란일기 '쇄미록'에도 '소금 13두를 팔았더니 쌀 12두6되이다'는 얘기가 나온다. 소금 값과 쌀값의 연동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다.
김완수 할아버지는 외리 염전이 1990년 후반 화력발전소 부지로 편입되자 내리로 이사왔다. 다른 염전들도 1997~98년 무렵 다 문을 닫았다. 할아버지는 지금 내리 해안도로에서 맏딸이 운영하는 칼국수 집에 머물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날이 좋으면 멀리 인천대교와 팔미도까지 보이는 전망 좋은 동네다.
할아버지는 외리에 발전소가 생기면서 염전만 잃은 것은 아니다. 아들 하나만 믿고 고향을 떠나온 어머니의 묘소도 함께 잃었다.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시려고도 했지만, 유골을 화장해 곱게 갈아 바다에 뿌렸다. 생전에는 가시질 못했지만, 바닷길을 통해서라도 아버지가 묻힌 고향 땅 벽성군에 닿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박완서 소설 '엄마의 말뚝'에 나온 것처럼 실향민들이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이야말로 '분단의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리라.
글/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임순석·조재현기자 sseok@kyeongin.com













![[실향민이야기 꿈엔들 잊힐리야·3]황해도 순위도 출신 임경애 할머니(2)](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701/20170125010017045000832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