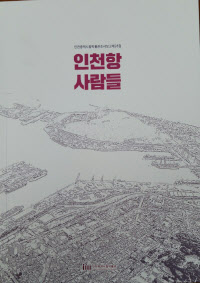
항만 종사자들이 바라본 항의 변화와 그 모습, 그리그 그 안에서 형성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조사보고서다.
시립박물관은 제물포라 불린 현재의 인천항이 도시의 형성과 변화, 도시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문헌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구술·채록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인천항의 변화상을 기억하는 항만 종사자들은 정년을 앞두거나 퇴직한 이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이 6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
박물관은 이들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본 인천항을 조사·기록해 두는 것이 통계나 각종 사료에서 볼 수 없는 인천항의 미시적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했다.
보고서에는 직종별로 30~40년간 인천항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13명의 인터뷰가 실렸다.
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줄잡이 송영일씨와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내리는 크레인 기사 김갑태씨, 배가 갑문을 통과해 내항에 정박할 때까지 길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갑문 관제사 김한기씨, 우리나라 최초 도선사인 유항렬씨의 이야기를 들려준 아들 유재공씨 등이다.
보고서를 보면 이들 가운데 타 지역 출신이 많다는 점도 흥미롭다. 인천에 잠시 머물다가, 혹은 일자리를 찾아 인천으로 왔다가 부두 일을 시작한 사람이 많았는데, 개항 이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인천의 도시 특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1974년 제2도크 건설 이후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인천항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들의 삶도 윤택해졌고 때로는 한 달 월급으로 작고 낡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기억도 있다.
인천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우리가 몰랐던 인천항의 모습을 일부나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더 늦기 전에 항만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과 그들의 집단기억을 되살려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