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김지태, 토호 집안 출생
동척 입사 5년만에 폐결핵 사직
농장·지물·주철·부동산등 번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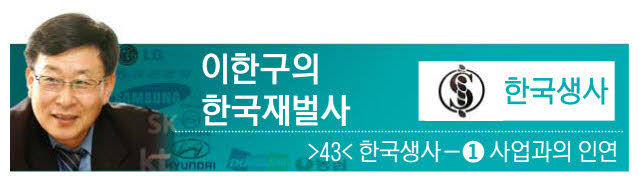
김지태의 조부 김채곤은 독실한 불교신자이자 이 지방 굴지의 부호로써 현 부산진초등학교의 전신인 '육영제(育英齊)'라는 청소년 교육기관 운영에 헌신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金사일 영감님'으로 칭송을 받았다.
부친인 김경중은 일본에 유학한 인텔리였으나 당시 망국(亡國)의 한과 시름을 술로 달래던 지식인들처럼 주유천하하며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르는 등 가정에는 소홀한 가장이었다.
김지태가 세 살 때 어머니는 외가가 있는 동래군 서면 초읍리로 이사했는데 좌천동에서 10여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이후부터 김지태는 외가 부근에서 생활했는데 그의 외조부 또한 대대로 부자소리를 들어온 지역토호이자 유학자(儒學者)였고, 외삼촌 이인우(李仁雨)는 독립군 간부로 만주에서 활동하다 분사한 항일투사였다.
유년시절 한학을 배우며 성장한 김지태는 이따금 외가를 방문하는 외삼촌 이인우로부터 나라사랑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인우는 독립군 군수품 부장으로 만주에서 활동하다 군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잠깐씩 고향집을 방문했던 것이다.
이후 김지태는 부산진공립보통학교에 진학해 산수, 지리, 역사 등 신학문을 접했는데 그는 특히 산수에 소질을 보였다.
학업성적이 우수했던 김지태는 보통학교 5학년 때인 1922년 4월에 영주동에 있는 3년제의 부산진공립상업학교(부산상고)에 입학했다.
1927년 3월에는 일제의 한국농촌 수탈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 부산지점에 입사했다. 동척은 일제가 한국농촌 장악과 식량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회사이자 식민지 전위기구였지만, 당시 청년들이 선망하던 '신의 직장'이기도 했다.
김지태는 동척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았으나 폐결핵으로 입사 5년만인 1932년에 사직했다. 대신 투병생활과 생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위해 동척 부산지점의 배려로 울산교외에 있는 동척소유의 농장을 경영하게 됐다.
동척에 상환할 연부금을 제외하고도 연 100석을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농장이었다. 더구나 동척은 10년간의 연부상환을 종료할 경우 김지태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했다.
10여명의 인부들과 함께 2만여 평의 농장을 운영한 결과 2년여 만에 생산량을 배가시켰다. 당시만 해도 국내의 농촌은 금비(金肥, 화학비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비료공급량이 부족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김지태는 친지인 울산 이규정(李圭正)의 정미소로부터 쌀겨와 퇴비를 제공받아 농사를 지어 생산량을 늘렸다.
농장경영으로 재미를 본 김지태는 1934년에 부산 범일동의 부산진직물공장을 인수했다. 종업원 70명이 역직기(力織機) 40대로 인견직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이었으나 김지태는 경영미숙과 자본부족 등으로 인수 1년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사업은 열과 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직물공장 경영에 실패한 김지태는 1935년 9월에 부산 범일동에서 지물류 생산을 목적으로 한 조선지기(朝鮮紙器)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부산의 지물도매상 추야상점의 후원하에 사업자금은 울산농장을 담보로 부산 제2금융조합으로부터 융자받아 충당했다. 중일전쟁 직후 전쟁특수로 인해 지물류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사업에 자신을 얻은 김지태는 사업 확장을 시도했으나 자금이 충분치 못해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평소 바둑을 통해 친교를 쌓은 식산은행 부산지점장 일본인 백석(白石)과 접촉해서 자금난을 타개했다.
백석은 평소에 김지태의 인품을 잘 알던 터여서 선뜻 거액의 신용대부를 제공했다. 신용대부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김지태는 조선지기의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조선주철합자회사(朝鮮鑄鐵合資會社)를 인수했다. 당시는 중일전쟁으로 군수공업붐이 조성되던 때여서 조선주철도 번창했다.
조선지기는 일본 최대의 왕자제지와 거래할 정도로 성장했다.
김지태는 부동산 투자사업까지 겸영해서 약관 30세에 부산실업계의 유망한 기업가로 떠올랐고, 해방 직전에는 5천석 지기의 부자반열에 올랐다.
/이한구 경인일보 부설 한국재벌연구소 소장·수원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