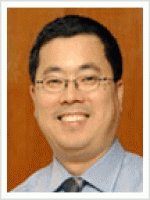변죽만 울리다 지정 철회후 특별관리 번복
주민만 골탕… 6·17 부동산 대책 낙제점속
정부 추가대책엔 '새공공택지에 포함' 마땅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세가 여전하고, 전세는 매물을 감췄다. 국민들 마음은 탈탈 털렸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이 폭발했다. 30·40대도 등을 돌렸다. 여권의 든든한 지원군이 변심한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청와대는 사과했고, 여당 대표가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21차례나 대책을 내놨는데 약발은 없었다고 비판한다. 국토부는 단편 빼면 종편은 4번뿐이라고 부득부득 우긴다. 효과 검증이 실없는 차수 논쟁으로 번졌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때려잡기'는 두 갈래다. 중과세와 규제 강화가 한 묶음인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 방안이다. 조세와 규제는 상황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 해도 뒤탈은 별 게 아니다. 반면 공급의 변환은 후유증이 심각하다. 보상이 따르는 공공 개발은 덤이 분명하나, 바뀐 정부가 변죽을 울리거나 늘어지면 재앙(災殃)이 된다. 광명·시흥이 그렇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7.4㎢를 묶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정했다. 함께 지정된 4개 지구와는 비교 불가한 매머드 체급이다. 분당신도시(19.6㎢) 버금가는 면적에 사업비가 23조9천억원(2010년 기준)이다. 국토부 행동대장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낙점됐다. 주민들은 들떴고, 지역은 요동쳤다. 장밋빛 전망이 나돌았고, 조용하던 마을이 북적였다.
요란 법석은 오래가지 않았다. 스텝이 꼬였고, 나가야 할 진도는 제자리였다. 거래는 묶였고, 토지와 건물 보상은 기약이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보금자리가 애물단지 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꿈은 악몽이 됐다. 불안과 불만이 폭발 지경이었다. 보상을 염두에 두고 돈을 끌어다 쓴 주민은 피눈물을 흘렸다. 정부는 4년이 지난 2014년 지구 지정을 철회했다. 재원이 부족하고 사업성이 나빠졌다고 발뺌했다. 수도권에 새 정부 신상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유행할 즈음이었다. 전(前) 정부 상품을 용도폐기한 거다.
지구 해제 뒤 광명·시흥지구는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1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되나, 그 사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이번에도 LH는 딴청이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개발'을 제시했다. '주민 스스로'는 역부족이다. 또 5년이 지났다. 주민들은 공동대책위를 만들었다. 14개 마을별로 각개 전투를 하거나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출발이 앞선 동네는 진척이 빠르다. 정비사업 계획안을 내놨다.
광명시와 경기도, 국토부는 엇박자 행보다. 시는 개별 사업이 난개발을 초래한다며 난색이다. 주민들이 어깨동무해야 빨리 갈 수 있다고 설득한다. 도는 어정쩡하다. 결정권한이 없다며 선을 긋는다. 관리계획 변경 권한을 쥔 국토부 눈치를 본다. 중앙정부는 팔짱을 풀지 않는다. 지자체가 알아서 추진하라는 거다. 주민 주도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약속했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한다. 주민들만 죽을 맛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은 국정의 최대 현안'이라고 했다. 관련 부처에는 보완책을 주문했다. 징벌적 조세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 대책을 서두른다. 7월 중 국회 통과가 타임 라인이다. 다주택자·임대법인의 등록세와 보유세 양도세 중과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수도권 4기 신도시가 거론된다.
광명·시흥지구는 후보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에 서울 구로와 마주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길 하나 건너면 서울이고 강남이다. 강남 대체재에 목마른 무주택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 고양 하남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지역을 쪼개도 분당 절반의 주거물량이 확보된다. 지친 주민과 지역이 막아설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22차 부동산 대책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새 공공택지는 광명·시흥이어야 마땅하다. 이만한 입지와 조건이 없다. 주민들의 '10년 눈물'을 그치게 할 처방이다. 일석이조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