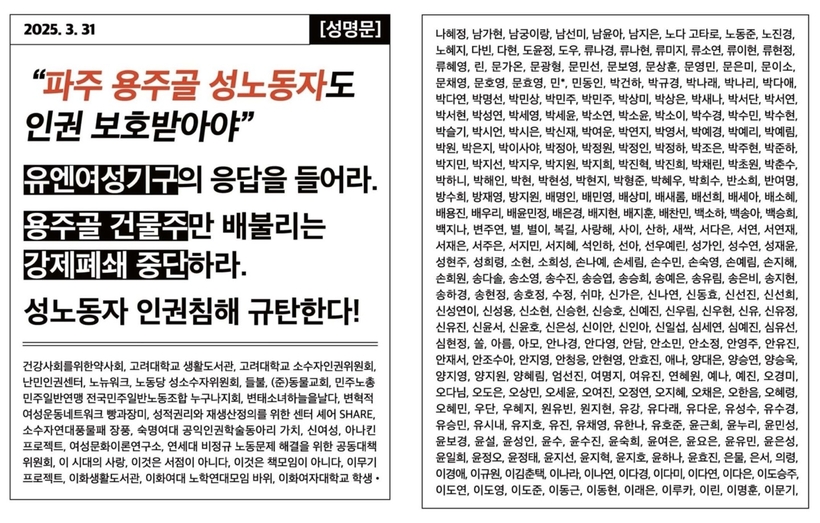성거산 은둔삶 사는 '서경덕' 찾아가
교태에도 요지부동하자 존경·흠모
그가 세상 떠나자 詩 한편 남긴다
'…주야에 흐르니 옛 물 있을소냐
인걸도 물 같아 가고 아니 오노메라'

임제(1549~1587)는 당대 필명을 날리던 시인이며 문신이었다. 1583년 평안도 도사가 되어 임지로 가던 중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 추모의 시를 썼다. '송도의 명기 황진이의 무덤을 보고 이 노래를 지어 조문하다'라는 제목의 시는 널리 알려진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홍안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허하노라'다. 임제는 이 추모 시로 파직을 당하고 세상을 떠돌며 시를 읊었다.
황진이의 남성 편력은 화려했다. 당시 생불이라 일컫던 지족선사를 파계시켜 '십년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경구를 만들기도 했다. 왕족 벽계수의 콧날을 꺾기 위해 지은 시도 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 마라/일도창해 허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명월이 만공산 허니 쉬어간들 어떠리'가 그것이다. 벽계수도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다. 명창 이사종과는 6년간 약정하고 함께 살기도 했다. 대제학과 판서를 지낸 소세양은 '황진이라도 한 달이면 족하다. 하루도 더 머물지 않겠다. 단 하루라도 더 머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호언장담했으나 한 달 지나고도 며칠을 더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넘지 못한 준령이 있었다. 화담 서경덕(1489~1546)이었다. 그는 스스로 깨달아 얻은 학문적 독립성으로 일관한 삶을 살았다. 그는 어지러운 세상, 관직에 나가지 않고 처사의 길을 걸었다. 조광조가 거듭 조정에 나올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학문적 정통성과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얻은 이치였고 만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이었다. 그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하여 매일 들에 나가 나물을 뜯어야 했다. 그러나 돌아온 바구니에는 나물이 적었다. 어머니가 이유를 물었다. "나물을 뜯다가 새끼 새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날은 땅에서 한 치 정도 날다가 다음 날은 두 치, 그 다음 날은 세 치 정도 날다가 점차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새끼 새가 조금씩 더 날게 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 이치를 깊이 생각해보았지만 터득하기 어려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세채(1631~1695)의 '남계집'에 기록된 일화다.
서경덕이 송도 부근 성거산에 은둔하여 은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황진이가 찾아갔다. 황진이의 교태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서경덕을 황진이는 존경하고 흠모하게 되었다. 서경덕 또한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만중운산에 어느 임 오리마는/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를 읽노라면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알 수 있다. 황진이의 연모도 이에 못지않게 절절하다. '내 언제 무신하여 임을 속였기에/월침삼경에 올 뜻이 전혀 없나요/추풍에 지는 잎 소리야 낸들 어이 하리오'에는 원망과 사랑이 넘친다.
서경덕은 1546년 5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제자들이 임종을 지키며 그에게 물었다. '스승님, 지금 심경이 어떠하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은 지 이미 오래이니 내 지금 마음이 편하구나'.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황진이는 시 한 편을 남긴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주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소냐/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노메라'.
/김윤배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