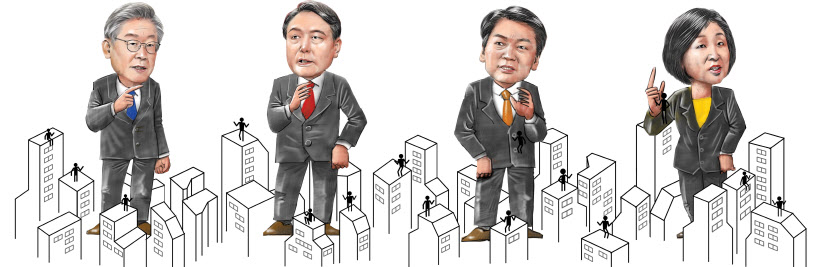

당초 대통령 선거 후보경선을 치를 때만 해도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의 텃밭'으로 여겨졌다.
이 후보 역시 이 점을 큰 자랑거리로 내세웠고, 경기도 민심도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배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대선이 깊어질수록 수도권 민심은 그 어느 쪽에도 큰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부동층 비율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실제 유세현장 등에서 만난 유권자들 상당수는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수원역에서 만난 33살 청년 유권자는 "누굴 뽑을지 결정 못했다. 후보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아 정말 내키지 않는 선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권자들은 정책이 사라지고 '네거티브'만 판치는 이번 선거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수원 권선동에서 만난 51살 김 모씨는 "이번 대선처럼 비호감 후보만 나온 적은 처음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만 해도 일 잘할 줄 알았는데 하는 발언마다 무지함을 드러냈고 법인카드 사용 등 자꾸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이 후보도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인천 지역 역시 표심의 향방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지 후보를 겉으로 나타내지 않은 이른바 '샤이 지지층'의 움직임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이 이번 선거전의 남은 변수라는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인천은 대선 민심 바로미터로 불린다. 특히 지난 19대와 18대 대선에선 당선인의 전국 득표율과 인천에서의 득표율 차가 각각 0.12%p, 0.02%p에 불과했다. 17대 대선에선 당선인의 전국 득표율과 인천 득표율 격차가 0.55%p였다.
최근 3차례의 대선에서 이 같은 결과는 주요 정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역 유세에서 "인천에서 이기면 대통령이 된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배경이 된다.
인천 서구에 사는 직장인 37살 최모씨는 "대선 후보들의 안 좋은 점들이 쉽게 보이다 보니, 선택할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아닌, 그나마 덜 싫은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쉽다"고 했다.
/이현준·공지영기자 upl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