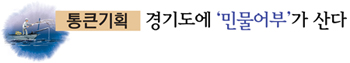"(고기가) 없어, 올해는 없어도 너무 없네."
지난달 29일 오후, 이씨의 배를 타고 함께 평택호로 나갔다. '청용호'라고 적힌 작은 배가 평택호 물살을 가로 질렀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강물 위에 떠 있는 하얀색 플라스틱 통에 가까워졌다. 어망이 설치된 수역이다.
이씨가 그물을 천천히 끌어올렸지만, 그물은 텅 비어 있었다. "고기가 안 나오는 날도 있을 수 있지만,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최근 평택호를 점령한 무용생물 '강준치'도 골치다. 배스와 블루길은 이미 토착화됐는데, 여기에 강준치까지 늘어나면서 고유 어종의 알을 다 잡아먹고 있다. "그물 꺼내면 강준치 같은 외래종이 절반이야, 얘네들이 붕어 새끼를 다 잡아먹으니까 고기들이 계속 줄어들지."
한 번 강에 나가면 기본 3시간 조업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날은 오전에 고기가 없어 오후에 또 한 번 나왔다. 또 다른 수역으로 이동하자, 수많은 작은 고기 속에서 값을 받을 만한 큰 고기가 나왔다.
이렇게 잡은 고기들은 이제 음식점이 아닌, 대부분 낚시터로 간다. "민물 고기 파는 가게들이 많이 사라져서 지금은 대부분 낚시터에서 가져가지."
이씨는 평택호 어부 중 나이가 가장 많지만, 여전히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 중 하나다. 40년간 쌓은 경험 덕이다. "평택호에서 평생이야. 아산만 전체를 다 알아.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고기의 흐름은 어떤지 손바닥 안이야." 그는 민물어업을 공부했으면 박사까지 땄다며 자부심도 드러냈다.
외래종 '강준치' 점령 토종 씨 말려
평택호, 한때 100여명서 현재 41명

비록 이날은 만선(滿船)을 이루지 못해 한숨을 쉬면서도 이씨의 얼굴은 어둡지 않았다. "고기가 안 나와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 날 따뜻해지면 나오겠지, 내일은 더 잡히겠지 하면서 일하는 거지." 무엇보다 이씨는 8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자신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은 이 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데 감사해 했다.
"딸들이 맨날 '아빠 그만해' 그러지. 근데 내가 할 수 있잖아. 젊었을 때도 그렇고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지. 이제는 자식보다 나를 위해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노가다(일용직) 하겠다고 해봐 누가 써주겠어. 배는 나이가 들어도 탈 수 있잖아."
이씨와 평생을 일했던 어부들은 둘 중 하나다. 떠나거나, 함께 나이가 들어가거나. 한창 내수면 어업이 활성화했을 때만 해도 평택호 어부는 100여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41명이 전부다. 이 중에서도 이씨처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업으로 배를 타는 어부는 20명도 채 되지 않는다.
평택호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수면 어가·어부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도내 어가·어부 수는 1980년 3천363명(어가 617가구)에서 지난 2020년 1천144명(어가 415가구)까지 줄었다. → 그래프 참조
어릴 적부터 늘상 오가던 평택호에 대한 애정도 이씨를 붙잡고 있다. 이씨를 비롯해 평택호가 삶의 터전인 '평택호 어업계'가 자발적으로 평택호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평택호가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쓰레기가 엄청나. 그걸 볼 때마다 여기도 언젠가 고갈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배 타고 나가는데 쓰레기라도 줍자 했지."
'평생 터전' 애정에 그물 던지지만
"고기도 없고 하려는 사람도 없어"

이들은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 후대에 여기서 일할 어부들을 생각해서 쓰레기를 줍는다. "내가 나이가 들어 지금 고기 잡는 수역에서 빠지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겠어. 그때까지 쓰레기 주우며 평택호를 지켜야지."
평택호는 이씨의 삶 전부가 담겨있다. 물이 불어 위험하지만 않으면 항상 이씨는 평택호에 배를 띄웠다. 힘닿는 데까지 고기를 잡으며 살겠다는 게 이씨의 꿈이지만, 아무리 애정이 담긴 일이라도 자식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자식들한테 물려 주겠어. 그렇다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나야 가난할 때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 일을 했지만,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아. 할 사람도 없고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동안 해온 나나 부지런히 하는 거지."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