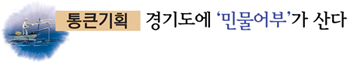제 아들도 물려받고 싶어하는 산업으로 키우고 싶어요
이 같은 수조는 비닐하우스 두 동에 총 110개가 놓였는데, 수조 안에는 임진강 명물인 황복과 뱀장어가 자라고 있었다.
'지수식'서 '순환 여과식' 전환
여기는 내수면 양식 후계자 유재인(46)씨의 일터다. 유씨가 내수면 양식 어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이다. 대학생이었던 유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뱀장어 양식장을 돕다, 아예 대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본격적으로 내수면 양식에 뛰어들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1980년대 뱀장어 양식장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냥 어깨너머로 보다가 (물)고기 키우는 것에 재미가 생겨 대학도 수산대로 갔어요. 근데 98년도에 수해가 크게 두 번 나면서 양식장이 다 잠기고 직원들도 나가고, 손이 부족해져서 제가 돕다가 아예 같이 운영하게 됐죠."
양식장 안에서 자라는 고기들을 보며 유씨는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병에 안 걸리고 더 잘 자랄 수 있을까',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특히 황복의 경우 부화는 쉬운데, 성어까지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보통 황복이 성어가 되기까지 3년 이상이 걸리는데, 폐사율이 50~60%에 달해 키우면 손해가 더 컸다.
"황복은 폐사율도 높고 예민해서 성어까지 키우는 곳이 거의 없어요. 돈을 써서 열심히 키워도 폐사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황복이 살기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해 '황복 전용'으로 수질과 온도 등을 달리해 폐사율을 크게 낮췄죠."
"4번째 양식장 새로운 어종 고민"
양식장을 '지수식'에서 '순환 여과식'으로 전환한 것도 그의 노력 덕이다. 처음 유씨와 유씨의 아버지도 면적 200여㎡의 콘크리트 수조를 이용하는 지수식으로 양식했는데, 시행착오 끝에 2002년 순환 여과식 전환을 완료했다.
"순환 여과식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양식장 물 재사용률도 90%이고 생산량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료 종류 등 유럽과 국내 양식 환경이 다른 부분이 있어 어려움도 있었어요."
유씨의 아버지는 은퇴했고, 현재는 유씨 혼자 양식장을 운영 중이다. 하나로 시작했던 양식장은 3개까지 늘어났는데, 4번째 양식장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새 양식장에서는 새로운 어종을 키워보려고 해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사라진 우리나라 고유 어종을 살리는 양식을 해보고 싶어요."
비록 내수면 어업이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유씨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그의 꿈은 자신처럼 아들도 물려받고 싶어하는 산업이 됐으면 하는 것. "어로 어업도 그렇고, 양식 어업도 현재 힘든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수면 어업이) 다시 빛을 봤으면 좋겠어요." → 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경기도에 '민물어부'가 산다] 내수면 어업 위기 극복 '전문가 제언')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