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출형 똑버스… 일괄 확대 불가능
시·군 이해관계 등 준공영제 난항
수도권 통합교통권 과제만 떠안아
■ 대부도 등하굣길 책임지는 똑버스…확대는 '부담'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4시30분께. 하교를 알리는 종소리가 안산시 대부도 대부중·고등학교 일대에 울려 퍼진다. 하나둘씩 무리를 지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나선다. 삼삼오오 이동하는 행렬 사이에서 안도연(15)군은 휴대전화를 꺼내 '똑타' 앱을 실행했다.
이윽고 안군이 탑승할 정류장이 안내됐고, 10여분 뒤 집으로 향하는 '똑버스'가 도착했다. 안군은 "원래 엄마가 아침저녁으로 데리러 오셨는데, 이제는 똑버스를 타고 편하게 혼자서 잘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학교 정문 앞 정류장에서는 20분여 동안 똑버스 4대가 학생들의 하굣길을 책임졌다.
7개월 전 대부도에 정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는 이곳 학생들의 통학 길을 크게 바꿔 놓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40.34㎢)에 이르는 대부도에서 재학생 150여명의 대부중·고등학교는 각각 유일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다. 과거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30분을 넘는 시내버스만을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노선이 먼 가구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가용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콜택시처럼 휴대전화로 호출해 이용하는 똑버스가 생긴 뒤 스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생업에 종사 중인 부모들은 물론 학교 교사들까지 편의를 체감하게 됐다. 대부중·고등학교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대부도 지역민 대부분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어 증차까지 바라는 분위기"라고 했다.
올해 초부터 도내 9개 시군에서 100대 가까이 운행되고 있는 똑버스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서 운행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까지 잇따르지만, 각 31개 시·군 지자체별 상황이 상이한 탓에 일괄적인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교통정책과 중첩되거나, 수요 파악이 어려워 예산 분담에 부담을 표하는 등의 이유다. 실제 파주와 남양주 등의 일부 농촌지역에서 똑버스 도입·증차가 논의되다 결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 섬마을부터 신도시까지…교통격차 해소 '독박' 쓰나
신도시부터 섬마을, 군사 접경지까지 아우르는 경기도는 대중교통 정책에서 지역 간 교통여건 편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올해 초 도입한 똑버스 정책뿐 아니라, 매해 파업 위기를 초래하는 버스 '준공영제'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민간 운수회사들의 적자 일부를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민간에 운영을 맡기되 교통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해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취지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관내 버스회사들과 합의해 전면 준공영제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역버스와 일부 시내버스를 제외하곤 80%가량의 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등에 비해 수요가 적어 운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른바 '적자 노선'이 많아 전면적인 보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준공영제 지자체보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도내 운수종사자들은 매해 파업 직전까지 치닫는 노사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준공영제는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 참여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여겨진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인천과 달리, 경기도는 각 31개 시군과 버스회사들이 각각 다른 방식과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 통합 교통권이 갈라지지 않도록 가장 변두리 주민들까지 동행할 수 있는 과제를 경기도가 떠안게 된 상황이다. 과제를 던진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환경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서둘러 편입할 것만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초 시범사업부터 경기도와 인천시가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두 지자체는 연신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김산기자·김지원·이영지 수습기자 mountain@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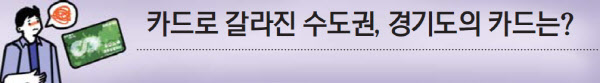













![[카드로 갈라진 수도권, 경기도의 카드는?·(上)] 도민 부담 가중 '통합 생활권' 의미 퇴색](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0/20231004010000506_1.jpg)
![[카드로 갈라진 수도권, 경기도의 카드는?·(下)] 격랑에 빠진 '통합 정기권' 올바른 방향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0/20231011010001751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