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들 '보증금 대란' 걱정
숙박시설 전환땐 세입자 보호 안돼
"두달새 4명 나가… 자금 마련 진땀"
연말까지 전환 못하면 이행강제금
규제로 거주시설 허가도 쉽지 않아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생숙 수분양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2023년 4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입주자-국토부 입장차 팽팽)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규모 임대형 생숙 운영자들도 임차인들의 이탈로 인한 '보증금 대란'을 우려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생숙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해 장기투숙할 수 있다. 이에 주택수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주거용 상품으로 주목받았고, '프리미엄피'를 받고 구매할 정도로 분양가가 치솟으며 많은 수요가 몰린 바 있다.
그러나 생숙이 편법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계속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생숙 운영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분양이 아닌 10층 내외의 소규모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생숙을 운영하던 자들은 생숙이 숙박시설로 바뀌면 임차인들이 선순위 변제 등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괄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보증금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수원에서 임대형 생숙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임차인 4명이 한 번에 나가면서 보증금 마련에 진땀을 뺐다. A씨는 "두 달 사이에 임차인 4명이 지방발령 등의 이유도 아닌데 불안함에 한 번에 나가면서 보증금 마련에 곤욕을 치렀다"며 "이들의 전세보증금 4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가족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임대형 생숙 운영자 B씨는 "분양받은 자들은 생숙을 투기 상품으로 여기지만, 임대형 생숙은 대부분 정부 정책을 보고 노후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모아 지은 생계형에 가깝다"며 "숙박업으로 변경되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채무이행각서를 쓰는 형태로 계약해야 하는데,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도 큰 상황이라 부동산 계약서가 유효한 올해 안으로 임차인들이 나가려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숙박업으로의 전환도 여의치 않을뿐더러 오피스텔 등 거주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 해도 지자체에선 규제 등을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아 운영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원래부터 '(장기)숙박'시설이라 주거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고, 숙박시설은 건물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적어 소방법이나 주차면 등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거주시설로 사용하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에 맞게 시설을 고쳐야 한다"면서도 "분양이 아닌 건물 전체를 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고, 현재 지자체와 연계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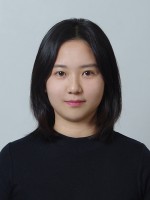





![[이슈&스토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입주자-국토부 입장차 팽팽](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4/20230414010005450000270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