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폐쇄 이후 고시원 등 이주
서울시, 기재부 잠실 땅과 맞교환
"광명에 있지만 단절된 공간" 기억
2018년 원점 회귀 후 또 6년 흘러
보람채 아파트의 정식 이름은 '서울시립미혼여성근로자임대아파트'. 이름처럼 보람채 아파트는 애초의 취지가 구로공단 여성근로자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1986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로 총 4개동이 1차 준공돼 총 200세대가 입주하며 약 1천명 정도가 살았다. 보람채가 아니라면, 당시의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했기에 수요는 계속 증가했고 1988년 5개동이 추가 준공되며 총 450세대로 늘어났다.
■ 세월이 흘러도, 가진 것 없던 청년의 기반
정애씨가 살았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후반까지는 정애씨와 같은 공장 노동자들이 대다수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며 디지털산업단지로 구로공단이 변화했고 입주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졌다. 서울시내 업체 소속, 28세 이하 미혼 근로여성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은 월급 100만원 초반대의, 가난한 여성청년들이 대상이었다.
실제로 보람채를 위탁운영했던 한국청소년연맹이 발간한 '서울특별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35년사'를 보면 2000년대 초반 입주자들 학력은 약 56%, 절반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든 청년이었고 초대졸 이상이 41%로 그 뒤를 이었다.

처음 입주했던 1980년 후반, 중학교를 졸업하고 구로공단 공장에 취직한 여공들보다 학력 수준은 올라갔지만 학력별 임금 격차가 심했던 2000년대 초반을 감안하면 임금수준은 여전히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21세기에서도 보람채는 가난한 청년노동자들의 '기반'이었다. 당시 임대보증금은 13평형이 23만7천220원, 월 임대료는 7천900원으로 매우 저렴했다. 이때에도 1세대에 4명이 함께 살며 난방·수도·전기·가스사용료와 같은 관리비는 함께 납부하며 부담을 줄였다.
가난한 여성청년노동자에게 든든한 바탕이 돼줬던 보람채는 2015년 폐쇄됐다. 딱 서른해 동안, 제 몸 하나 뉘일 곳 없던 낯선 서울 땅에 엄마 품 같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었다.
폐쇄 이후 이들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마련한 또 다른 임대아파트로 이주하거나,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구해 독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시원 등으로 옮겨 다시 21세기판 닭장집을 가야하기도 했다.
■ 청년의 꿈 사라지고 방치된 보람채, 물거품된 광명의 노력
청년들이 떠나고, 보람채는 광명에 덩그러니 남았다. 보람채가 처음 건설됐던 1980년대야 국가가 도시개발의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드는 시대였으니, 어쩔 수 없다손 치지만 문을 닫은 2015년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지 23년이 되는 때였다. 1981년 광명시가 시작되고 43년이 흐른 2024년, 여전히 보람채는 국가 소유의 땅이고 건물이다.
오랫동안 광명에 살았던 토박이 시민들은 '광명에 있지만 광명과는 단절된 공간'이라고 보람채를 기억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 사는 곳이었다면 으레 소통하고 교류할 법도 한데, 그런 정 하나 없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후 철문만 굳게 닫힌 채 도시 속의 '섬'처럼 남겨졌다. 그것이 광명시민들이 서운하고 속상한 이유다.

이런 분위기를 잘 아는 탓에 민선7기 들어서부터 광명시도 부지런히 움직였다.
민선7기부터 광명시를 움직여온 박승원 시장은 2018년, 수년째 방치되고 있던 보람채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를 여러차례 찾아갔다. 어떻게 개발할지를 두고 여러 방면에서 논의를 이어가던 중, 돌연 서울시가 국가(기획재정부) 소유의 잠실땅에 국제교류단지 개발 계획을 세우며 보람채와 잠실땅을 맞교환했다.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보람채의 역사를 계승하려면 여성청년노동자들의 근로·생활실태를 보존하는 기념관도 만들고 청년혁신타운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서울시랑 개발을 논의했었죠. 그 과정에서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차라리 기재부와 함께 보람채의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설득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정무적 판단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람채는 또 광명의 노력과 입장과는 상관없이, 다시 원점이 됐다. 그리고 또 6년이 흘렀다.
/공지영·김성주·이영지기자 jyg@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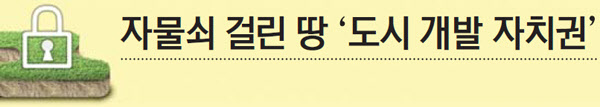














![15평 '대궐'서 쏘아 올린 작은 희망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上)]](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2401000246600025311.jpg)
![서울 역할·기능 대신한 건물들, 흉물 전락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中)]](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27010003073_1.jpg)
!['도시개발 족쇄' 걸린 위성도시의 비애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中)]](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27010003106_1.jpg)
![국가가 방치한 '보람채'… 보람 찬 가치 발견한 주민들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下)]](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2801000328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