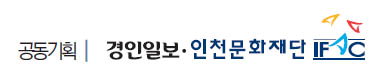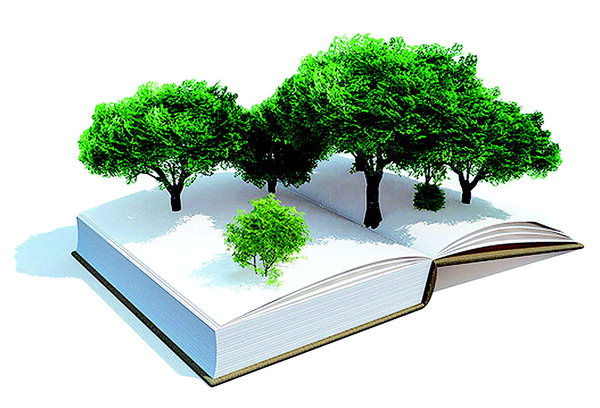
철도가 독서 습관과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꾼 근대적 독서의 산실이라는 것은 일반상식이 되었다. 철도망의 확장으로 인해 신문과 잡지 등 근대 미디어들이 전국에 유통될 수 있었으며, 장거리 철도여행의 지루함을 산업화한 읽을거리(Railroad Story)들의 등장을 촉발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도여행이 보편화하면서 소리내서 책을 읽는 전통적인 낭독 대신 조용히 책을 보는 근대적 묵독으로 독서의 습관과 패턴이 급속히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새롭게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바짝 몸이 단 것은 출판업자들과 신문사들이었다. 특히 사세의 확장과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신문사들의 경쟁은 갈수록 가열되어 갔다. 이같은 맥락에서 1931년부터 수년간 지속된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드 운동은 전국적인 문맹퇴치운동으로 한국 계몽주의 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성과였지만, 동시에 이는 민중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독자로 만들려는 구독자 확보운동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브나로드 운동의 대표적인 성과가 심훈(1901~1936)의 '상록수'이다. '상록수'는 동아일보사의 창간 15주년 기념 현상공모에 당선된 장편소설로 춘원 이광수의 '무정' '흙' 등과 함께 한국 계몽주의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심훈은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과 광복의 순간을 고대하는 격정적인 시 '그날이 오면'(1931)을 남긴 시인이면서 또한 1925년 이경손 감독의 영화 '장한몽'의 주연 이수일 역을 맡아 열연했던 영화배우이기도 했다. 후일 그는 자신이 각본과 감독을 맡고 고려영화사에서 '상록수'를 영화로 만들기도 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무산됐고, 1961년에 가서야 신상옥(1926~2006) 감독에 의해 영화화될 수 있었다.

"심훈 씨의 소설을 보면 남자 주인공이 수원고농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주인공 모델은 자기 집안 사람인 심재영 씨로, 고향에서 농촌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수원고농 출신은 아니었어. 그 분을 소설에서는 용신 양과 연결시켜 러브스토리로 만든 것이거든. 소설은 사랑 이야기가 없으면 안 팔리니까."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 역을 맡은 국민배우 최은희의 열정적인 연기와 단아한 모습에 매료돼 채영신 혹은 최용신하면 최은희의 이미지부터 떠올리는데, 실제로도 그러했던 모양이다. 수원고농에 재학중에 수원 서호(祝萬提)에서 직접 최용신 선생을 만난 적이 있는 류달영 교수는 그를 중키에 날씬하며 오똑한 코와 지혜로운 눈동자 그리고 마마로 얽은 얼굴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의지적 인물로 회고하고 있다.
당고개와 오이도를 오가며 수도권 시민의 발로서 그 소임을 맡고있는 4호선 상록수역은 그러한 최용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심훈의 동명소설의 이름을 딴 전철역이다. 상록수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빠져나와 도보로 10분 남짓 걸어 올라가면 그곳에 최용신 묘와 기념관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인근에 수인선 사리역이 있었다.

수인선과 지하철 4호선의 합류 지점은 한대앞역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록수역은 수인선 사리역과는 무관하다. 다만, 한대앞역과 상록수역 사이 그리고 시곡중학교와 오목골 공원 사이에 수인선 사리역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공원으로 단장되어 옛 자취를 찾기 힘들고 토박이 어르신들의 기억속에 흐릿하게 남아 그 이름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사리역 일대는 역사도 미처 기억해 줄 수 없는 작은 공간이지만, 적잖은 변화를 겪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성곶면 사리였다가, 1906년에는 안산군 성곶면 사리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수원군 반월면 사리로, 1949년에는 화성군 반월면 사리로 바뀌더니 1986년에 안산시 사동이 되었다.
원래 야목과 사리 구간 일대는 동화천 하구로 과거에는 바닷물이 유입되던 포구였다. 사리역은 고도 성장의 신화와 억압적 정치현실 사이에서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쉬고 싶었던 수원·화성·인천시민들의 휴식공간이었다. 주말이면 시민들이 사리역 근린의 저수지와 하천으로 낚싯대를 들고 모여들었고, 요즘처럼 한파가 휘몰아치는 겨울에도 얼음끌 대신 데꼬(てこ)라고 불렀던 끝이 뾰족한 쇠지렛대로 땀을 뻘뻘 흘리며 얼음구멍을 뚫었다. 고기를 몇 마리 잡았느냐하는 것은 중요치 않았다. 오직 사리로 겨울 낚시를 왔다는 것, 그리고 아직 레저 문화가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비록 풍요로운 시절은 아니었지만, 수인선을 타고 사리로 낚시를 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신나고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 같았던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기차 차창 밖으로 펼쳐진 경치를 실컷 구경하고, 공상하고, 책 읽고, 졸며 낚시를 떠날 수 있었던, 그 싱싱한 갯벌 냄새와 바람을 쏘이고 싶다. 인생의 소소한 이치를 이해하여 삶의 신비가 없는, 말을 삼키며 교언영색을 일삼는, 노회한 중년보다는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이 외쳤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홍안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