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 동명초교 설립 박창례 선생

일제 강점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교육받지 못한 수백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리 말과 역사를 가르친 참교육자였으나, 박 선생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설립한 동명초등학교(동구 송림동)에 남겨진 빛바랜 사진 몇 장이 고작이다.
결혼을 하지 않아 후손이 없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다른 인천 인물들과는 달리 지금껏 평생을 지역에서 '만인평등교육'을 실천한 그의 업적을 세상에 알린 단체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박선생은 1910년 11월 인천시 중구 도원동에서 태어났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그의 '가계'(家系)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에 따르면 아버지를 일찍 여읜 탓에 박 선생의 유년기는 가난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그는 1남2녀 중 막내로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박 선생은 1923년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인천창영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상경해 '정신여자중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학교를 중도에 포기해야 했다. 귀향 후 '혈혈단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조도전대'(현 와세다대) 2년 과정을 수료한다. 신식 교육을 접한 박 선생은 이후 인천으로 건너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결심한다.

박 선생은 관서학원 문을 닫은 뒤 부평에 사는 부농 박백순씨에게 당시 돈으로 500원을 빌려 '이흥선정미소'(현 중구 유동) 창고를 매입해 '광명학원'(光明學院)이란 간판을 내걸고 다시 야학을 열었다. 그러나 이 학원도 몇 달 뒤 문을 닫는다. 박 선생과 돈독한 관계였던 고일 선생은 자신의 저서 인천석금(仁川昔今)에서 “일본 경찰은 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두 사람의 독립군이 암암리에 도와주었다는 핑계로 해산시키고 마니, 투자한 박씨가 원금 상환을 독촉했다”고 그 이유를 적었다.
박 선생은 1931년 유동에 일본인의 땅을 빌려 현 동명초교의 시초인 '동명학원'(東明學院)을 설립한다. 그러나 1939년 일본 경찰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東明聖王)의 이름을 딴 간판은 내걸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학교 이름을 일본식 이름인 '소화강습회'(昭和講習會)로 개명했다.
1945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찾아왔다. 광복과 동시에 동명학원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박 선생의 학원은 일경의 탄압 속에서 우리 말과 역사를 가르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 내 사설강습소 중 유일하게 6년제 국민학교(현 초등학교)로 승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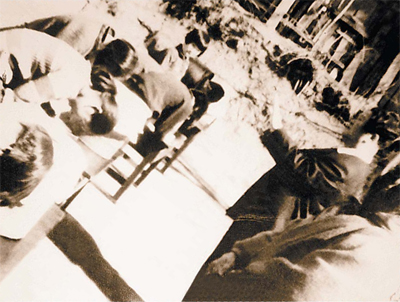
그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송림동에 있던 '일본동경대 전염병연구소'의 실험용 우사를 인수해 지금의 동명초교 터를 만들었다. 제자 김상열(75·여)씨는 “선생님이 학교 터를 보시고 어찌나 기뻐하셨는 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매일 밤낮으로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 학교를 쓸고 닦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박 선생은 늘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세침략이 잦았던 이 나라의 설움과 일본에 무릎꿇어야 했던 굴욕의 역사에 대한 그의 교육은 제자들의 가슴에 애국애족정신을 뿌리내리게 했다.
그는 사적인 일에선 늘 관대함을 잃지 않았으나, 공적인 일로 돌아서면 누구보다도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동명초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아침엔 조례문을, 오후엔 반성문을 읽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행함이 없는 생활은 공허하고 사색이 없는 실천은 맹목이니 우리는 아동과 함께 배우고 아동과 함께 노는 곳에서 진리의 교육을 터득하고 목적달성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며 오늘을 반성합니다.”(동명초교 반성문 중에서)

동명초교 4회 졸업생인 김정욱(73·여)씨는 “하루는 선생님이 '어머니와 함께 학교로 오라'고 하셔서 찾아 뵀더니 '학교에서 교편을 잡아보지 않겠냐'고 제의하셨다”며 “나를 비롯해 선생님이 아끼는 제자들이 동명초교에서 교사로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명초교를 졸업한 제자들 중 우수한 학생이 인천사범학교(현 인천교대)에 진학하면 학비를 보태셧고 나중엔 학교로 불러 교편도 잡게 하셨다"고도 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학교 뒤편 방 한 칸에서 혼자 지냈던 선생을 위해 제자들은 식사며 빨래 등 가정일을 대신 해줬다. 선생의 장례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의 기일을 챙기는 일도 제자들이 하고 있다.
가난을 잘 알고 있는 박선생은 늘 검소했다. 교장으로 재직 중에도 그는 신발대신 짚신을 신었다고 한다. 특히 허름한 옷차림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잘 알려져있다. 인천시교육청 공보팀 유준우씨는 "예전 동명초교를 방문했을때 '포대자루'처럼 보이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장이라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 사진한장 찍은게 없어 제자들이 박 선생이 돌아가신 뒤 영정사진을 구하지 못해 내가 업무 때문에 찍었던 사진을 건네준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의 제자들은 선생을 '여장부'로 기억한다. 항상 남자들과 경쟁을 했는데, 늘 이기는 쪽은 박 선생이었다.
그가 가장 즐겼던 스포츠는 테니스며, 학교에서 열렸던 체육대회에서도 그는 항상 남자들과 경쟁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박 선생의 여 제자들은 "선생님이 '힘이 없으면 사회에서 도태당한다. 여자들도 머리엔 지식을 쌓고 육체엔 힘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며 "남성중심 사회에 여자가 진출하기 위해선 동등한 힘을 갖춰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동명초교가 지역에서 명문 사립학교로 자리잡을 무렵, 박 선생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다. 인천기독병원에서 10개월간 병마와 싸우던 그는 1983년 10월 만인평등교육 실천을 제자들에게 당부한 뒤 눈을 감았다. 그가 훌륭한 교육정신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 한국일보사가 선정한 '제1회 교육대상'을 받은 지 1년 뒤의 일이었다.
<김장훈기자·cooldud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