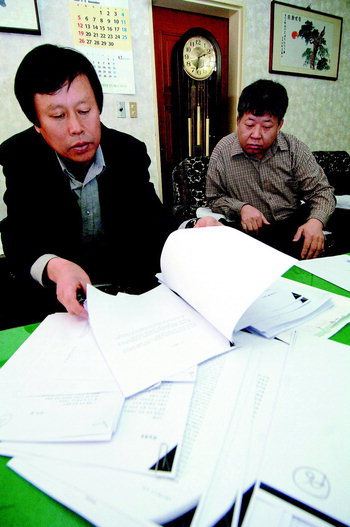
그 경계에 서서 "하루 종일 위태롭게 뒤뚱거리며" 산다. 연못가에서 소금쟁이를 바라보다가 시의 화자가 느꼈던 그 경계의 아슬함과 위태로움은 시에도, 시를 쓰는 삶에도 역시 매일 찾아온다. "잠영도 승천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가라앉을 수도 날아오를 수도 없는 진퇴유곡의 경계에 갇혀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고해(苦海)를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응시하면서 건너가는 일, 그게 우리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소금쟁이를 맛보다'는 밀도 높게 형상화 하고 있다.
미세한 현상을 놓치지 않는 감각적인 눈이 있고 그것을 깊이 있는 삶의 철학으로 끌고 갈 줄 아는 힘이 있다. 시적 긴장이 살아 있고 시의 내면이 꽉 차 있다.
심사위원들이 당선작으로 합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언어에 의존하고 싶은 유혹에 끌려가기보다는 '호랑이가 없다'와 같은 시에서처럼 삶에서 우러난 시가 좋은 시라는 믿음을 견지하면 좋겠다.
'바닷가에 서서','곰국'과 같은 시들도 충분히 당선작이 될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야영'도 삶과 언어가 육화되어 있는 탄탄한 작품이었다. 다만 함께 응모한 다른 작품들이 이런 작품과 같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포클레인','바다는','종착역에 대한 세 개의 레토릭'등도 모두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시를 쓰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