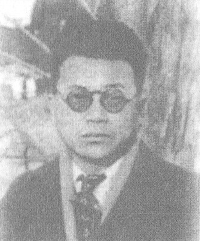
1920년 이후 인천 연극 운동의 중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대미술가 원우전(元雨田, 우전은 아호 본명은 世夏·1903(?)~?)이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기록'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국내 연극 발전사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어디서 언제 태어났고, 언제 세상을 떴는 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의 활동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에서의 기록도 희미하다. 다만 몇 줄의 기록과 몇몇 증언, 그리고 이제 시작단계인 연구논문 등을 통해 치열했던 원우전의 삶을 유추해 볼 뿐이다. 향토 언론인 고일이 쓴 인천석금(仁川昔今)에서 원우전을 대략이나 엿볼 수 있다.
"토월회의 인천 공연 이후 무대 장치가인 원우전씨는 아예 인천에 거주를 정하였다. 그 덕으로 싸리재 각 상점의 간판은 근대식으로 진화했다." 연극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상점 간판까지 그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원우전의 반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직접 배우로도 연극에 뛰어들었으며, 어린이들에게 아동극과 무용극을 가르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종합 예술인이었던 셈이다.
원우전은 1926년 극작가 진우촌(秦雨村), 함세덕(咸世德), 연기자 정암(鄭岩), 언론인 고일(高逸), 송수안(宋壽安) 등 인천의 젊은 지식인들과 함께 극단 '칠면구락부(七面俱樂部)'를 결성했고, 경동 애관극장 등에서 공연을 벌였다.
1920년대 말 경동거리에 자리잡은 칠면구락부와 애관극장은 인천 공연문화를 대표했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1세대 무대미술가인 원우전이 서 있었던 것이다.
향토사 연구자 김양수(74)씨는 원우전이 경동거리 간판을 화려하게 꾸민 장본인이라고 전했다.
"1950년대 어느 날 고일 선생과 애관극장이 있는 경동거리를 함께 걸은 적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거리 상점 간판들이 호사스럽고, 특이했어요. 고일 선생은 이게 모두 원우전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대미술을 그리는 일로는 돈벌이가 안 돼, 원우전은 부업으로 상점 간판을 그리는 일을 했다고 설명하셨어요. 원우전은 마치 무대장치 꾸미듯 거리 간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원우전은 일본 유학생들이 결성한 극단 토월회(土月會) 2회 공연(1923년)부터 무대미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칠면구락부가 결성되기 직전인 1925년 12월22일. 전국에 이름을 날렸던 토월회가 인천 빈정(濱町) 가부키좌(歌舞伎座)에 공연을 내려오자 관람객들은 눈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공연 시작 전부터 자리를 채웠다. 토월회의 막이 열릴 때마다 관중의 주목을 끄는 건 배경이었다. 그 배경 담당이 바로 원우전이었다. 원우전은 이 공연이 끝난 뒤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해방 이전 원우전과 함께 무대미술가로 활동했던 이원경(90)씨는 "원우전은 무대 그림 하나만은 대단히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하나씩 기억을 떠올렸다.
"동양화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잘 그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연극보다가도 배경 보고 감탄한 거지. 당시 배경화는 무대 전체 뒷면을 가릴 수 있는 광목에 그렸어. 각종 물감을 물에 녹이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아교를 끓여서 배합했어. 이렇게 그려야 배경화에서 실이 떨어지지 않았거든. 그런데 떨어지지 않도록 아교를 끓이고 배합하는 기술은 아무도 몰랐어. 원우전만이 아는 기술이었지."
이런 원우전은 인천에 무도관이 생긴 후에는 이 곳에서 소년 소녀들에게 아동극과 무용극을 지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인천 무도관은 유창호(柳昌浩)가 1927년 애관극장에 세웠는데 설립 후 정기적으로 산수정(山手町:현 동구 송현동) 공회당에서 성악가를 초청해 음악공연을 열었다.
유창호는 무도관에서 '무산아동' 80여명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연을 개최했다.
고일의 인천석금 기록이 정확하다면 당시 원우전은 이 공연에 참가하는 아이들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다. 원우전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하고, 무대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몇 년 동안, 인천 연극 역량은 한껏 자랐다.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연극 무대미술의 역사는 원우전을 빼놓고 기술할 수 없다.
연극인 고설봉은 원우전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고안해 낸 장치가"라고 생전에 구술하기도 했다.
고설봉은 구술에서 "한번은 여름 배경에서 갑자기 겨울의 설경으로 장면 전환을 요구하는 작품을 했어. 원우전은 배경화를 겹으로 그려 끈으로 묶어둔 뒤 순간적으로 끈을 끊어 장면 전환을 하도록 장치했지. 30초의 암전만으로 장면이 바뀌자 관객들은 한동안 어리벙벙해 하는 눈치였어. 원우전은 세트를 만들기 전 모형을 만들어가며 작업한 최초의 무대미술가야"라고 했다.

고설봉은 원우전이 "해방 후에는 연극에 관여하지 않고 마포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다 6·25 직전에 타계하였다"고 구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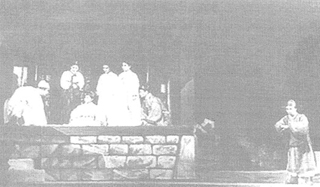
조선일보는 1966년 4월 9일자(조간 5면) 기사에서 드라마센터가 제정한 제4회 한국연극상 수상자로 원우전씨가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사는 원우전의 호칭을 무대인(舞臺人)으로, 나이는 70대로 소개했다. 또 '서구로부터 신연극을 들여 온 이나라 연극계의 초창기부터 한국극단에 종사하여 평생을 무대 미술에 바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여했다'고 기록했다. 원우전의 출생시기가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원우전에 대한 연구는 처음부터 다시 실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지난 8월 '인천학연구'7호에는 '최초의 무대미술가 원우전'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부산 부경대학교 김남석(35) 교수가 쓴 이 글은 원우전에 대해 쓰여진 최초의 '인물론'이라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원우전은 1920~30년대 우리나라 무대미술사에서 선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그에 대한 자료는 크게 부족하다"면서 "특히 원우전과 칠면구락부, 애관극장의 역사에 대해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근대 연극사는, 원우전이라는 '키워드'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명래기자·problema@kyeongin.com>













![[인천인물 100人·93]인터뷰 / 원로 무대미술가 이원경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0710/349123_52190_43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