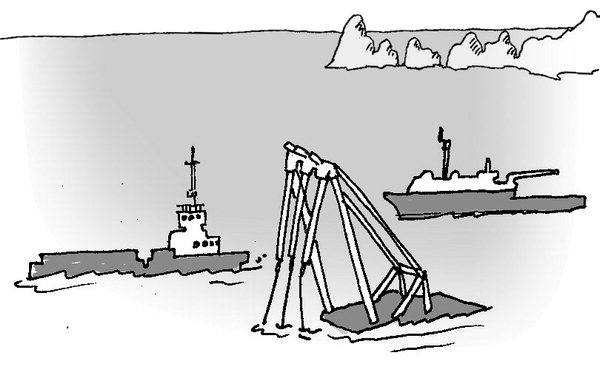
옹진군의 '옹진(甕津)'은 또 '옹기나루'라는 뜻이다. 甕이 '독 옹' '항아리 옹' '물장군 옹'자다. 그러니까 옛날 그 곳엔 독 짓고 옹기 굽던 가마터가 있어 지명이 '옹진'이 된 것이다. 그 옹진 술항아리, 술독에서 부글부글 처음으로 익어 귀빈에게 내놓던 술이 '옹두(甕頭)' 또는 '옹두춘(春)'이었고 그런 술을 과하게 마시는 술꾼을 '옹정(甕精)'이라 불렀다. 애만 쓰고 헛수고만 한다는 '독장수 셈'―'옹산(甕算)'이란 말은 또 얼마나 정겨운가. 어느 옹기장수가 길가에서 옹기를 쓰고 자다가 큰 부자가 되는 꿈을 꾸자 좋아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독만 깨졌다는 데서 생긴 말이다.
넓이 45㎢의 백령도는 대청도(大靑島)와 소청도가 졸졸 따르는 형국이고 그 오른쪽에선 기린도(島)가 목을 빼고 건너다보는 형상이다. 이 눈물겹도록 고상하고도 정겨운 이름의 백령도가 어쩌다가 남북이 대치하는 민족 비극의 표상이 돼버린 것인가. 구제불능 '백년하청'의 중국 황하(黃河)가 흘러들어 '황해(黃海)'가 된 바다, 심청이 빠졌던 그 빠른 조수의 흙탕물 바다 인당수는 더 이상 슬픈 바다여서는 안 된다. 모차르트의 미완성 레퀴엠도, 어느 장송곡도 아닌 만선(滿船)의 흥겨운 뱃노래만이 뱃전에 넘쳐야 할 섬이거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