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비탈·골짜기 버려진 건물 마음 아파
좋은 집터는 ‘살고 싶은 끌림’이 있어
명당중엔 정몽주·이석형의 묘 인상적
우리가 어디서 살고 묻힐지 고민 나눠
자연의 기운이 산과 물을 따라 모이고 또 흐르니,
산수를 보고 터를 잡아 자연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면
복이 찾아와 자손까지 이어진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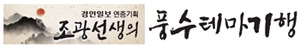
그동안 취재팀은 산을 보고 물을 보며 풍수를 따졌다. 사람이 사는 곳은 산이 있고 물이 있으니, 산과 물의 모양과 흐름에서 기운이 흐르고 멈추는 곳을 찾는 것이 풍수였다. 광활한 초원이나 높은 산맥이 있는 땅이 아니라 고만고만한 산이 많고 그 사이로 물이 흐르는 곳이 우리 땅이어서, 어디를 가도 좋은 터와 나쁜 터가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취재팀은 그렇게 풍수의 이치를 따지며 ‘흥망성쇠(興亡盛衰)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우리 여행의 화두를 직접 확인했다. 어느 곳에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기며 돌아섰고, 어느 곳에서는 놀라고 감탄하며 한참을 머물렀다.

첫번째 둘러보기 여행에서 조광 선생은 ‘풍수를 거스르면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한때 수도권에서 가장 사랑받는 ‘데이트 코스’로 꼽혔던 서울~하남~남양주~양평으로 이어지는 강변길. 강변 양쪽으로 늘어선 카페와 음식점들은 한강 일대를 대표하는 명소들이었다.
너나없이 자가용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게 되면서 운치 있게 탁 트인 강변에 자리 잡은 카페와 식당들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렇게 호황을 누렸던 강변의 카페와 식당들은 오래지 않아 줄줄이 문을 닫거나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강변을 내려다 보던 커다란 유리창에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부분의 카페와 식당들이 도로와 강 사이에 자리를 잡았는데, 드나들기 쉽도록 도로 쪽으로 출입구를 내고 강 쪽으로 창을 내다보니 풍수로 따지자면 ‘거꾸로’ 들어앉은 셈이다. 언덕길이나 평지에 지어진 집들도 산을 뒤로 두고 앞을 바라보는 집들이 별로 없었다. 도로를 바라보고 건물을 짓다 보니 생긴 문제였다.
배산임수를 지킨듯 보이는 집들도 골짜기에 들어 앉았거나 산비탈을 깎아 축대를 쌓아 지어진 집들이 많아서, 역시나 같은 운명에 처했다. 골짜기마다 산비탈마다 버려져 흉물로 전락한 폐건물들은 취재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런 상황은 남양주를 지나 양평까지 가도록 계속 이어졌다.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다”는 조광 선생의 말에서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같은 지역에 비슷한 식당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어느 집은 손님이 줄을 잇고 다른 집들은 장사가 안돼 허덕이는 모습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취재를 다니며 주차장에 차들이 미어터지게 서 있는 식당들을 눈여겨 보았다. 무엇이 다를까? 풍수에서는 돈을 벌게 해주는 산으로 부봉(富峰)을 꼽는다.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둥글게 솟은 산이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남양주의 순두부집, 여주의 막국수집, 광주의 한식집, 가평의 매운탕집 등은 하나같이 부봉을 끼고 있었다. 누구는 곡식을 쌓아놓은 모양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어머니의 가슴 같다고도 하는 부봉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산이다.
풍수에서 재물과 연결되는 또 하나로 ‘백호(白虎)’를 꼽는다. 배산임수를 지킨 곳에 백호가 오른쪽으로 감아 돌았다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했다. 여주의 유명한 막국수집은 백호가 좋기로 손꼽히는 곳이다. 뒤에서 시작한 나지막한 언덕자락이 식당 오른쪽을 돌아 바로 앞까지 뻗어나왔다.
남양주의 순두부집은 큰길가에 있는데도 주변의 여느 식당들처럼 도로를 바라보지 않고 출입문을 옆쪽으로 냈다. 길옆으로 불쑥 솟은 언덕이 길과 나란하게 산자락을 펼쳤는데, 그렇게 돌려 앉으면서 배산임수를 지키고 오른쪽으로 백호를 두게 됐다.
한때 잘나가던 식당이 갑자기 어려워진 곳도 있었다. 새로 난 큰 길이 식당 뒤를 비스듬히 지나면서 백호를 가르고 주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끊었다. 거짓말처럼 그많던 손님들이 사라졌다고 했다. 잘되는 집, 안되는 집은 이유가 있었다.
■ 명당을 보다
명당 중에 명당으로 꼽히는 곳에는 풍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유명한 묘역은 더욱 그렇다. 그곳에서 음택(陰宅)의 기본을 배우고, 가문의 번영을 풍수로 해석하는 것을 배운다.
취재팀은 그동안 명당으로 손꼽히는 곳을 여러 곳 둘러보았다. 그중에서도 단연 손에 꼽을 수 있는 곳은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자리잡은 포은 정몽주와 이석형의 묘였다. 정몽주(鄭夢周 ·1337~1392)는 ‘단심가’를 남긴 고려말의 충신으로 유명하다.
정몽주의 묘 옆에는 연안이씨의 거두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저헌 이석형(李石亨·1415 ~ 1477)의 묘가 자리해 있다. 이석형은 정몽주의 증손녀를 정경부인으로 맞은 남다른 인연으로 정몽주와 음택을 나란히 하게 됐다.
정몽주와 이석형의 묘역은 멀리 앞쪽으로 일자문성이 듬직하게 자리해 있고 좌청룡·우백호가 기운차게 묘역 앞쪽으로 뻗으며 감아돌아 ‘명당의 교과서’와 같은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두 묘가 모두 맥을 잘 타고 자리를 잡은 데다가, 사방을 둘러싼 산들이 한결같이 부드럽고 예뻐서 흉한 기운이 없었다.
조광 선생은 “옛날에는 이곳이 첩첩산중 시골이었을 텐데, 이런 명당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신기할 따름”이라며 “몇번을 다시 봐도 감탄할만한 명당”이라고 칭찬했다.
취재팀은 이렇게 잘 알려진 명당 외에도 숨어있는 명당들도 여럿 만났다. 그중 신북면 만세교리에 자리한 ‘조경 선생 묘’는 큰 기대 없이 찾아간 취재팀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적한 마을에서 한참을 들어간 곳에 숨은 듯 자리한 조경 선생의 묘는 그야말로 풍수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청백리로 이름을 떨쳤던 조경 선생의 기품을 보여주듯, 인공적인 꾸밈을 거의 하지 않고 정갈하게 가꾼 묘역의 모습으로 또다른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렇게 2년8개월간 여러곳을 둘러보면서 취재팀은 결국 처음의 화두로 다시 돌아갔다. 흥망성쇠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 자연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면 편안하고 복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무지와 욕심으로 자연을 거스르면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확인했다.
취재를 다니면서도 좋은 집터, 좋은 묏자리에 서면 한겨울에도 푸근하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반면 자연을 무너뜨리거나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개발한 곳은 서둘러 떠나고 싶어졌다.
잠시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은 나쁜 기운이 흐르거나 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니,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살거나 조상을 모신다면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당연해 보였다.
두번째로 취재를 나갔던 가평에서 조광 선생은 군수를 배출한 좋은 양택(陽宅)을 보여주었다. 가평읍 산유리 넓은 평지 끝에 자리한 집은 그리 크다고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시골집이었다. 하지만, 높지도 낮지도 않은 땅에 차분하게 들어앉은 이 평범한 집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자주 생각이 떠오른다. 그 집에서는 그만큼 ‘살고 싶은 끌림’이 있었다.
반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골짜기에 지어진 건물, 산비탈을 깎아 짓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들도 수없이 보았다.
그중 적지 않은 곳들은 공사조차 마치지 못한채 콘크리트 뼈대만 남은 건물로 버려지거나, 축대만 잔뜩 쌓아 놓고 집을 짓지 못해 썰렁한 모습이었다. 건물을 지어서는 안되는 땅에 건물을 지었으니, 결국 욕심이 화를 자초한 셈이다.
취재를 마치며 돌아보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어디에 묻혀야 하는지를 따지고 확인하며 2년8개월을 보냈다.
조광 선생은 “자연을 끌어안고 욕심을 버려야 풍수를 보는 눈이 생긴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풍수를 보는 눈을 길러 이땅에서 안타까운 실패, 안타까운 질병, 안타까운 싸움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긴 한마디로 긴 여행을 마무리 했다.
/글·사진=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조광선생의 풍수테마기행] 좋은 기운이 있는 거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8/992881_554110_5513.jpg)
![[조광선생의 풍수테마기행·26] 다시 돌아보는 사찰과 명당 <下>](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8/992882_554111_55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