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
낯선 어른들 막연한 관심 부담
대학생 69% “스트레스 받는다”
‘탈농경사회’ 추석 의미 빛바래
친척간 교류 줄어 서로 잘몰라
훈수보다 알아가는 대화가져야
추석이나 설 명절의 의미가 퇴색된 원인은 무엇일까.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통해 현 세태의 배경을 짚어봤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닌 ‘도시’

그는 “설과 추석은 모두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이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 년 농사를 준비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설의 유래라면, 추석은 그동안의 농작물을 수확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기다. 하지만 1960~70년대에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고, 명절이 지닌 본래의 의미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도시화 과정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세대만 해도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농촌에 아무런 추억이 없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도시생활에 익숙한 세대, 더욱이 모든 걸 쉽게 사 먹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세대가 과연 추석이 지닌 수확과 추수 감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명절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제화에 따른 글로벌 시대가 도래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았다. 노 교수는 “일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이 상당히 많아진 부분도, 함께 모일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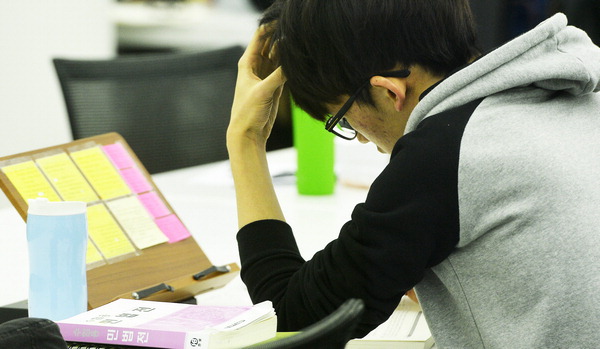
최근 구인 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에서 대학생 7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가량이 명절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 ‘취업부터 학점까지 쏟아지는 친척들의 관심에 대한 부담(31.1%)’이 가장 많았다. ‘덕담을 가장해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잔소리(19.4%)’, ‘이렇다 하게 자랑할 것이 없는 처지와 신분(11.9%)’, ‘친하지도 않은 친척 어른들을 만나는 부담감(10.1%)’, ‘제사음식 준비나 설거지 등 쏟아지는 일거리(8.4%)’, ‘취업에 대한 압박감(6.8%)’ 등이 뒤를 이었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좋은 데 취업해야지(42.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졸업하면 뭐할 거니?(12.1%)’, ‘살 좀 빼렴(11.5%)’, ‘애인은 있니?(9.5%)’, ‘우리 아무개는 이번에 장학금 탔잖아(8.3%)’, ‘그러게 공부 좀 하지(3.8%)’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취업 시즌이 한창인 요즘, 취업준비생에게 있어 명절은 썩 달갑지 않다. 아예 친척들의 청문회(?)를 피해 여행을 가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도 있다. 결혼적령기 남녀나, 고3 수험생에게도 친척들의 질문 공세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최근 간단한 동작만으로 가짜 전화가 걸려오도록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때아닌 인기다. 친척들의 불편한 잔소리에 대비, 조짐이 보일 때 곧바로 앱을 실행해 자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담의 선을 넘은 과도한 관심과 조언도 명절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설픈 훈수는 이제 그만.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로…
노 교수는 이 같은 명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서로에 대한 ‘무지(無知)’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쁜 현대인들은 만날 시간이 없다 보니 경조사나 명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친척 간 교류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당연히 서로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조언을 던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명절이야말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자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는 여의치 않다.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어렵사리 만나는 명절에라도 ‘훈수 두기’가 아닌,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인에게 있어 명절의 의미가 퇴색된 부분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규정했다.
노 교수는 “여러 사회 변화들로 인해 명절이 가진 의미가 약해진 건 분명 아쉬운 현상이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족과 고향이 지닌 절대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게 이에 관한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을 각자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금요와이드·추석 그리고 가족] “이번에도 못갑니다” “밥은 꼭 묵으래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9/1004185_565198_5821.jpg)
![[금요와이드·추석 그리고 가족] 애끓는 ‘혈육의 정’](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9/1004187_565202_5821.jpg)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