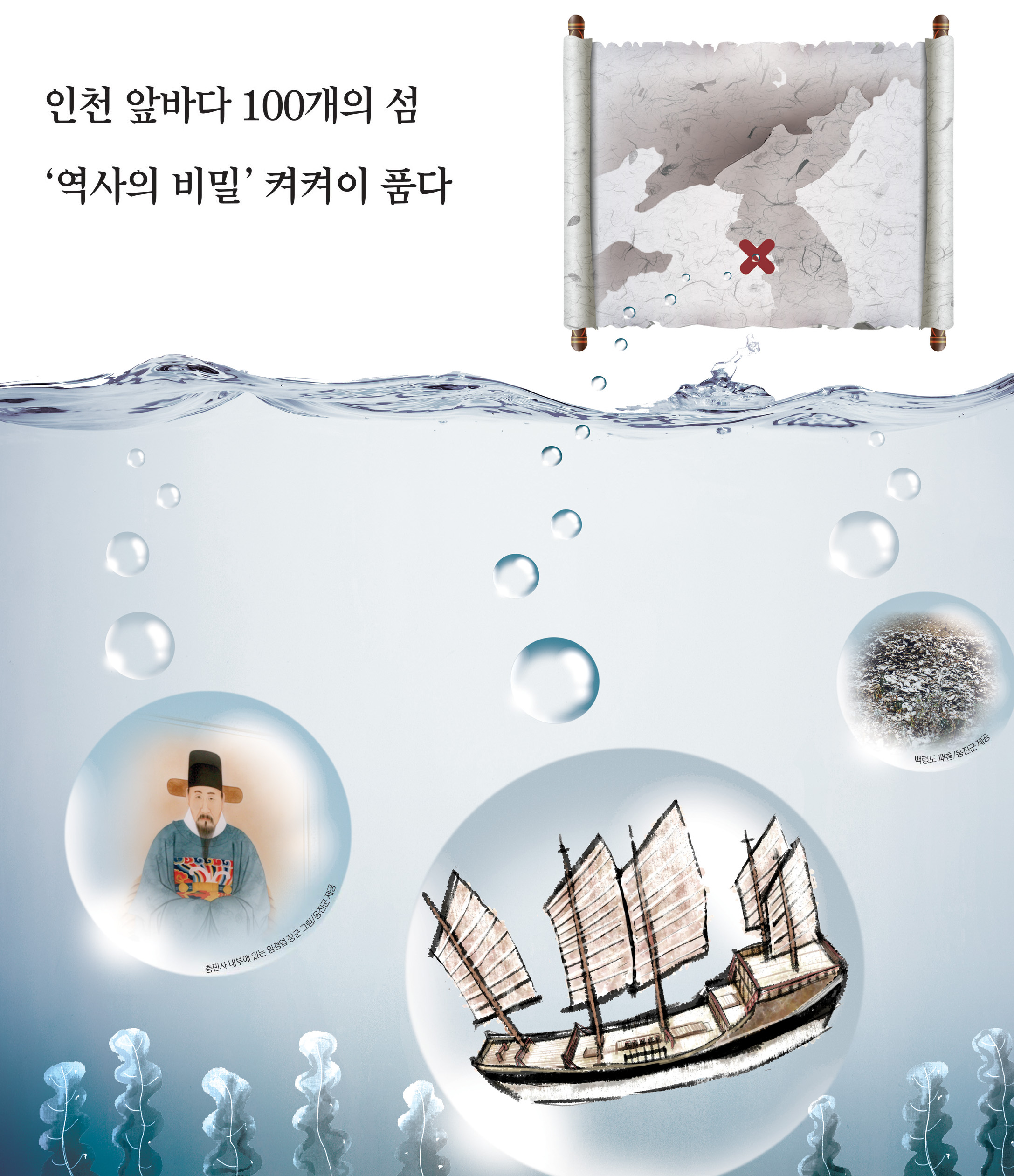
조기파시 전설 임경업 장군 사당 ‘충민사’ 꽃게잡이땐 지금도 풍어제 지내
선사시대 주거문화 자료 ‘패총’ 백령·연평·승봉·선재·문갑도 등 총 68곳

#보물선이 가라앉은 영흥도 앞바다

섬업벌 인근 해역에 침몰한 고선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연구소는 2012년, 2013년 본격적인 수중 발굴조사를 진행해 고선박 1척을 인양하고, 도자기 870여점을 출수(出水)했다. 이 선박은 ‘영흥도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영흥도선 주변에서는 주로 청자가 발굴됐다. 유물은 대접과 접시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돼 있었다. 무늬와 모양, 제작기법 등을 고려했을 때 12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그렇다면 섬업벌에 가라앉은 고선박도 고려시대 선박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하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인양된 선박 안에는 고려시대 청자가 단 1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도기(陶器) 6점과 철제솥 12점, 동제용기 1점, 사슴뿔 2점이 확인됐을 뿐이었다.
이 도기병에는 고려시대 이전에 주로 보이는 파상집선문(波狀集線文·파도모양의 선이 여러 개 겹쳐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 문양은 5세기 무렵부터 백제와 신라지역의 도토기(陶土器)에서 많이 보였다가 9세기 전반 이후 점차 소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결과도 채취한 시료가 모두 8세기 중후반경으로 분석됐다. 8세기 중후반이라면 통일신라 혜공왕(765~779), 선덕왕(780~784), 원성왕(785~798)대이다.
기존에 조사된 수중 문화유산이 12~13세기에 집중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영흥도선은 갑자기 4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발견이었다. 매장지역도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해역이 아닌 인천 앞바다였다. 영흥도선은 이 같은 수중 유물의 공식을 깨트린 파격적인 발견이었던 셈이다.
영흥도 섬업벌 해역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남양만의 당항포(화성시)에서 중국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국제교역로였다. 고려 이후부터는 삼남지역의 세곡과 물류를 수도로 운반했던 조운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12세기 청자의 주생산지는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이다. 아마 섬업벌에서 출수된 청자는 전라도를 떠나 수도 개경으로 운송되던 청자일 가능성이 높다. 개경으로 올라가는 길에 영흥도 서쪽 섬업벌 해안에서 조난을 당했던 것이리라.
그에 비해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영흥도선은 출항지를 단정지을 수 없다. 다량의 철제솥을 싣고 영흥도 주변을 운항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충주에서 생산된 철제물품을 각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화물선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영흥도선의 철제솥과 유사한 형태의 철제솥이 충주 본리 노계마을 야철지 유적에서 출토된 적이 있다. 이밖에 풍부한 철산지가 있던 해주에서 출발한 선박일 수도 있다.
영흥도선은 해양에서 발굴된 고선박 중 그 시기가 가장 앞서 우리나라 해양사와 선박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대선박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통일신라시대 해양을 운항하는 선박의 자료가 발견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영흥도선은 선체가 잘 남아있지 않고 유물 또한 몇 점의 도기와 철제솥이 전부지만 어느 유물들에 못지 않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침몰된 선체를 발견하고 발굴, 인양까지 하는 과정도 수중문화재 조사에 있어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조기파시’ 임경업 장군을 기리다, 충민사

물이 빠져 나가는 간조가 되자 가시나무의 가시마다 수많은 조기가 걸려있었다. 이 때부터 연평도 사람들은 조기잡는 법을 알게 돼 생계를 이어나갔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임경업 장군의 조기파시 전설은 아직도 연평도에 남아 있다. 조기 잡는 법을 알려준 임경업 장군은 바다를 지켜주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임경업 장군의 혼은 연평도 연평리 산 9의1 충민사(忠愍祠)에 모셔져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목조건물로 지어진 충민사는 옹진군 향토문화재 1호이기도 하다.
본래 충민사는 ‘임장군당’이라는 굿당이었으나 훗날 유교식 제당으로 바뀌었다. 조기파시가 성행하던 때 뱃사람들은 임장군 사당을 찾아와 풍어와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지금도 꽃게잡이가 시작될 즈음 풍어제를 지내면서 임경업 장군에게 풍어를 빌고 있다.
#패총과 고인돌
조개무지, 조개무덤이라고도 하는 패총(貝塚)은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장’이다. 한낱 쓰레기장이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선사시대 인류의 주거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패총은 옹진군의 각 섬에서도 발견된다.
이중 백령도의 진촌리 ‘말등패총’은 옹진군 향토문화재 2호로 지정됐다. ‘말등패총’은 백령면사무소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진촌리 해안에 위치해 있다. 이 패총은 1958년 서울대학교 학술조사단에서 답사, 보고서를 통해 선사유적지임을 밝힌 곳이다.
하층부에서 채집된 타제각편석기편으로 볼 때 백령도에는 이미 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패각층은 굴·섭조개의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에 도기편, 토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연평도, 승봉도, 선재도, 문갑도 등 옹진군의 거의 모든 섬에서도 패총은 발견됐다. 지금까지 옹진군이 파악하고 있는 패총의 숫자는 모두 68곳이다.
/글 =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강화·옹진 인천20년 보석을 다듬자·35] 자연의 신비, 이작도 풀등](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9/997389_558517_1022.jpg)
![[강화·옹진 인천20년 보석을 다듬자·36] 바다가 준 선물 옹진군의 수산자원 (上)](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9/999561_560550_123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