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스키장, 겨울 한철장사
비시즌땐 인적 드물어 '스산'
'뭘해도 안된다' 체념한 주민
12만명서 9천명으로 '脫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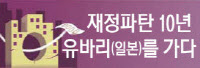
인천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에 달해 지난해 7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2018년까지 채무비율을 25% 밑으로 낮추겠다는 재정 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유바리시와 인천은 많이 다르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경인일보가 창간 71주년 기획으로 파산한 지 10년이 된 유바리시에서 재정 건전화의 중요성을 취재했다. 이와 함께 인천이 많은 빚을 지게 된 이유와 부채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달 27일 홋카이도 남쪽에 있는 신치토세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달리자 '파산 도시' 유바리시가 나왔다. 유바리시 면적은 763.07㎢로 서울(605.39㎢)보다 넓다.
하지만 6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시가지는 그리 크지 않다. 시가지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길쭉한 모양으로 형성돼 있다. 도로 양옆으로 2~3층짜리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하나같이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현대식 건물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낡고 오래됐다. 길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스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유바리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역 옆에 있는 호텔과 스키장은 유바리시의 몇 개 안 남은 관광시설 중 하나. 그러나 스키시즌이 아닐 때는 관광객이 거의 없다고 한다. '겨울 한철장사'인 셈이다. 하루에 열차가 5번만 운행하는 유바리역은 이용객이 적어 무인 역으로 운영되고, 역사는 관광안내소와 찻집으로 쓰고 있었다.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하시바 하데카즈(55)씨는 "이곳 관광객의 70%는 겨울철 스키 손님"이라며 "파산 도시라고 해서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잠시 머물렀다 다른 관광지로 떠난다"고 했다. 또 "유바리 사람들은 '뭐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포자기에 가까운 상태"라고 했다.
석탄 채굴이 활발했던 때에는 북쪽의 탄광 근처까지 열차가 운행됐으나, 폐광이후 점점 노선이 단축돼 유바리역이 종점이 됐다. 재정난 때문에 역사 화장실이 폐쇄된 적도 있다.
유바리시는 1891년 석탄층이 발견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태평양전쟁 때 시(市)로 승격했으며, 1960년에는 인구가 12만명에 달했다. 탄광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파산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사람까지 생겨 현재 인구는 9천명 밖에 되지 않는다.
파산의 원인은 '관광산업 실패'다. 유바리시는 폐광이후 탄광회사들이 운영하던 주택과 병원 등 각종 인프라를 매입했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유원지 등 관광시설을 조성했다. 이렇게 쌓인 빚은 2006년 파산선언 당시 632억엔(6천899억원·장기부채 포함)이나 됐다. 이 중 353억엔(3천853억원)은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이었다. 현재 유바리시 한 해 예산은 100억엔(1천91억원)으로, 파산 당시에는 이보다 적었다. 유바리시는 재정재건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빚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찾은 석탄박물관은 문이 닫혀 있었다. 관리·유지비용 때문에 문을 여는 날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 주변에는 대관람차 등 놀이시설이 있었는데, 대관람차는 고철로 내다 팔고, 수영장과 식당 등의 시설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무성하게 자란 풀은 성인 남성의 허리에 닿을 정도였다.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다.
유바리시는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호텔 2개와 스키장도 매각할 계획이다. 유바리시 테라에 카즈토시 총무과장은 "시설이 오래돼 관리·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매각할 계획"이라고 했다.
1990년대 후반 연 관광객 수가 230만명에 달하던 유바리시는 한해 55만명(2015년 기준) 정도만 방문하는 도시가 됐다. 유바리시는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처럼 매년 25억엔(273억원)을 앞으로 10년 동안 더 갚아야 한다.
유바리/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