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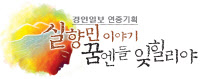
조강은 한강 물도 흐르고 임진강 물도, 예성강 물도 보태졌다. 세 개의 강물이 하나 되어 흐르는 강, 조강.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이름의 흔적은 동방의 시호(詩豪) 이규보(1168~1241)의 작품에 있다. 1219년, 지금으로 치면 인천광역시장 격인 계양부사로 부임하면서 바로 이 조강을 건넜다.
그 순간의 감흥을 작품에 풀어냈다. 조강부(祖江賦) 1편과 시편 2편이 남아 있다. 신임 계양부사 이규보는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남쪽으로 길을 잡아 조강을 거쳐 김포반도에 이르는 코스를 택했을 것이다. 이후 조강이란 이름은 해방 직후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조강은 남북 분단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발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지도에서는 조강이라는 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냥 한강으로만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있다. 사람이 왕래하지 않게 되면서 그 이름을 부를 일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잊힌 존재가 되어 버렸다.
실향민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 실향민들의 인생이며 기억은 둘로 정확하게 나뉜다. 북녘에 살 때와 한국전쟁 이후 남한 생활이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된다. 저쪽에서의 삶과 이쪽에서의 생활 모두 기록하지 않으면 잊힐 수밖에 없다. 그네들의 삶과 기억은 후세에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
역사가 단절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인일보가 2017년 연중기획으로 '실향민 이야기-꿈엔들 잊힐리야'를 준비하는 이유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실향민 이야기'에서는 고향 생각에 잠을 설치는 실향민들의 그 기억을 담아낼 터이다. 죽기 전에 못 가면 죽어서라도 날아가겠다는 고향에 대한 그 간절한 그리움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맨손으로 시작해 일가를 이룬 성취과정을 추적할 셈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삶의 거울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