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후퇴 무렵 소수압도로 피란
언 땅을 파 볏짚 지붕 올려 생활
인민군 정보 캐는 민간 유격대 입대
이후 연평도로 다시 충남 당진으로
1953년 홀로 인천 만석동 올라와
경비원·양키골목 장사 경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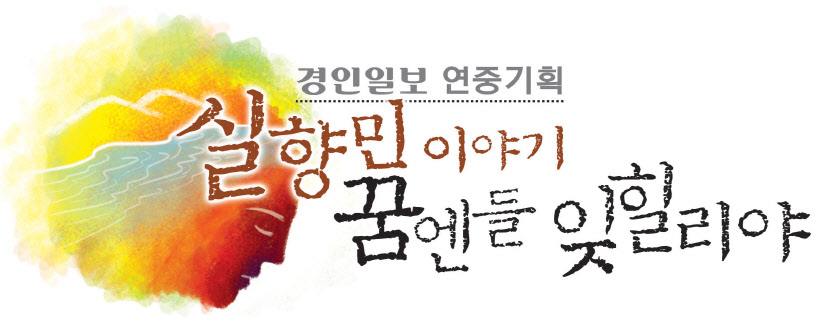
할아버지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삶"이라고 했다. 김완수 할아버지는 1951년 1·4후퇴 무렵 홀어머니와 누나, 조카들과 함께 동강면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소수압도로 피란했다. 피란민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옹진학도유격부대전우회가 1992년 펴낸 '학도유격부대전사'에 따르면 피란민들은 식구대로 이불 보따리를 이고 지고 내려왔지만, 머물 곳이 없었다. 외양간은 고급 주거지였고, 폐선(廢船)이라도 구하면 그야말로 감지덕지였다. 할아버지 가족은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언 땅을 파고 나무와 볏짚으로 지붕을 만들어 생활했다. 작은 섬을 피란민이 차지하자 기존 원주민과의 마찰도 잦았다.
"마을에 먹을 물이 부족하게 되자 주민들이 우물을 자물쇠로 잠가서 못쓰게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구덩이를 파서 물을 구하는데 쪼끔씩 졸졸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순서대로 받아갔지.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한 해 겨울을 났어."
할아버지는 밥이라도 얻어먹을 요량으로 1951년 2월 12일 소수압도에 편성된 미8군 사령부 휘하 유격부대 '동키12연대'에 입대해 인민군 정보를 캐오는 임무를 맡았다.
1966년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강기천 전 국회의원의 회고록 '나의 인생 여로(旅路)'(1996)를 보면 미8군 사령부는 서해지역 섬에서 자생한 민간인 유격대를 지원해 유엔군의 전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1951년 2월 백령도에 레오파드 유격대 본부를 세운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별로 14개의 동키부대를 편성했다. 동키부대는 그때 미군들이 유격대에 보급해준 'AN/GRC-9' 무전기 모양이 당나귀(Donkey)같이 생겼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할아버지는 이후 동키부대 복무 경력으로 병역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김완수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연평도로 다시 피란해 지금의 임경업 장군 사당인 '충민사' 부근에서 역시 움막을 짓고 살았다. '옹진군민회지'(1995)는 1951년 말 대·소수압도를 북한군에게 빼앗겨 연평도에 많은 피란민이 몰렸다고 전한다.
당국은 연평도에 6만~7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기가 벅차자 1952년 초 수송선으로 목포, 군산 등지의 피란민 수용소로 보냈다. 할아버지는 목포로 가는 배를 배정받자 너무 멀리 가면 다시 고향에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 조기잡이 배를 빌려 가족들과 충남 당진군 우강면 부리포로 갔다.
할아버지는 단기와 서기를 헷갈릴 정도로 날짜와 연도를 꼭 집어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연평도에서 충남으로 내려간 날은 음력 3월 24일이라고 정확히 기억했다. 그때만 해도 머지않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당진으로 내려간 할아버지는 염전 개발 사업에 투입됐다. 물자 부족으로 소금 증산 5개년 계획이 세워진 때였다. 1952년 3월 16일자 경향신문에는 "서해안 옹진방면 10만 피란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당진에 있는 194정보 염전 개발에 피란민을 동원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할아버지는 서산과 당진에서 염전 개발을 위해 방조제를 쌓는 일을 했다.
할아버지는 염전 일에 싫증을 느껴 어머니와 누나 가족을 남겨두고 실향민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인천 만석동으로 무작정 올라왔다. 할아버지는 인천에 자리 잡은 해를 1953년 무렵으로 기억했다. 월미도에서 휴전(1953년 7월 27일)을 맞았다고 했다.
김완수 할아버지의 나이는 실제와 호적의 것이 크게 다르다. 그가 인천으로 떠난 사이 나이가 뒤바뀌고 말았다. 실제로는 1937년 정축년(丁丑年) 소띠해에 태어났는데 서산에 남은 어머니가 새 호적에 1929년생으로 올렸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어 보니 휴전협정 후 정부에서 피란민의 가호적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면 서기인지 이장인지가 와서는 본인 확인도 없이 아무렇게나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었다. 난데없이 여덟 살이나 더 먹게 되었다.
인천에 온 그는 고향 친구 아버지의 소개로 만석동 목재부두에서 목재 수입업체인 '동아실업주식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업했지만, 인력 감축 등을 이후로 몇 해 뒤 회사를 나와야 했다. 외국인 선원들이 대주는 커피와 통조림, 옷가지 등을 동인천 중앙시장 양키골목에서 팔아 용돈 벌이를 하기도 했다.

치료차 찾아간 치과서 인생 새국면
보철 만드는 기공사 기술 배워
덕적도 등 주민 치료 해주며 떠돌아
치과 흔치않던 시절 불법의료행위
지금은 '남부끄러운 일'로 회상
"통일이 이토록 안될 줄 알았다면
떠돌이로 살지 않았을텐데…"
낯선 타향 땅에서 너무 이를 악물고 살았던 걸까. 20대 젊은 나이에 치통이 너무 심해졌다. 없이 살던 시절 참다 참다 결국 인천 시내의 한 치과병원을 찾아간 것이 그의 인생행로를 바꿨다. 며칠 치과를 들락날락하다 보니 병원 한 구석에서 보철을 만들고 있는 치과기공사에 눈길이 갔다. 손재주만 있으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무작정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무급을 조건으로 치과기공사 밑에서 '시다' 노릇을 하며 1년간 일을 배웠다.
"치과에서 한 1년 쓸고 닦고 일하다가 독립해서 나가게 됐지. 병원이 별로 없으니까 어디 병원 소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인천이며 부평이며, 덕적도, 대부도, 영흥도를 다니면서 마을 주민을 상대로 보철 치료를 해주는 일을 했어. 돌팔이지 뭐…."
그는 치과 기술을 배운 곳을 동인천 중앙시장 근처 '경인치과'로 기억했다. 1959년 발간된 '경기사전'에는 인천의 치과의사회 회원 명단이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기억한 '경인치과'가 '경기사전' 속 19개의 명단 중에 정확히 있었다. 인천 동구 화평동 529, 자리도 틀리지 않았다.
설립연도는 단기 4280년(서기 1957년), 원장 이름은 하명수(河明洙)였다. 할아버지는 치과에 간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경기사전' 기록으로 최소한 1957년 이후였던 것만은 확실해졌다.
김완수 할아버지가 돌팔이 치과의사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의료서비스 사정을 살펴보면 짐짓 이해가 간다. 지금이야 강화·옹진을 제외하고 인천에만 치과병원이 800여 곳, 치과의사가 1천100여 명에 달하지만 그때는 변변한 치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대병원 역사문화센터가 지은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는 1893년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지(野田應治)가 인천과 서울에 치과를 개업하면서 우리나라 근대 치과의료가 시작됐다고 전한다. 일본 유학파 출신 함석태가 한국인 최초의 치과병원인 '한성치과'를 서울에 개업한 해는 1914년이었다. 인천 최초의 치과의사인 임영균(1903~1969)이 인천에 '임치과'를 설립한 것은 1927년이다.
당시에는 치과와 비슷한 '잇방'이라는 것도 있었다.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 입치사(入齒士)들이 줄줄이 차리기 시작했는데, 잇방은 당시 우리 말로 '이 해 박는 집'이었다. 입치사들은 의사라기보다는 기술자에 가까웠다. 1965년에 들어서야 치과기공사에게 자격을 주는 의료보조원법이 제정됐다.
전쟁을 겪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싼값에 이를 치료해주는 '야매' 치과 선생이 더 반가웠다. 그래서 치과의사 조수로 일하던 사람, 할아버지처럼 치과기공을 어깨너머로라도 배운 사람, 군대에서 치과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버젓이 의사행세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할아버지는 1960년대 인천, 부평 지역에서 떠돌이 치과의사를 하는 사람이 19명이었다고 기억했다. 할아버지는 이들과 비밀 조합을 만들어서 가격 담합도 했다. 누군가 싸게 받거나 비싸게 받으면 그 나름의 '상도덕'을 깨는 일이었다.
황해도 신천 출신으로 분단상황에 놓인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쓴 김태순의 단편소설 '독가촌 풍경'(1977)을 보면 당시 돌팔이 치과의사의 수법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허명두는 휴전 이후 군대에서 치과 병동의 조수로 일한 것을 경험 삼아 시골에 돌팔이 치과병원을 차렸다.
허명두는 환자가 오면 "여긴 가정집이지 이빨이 안 좋다면 저 아랫마을 치과병원엘 가보시우"라는 식으로 슬쩍 떠보며 딴전을 피웠다. 이리되면 오히려 사정하는 쪽은 환자였다. 허명두는 일부러 부어오른 신경을 건드리고 망치로 억세게 두들겨 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가장 질색하는 엔진을 '들들대며' 입 아구 속에 처넣어 사정없이 아픈 이빨을 갈아댔다.
물론 할아버지가 소설 속 허명두처럼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무면허 치과 시술을 회상하면서 '남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지금은 누가 하라고 떠밀어도 못하겠지만 '힘든 시절 돈 욕심에 뛰어든 일'이었다.
"생전에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을 진즉부터 알았다면 돈푼이나 갖고 내려와서 어디라도 정착해서 잘 살았을 건데…. 사람 가서 못 사는 곳 없다고 하듯이 빈손으로 살아도 살만하더라고. 우리네 생활이 그랬어…."
글/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204.0379f5406224439390b517694eb055ed_R.jpeg)






![[실향민이야기 꿈엔들 잊힐리야·2]황해도 순위도 출신 임경애 할머니(1)](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701/2017011701001165600056561.jpg)
![[실향민이야기 꿈엔들 잊힐리야·2]해방 이전의 인천 어시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701/20170118010011976000580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