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육성 안되고 외국인선수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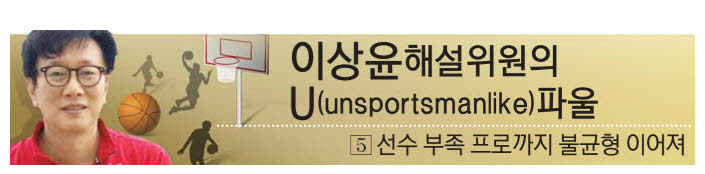
농구를 보러 오는 관중 못지 않게 중요한게 프로선수를 꿈꾸며 훈련하는 선수들의 많아야 하지만 한국 농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마추어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수십명의 선수 중에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을 골라서 선수로 키웠지만 현재 그렇게 선수 자원이 여유가 있는 팀은 없다.
중고교 남자 팀의 경우 15명 전후의 선수를 가지고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팀이 많고 여자 팀의 경우는 5~7명의 선수로 선수단을 꾸린다.
당장 유망주가 육성되지 않으면 리그 운영에 큰 타격을 입는 KBL과 WKBL은 농구교실을 운영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수 부족현상은 프로리그의 불균형한 선수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KBL의 경우 선수 부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포지션이 포인트가드와 센터다.
코트 위의 사령관이라고 불리는 포인트가드는 팀 전술 운영에 비중을 정통 포인트가드와 공격형 포인트가드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KBL에서 팀 전술을 능수능란하게 운영하는 포인트가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KBL리그에서 대표되는 정통 포인트가드를 꼽으라면 울산 현대모비스의 양동근과 인천 전자랜드의 박찬희 정도다.
그 외에 김태술(전주 KCC), 김선형(서울 SK), 두경민(원주 DB) 등은 정통 포인트가드 보다는 포인트가드와 슈팅가드 사이에 있는 선수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정통 포인트가드가 전술 운영을 중심으로 활약한다면 이들은 전술 운영도 하지만 득점에 비중을 두고 있는 선수기 때문이다.
정통 포인트가드는 고교때나 대학때, 아니면 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없다.
슈팅능력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기량을 키워낼 수 있지만 포인트가드는 그렇지 못하다. 포인트가드는 어린시절부터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포인트가드가 해야 하는 일들과 전술 운영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포인트가드를 하던 학생들도 중고교때 키가 갑자기 커 버리면 그 포지션을 놓고 포워드나 센터로 전향한다. 대신 포워드와 센터를 보던 선수가 키가 자라지 않으면 가드를 시킨다.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선수가 갑자기 가드 자리에 들어가 드리블을 통해 수비진영부터 공격진영까지 넘어와야 한다. 드리블이라는 기술은 노력에 의해 실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하프라인을 넘어 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팀 전체 전술 운영을 갑자기 하려면 되지 않는게 당연하다.
또 고교때부터 가드로 전향해 대학을 거쳐 프로에 진출한다고 해도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추어에서 포인트가드가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보니 프로에서는 가드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KBL은 외국인선수 2명 중 1명을 신장이 작은 선수, 즉 가드들을 뽑게 하고 있다.
단신 외국인선수의 가세로 팬들이 볼거리는 늘어났을 수 있지만 많이 뛰며 경험을 쌓아야 실력이 늘어나는 가드 포지션의 특성상 국내 가드들의 성장은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윤 IB스포츠 해설위원·상명대 감독












![[이상윤해설위원의 U(unsportsmanlike)파울·1]리그 득점력 영향준 'U파울 강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711/20171106010003597000160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