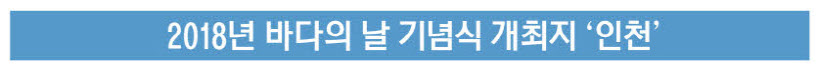

조수간만 차 크고 수심 얕아 큰 배 건조 어려워…100여년 전에도 지원 목소리
러일전쟁 직후 지역 최초 업체 등장… 중일전쟁 영향 선박 부품 제작 본격화
1970년대 국제실업·한라중공업 같은 대규모 업체 영종도 둥지 '전성기' 맞아
영종하늘도시등 개발사업 탓 자리 잃은 기술자, 조선소 따라 타 도시로 떠나

(주)디에이치조선 전성선(58) 대표는 "어선 정기검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는 이곳에서 하지만 대부분 전남 목포 등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며 "중형 이상의 선박은 중국이나 부산에서 수리한다"고 했다.
인천에 규모가 큰 조선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배를 옮기는 것이다.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데다 수심도 깊지 않아 대규모 조선소가 있기 어려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990년 11월 인천 영종도 인천조선소(한라중공업, 현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열린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은 "현재 인천조선소의 여건이 간만의 차이가 10m 이상 나고 조선소 부지가 협소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건조는 물론 수리를 원만히 할 수 없다"며 "불리한 여건을 타파하고 대(對) 해외 전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소를 남해안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라중공업은 이듬해 전남 영암 조선소 부지를 사들여 1996년 이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1932년 인천상공회의소는 조선총독부에 '인천에서도 대형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인천상의는 청원서에서 '인천지역 조선소는 소형선 수리도 어렵다 보니 인천의 배들이 부산이나 중국 다롄(大連), 일본에 가서 수리하거나 건조하고 있다. 이는 인천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막심한 손해이니 인천에서도 배를 건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인천지역 조선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1900년대 초반 인천에 조선소가 처음 설립된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1933년 발간된 '인천부사'를 보면, 인천지역 최초의 조선소는 러일전쟁 직후 건립된 '마쓰다 조선소(光田造船所)'다. 이곳에서 소형기선을 만들었다고 인천부사에 기록돼 있다. 1910년대에는 조선 자본으로 만들어진 인천 최초의 조선소 '인천철공소(仁川鐵工所)'가 문을 열었다.

인천철공소는 인천 내항 1부두와 갑문 사이에 있던 '사도'라는 섬 주변을 매립해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0t 미만의 배를 만들고, 500t 미만의 배를 수리했다. 당시에도 대형 선박 건조가 어려워 인천상공회의소는 조선총독부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인천에서 선박 부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 때문이다. 대륙 진출에 중점을 뒀던 일본은 인천에 선박 부품 제작과 조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것이 1937년 6월 설립된 '조선기계제작소'다.
배석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연구원 전임연구원이 쓴 논문(일제시기 조선기계제작소의 설립과 경영)에 따르면 조선기계제작소에서는 소형선 엔진으로 사용하던 200마력과 380마력 '야끼다마'(燒球·hot bulb) 엔진을 주로 생산했다.

해방 이후 침체기를 맡았던 인천지역 조선업은 1970년대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인천상의 120년사에 따르면 1970년대 초 인천에는 국제실업과 인천조선공업 등 대규모 조선업체가 있었다.
국제실업은 4천500t급, 인천조선공업은 2천400t급 선박을 건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1977년에는 한라중공업이 인천 영종도에 인천조선소를 설립했다.
이곳에서 일했던 김광국(51)씨는 "인천조선소에서 일하는 직원만 200명이 넘었고, 배를 만드는 장소는 초등학교 운동장 4~5개를 합친 것만큼 컸다"며 "이곳에서 4만t급 선박까지 만들었다"고 기억했다.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뿐만 아니라 배를 수리하는 철공소도 많았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만석부두와 화수부두를 중심으로 철공소가 많았다.

1982년부터 인천 동구 화수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관국(67)씨는 "80년대에는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인천의 중심이었다"며 "지나가는 강아지도 1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이곳(화수부두)에 배를 대는 어선이 수백 척에 달했다"며 "큰 조선소에서는 어선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철공소가 모든 수리를 담당했다"고 했다.
만석동 조선기계제작소 사택에서 3살 때부터 사는 정연관(70)씨는 당시 이곳 주변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정씨는 "대우중공업(조선기계제작소 후신)에서 나오는 엔진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어선이나 목선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너무 비쌌다"며 "철공소에서 엔진과 비슷한 모형으로 부품을 만들어 어민들에게 팔았다"고 했다.
세월이 지나 철공소가 있던 자리는 횟집 등 식당들이 차지하고 있다. 울퉁불퉁하고 흙먼지가 날리던 도로는 포장도로가 됐다. 연안부두가 생기면서 어선들이 옮겨가고, 어획량이 줄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어선들도 운항하지 않게 됐다. 배가 떠다니지 않으니 자연스레 철공소도 사라졌다.
정씨는 "만석부두 입구 주변 지역이 지금은 다 매립됐지만, 당시에는 (거기까지) 배가 들어왔다"며 "옛날에는 화수부두와 만석부두에 20여 개의 철공소가 있었지만, 차츰차츰 없어지더니 모두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했다.
인천조선소가 1996년 전남 영암으로 이전하고 2007년 영종하늘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영종도에 있던 대형 조선소들도 문을 닫게 됐다. 이들이 있던 자리는 호텔이 들어서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해 버렸다. 현재 인천에는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주변에 6개 조선소만 남아 있다.
영종도 조선소에서 일하던 기술자 일부는 만석부두·화수부두로 옮겨왔지만, 대부분은 조선소를 따라 전남 목포나 부산 등 다른 도시로 떠났다. 인천에서 선박 건조 일을 하는 사람은 100명 남짓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천에 남아 있던 중소형 업체들은 2006년 서구 청라국제도시 인근 거첨도 앞 해상을 매립한 부지(17만5천㎡)에 선박 수리·조선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글/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사진/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