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모대교 개통 후 이용객 급감한 외포리 선착장
유일한 정기선 삼보 12호, 섬주민들 마지막 보루
서해5도 등 임산부 출산·응급 환자 이송·피난…
수십년 실어나른 일상, 선원들 책임·사명감 느껴

식목일이 지난 4월 초순이라는 시점과는 어울리지 않는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 미세먼지는 선착장 분위기를 더욱 스산하게 했다.
지난해 석모대교가 개통하면서 외포리 선착장과 석모도를 연결하는 배편이 끊긴 이후 이런 모습이 일상이 됐다.
이곳에서 30년간 밴댕이젓과 순무김치 등을 팔아온 문유자(60·여)씨는 "그전엔 수시로 배가 다녀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 물건도 잘 팔렸는데, 지난해 석모대교가 생기면서 이곳(석포)을 다니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며 "'나룻부리항시장'으로 새롭게 가꾸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러 찾아야 하는 곳이 돼 오늘도 개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강화 외포리 선착장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문도와 아차도, 볼음도로 향하는 '삼보12호'를 기다리는 차량 몇 대와 10여 명의 사람이 작은 대합실을 지키고 있었다. 삼보12호는 석모대교 개통 이후 외포리 선착장의 유일한 정기 여객선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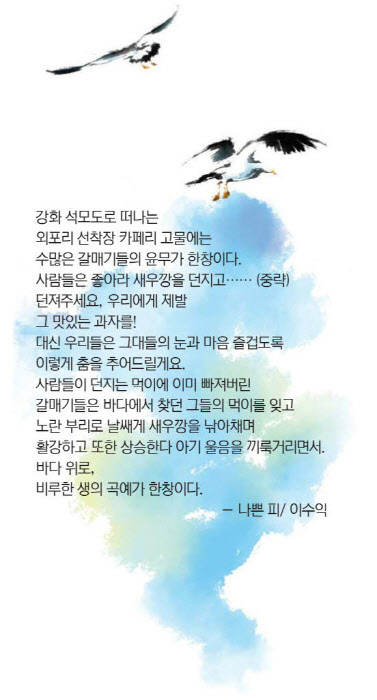
현대문학상과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한 시인 이수익의 시에 나오는 '새우깡을 좋아하는 갈매기들'은 여전히 선착장 주변을 맴돌며 '비루한 생의 곡예'를 하는 듯했다.
새우깡을 던져줄 사람들을 찾지 못한 그들에겐 왠지 모를 허기가 느껴졌다.
1987년부터 외포리 선착장을 지켜온 삼보해운의 최경락 상무는 "석모대교 개통의 직격탄을 맞았다. 직원 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인 20여 명으로 줄였고 임금도 대폭 낮췄지만,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여객선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주문, 아차, 볼음도를 연결하는 노선을 포함해달라는 건의를 군에 해 놓은 상황"이라며 "여객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외포리 선착장에서 만난 차춘자(77) 할머니는 "한평생을 볼음도에서 살았다"며 "이 배(삼보12호)는 여전히 섬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풍선(돛단배)을 타고, 연락선도 타던 시절보다 배 타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볼음도를 오가는 배가 더 자주 다녔으면 하는 바람은 늘 있다"고 했다.

섬과 육지가 다리로 연결되고 육상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운항을 멈추는 항로가 생기고 있지만, 차춘자 할머니의 말처럼 인천의 연안여객선은 여전히 중요한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 속엔 섬과 육지를 잇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다.
1980년대 후반만 해도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배편이 일주일에 2~3회 정도에 불과했다. 시간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긴 10시간이나 걸렸는데, 백령도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배 안에서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휴가철 덕적도를 찾은 50대 남성이 인천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선장 이하 선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2010년엔 놀란 주민들을 육지로 실어나르는 피난선 역할을 연안여객선이 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덕적도 등 섬을 연결하는 케이에스해운(주) 황성만 대표는 "섬 주민들이 자동차 부품을 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구해서 전해주고, 생필품 좀 사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정이 쌓였다"며 "섬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까지 많이 알게 됐다"고 했다.
연안여객선이 승객뿐만 아니라 정도 함께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해운업에 종사한 지 34년째라는 그는 배가 끊기면 섬을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이 멈출 수밖에 없는 만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운항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섬 주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지금껏 해운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그는 설명했다.

인천 연안여객선에게 인명 사고의 아픔은 예외일 수 없었다. 1949년 10월 추석 전날 인천에서 강화도로 향하던 '평해호'(平海號)가 작약도 부근에서 전복돼 70여 명이 숨졌다.
당시 이 배에는 정원(50명)보다 4배 많은 20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1963년 2월엔 인천을 떠나 강화 교동도로 가던 '갑제호'가 유빙에 부딪혀 침몰하고 승객 6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986년 11월에는 외포리를 출발해 석모도로 향하던 '카페리2호'가 전복돼 12명이 물에 빠져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 침몰 사고는 지난 16일 4주기를 맞았고, 추모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연안여객선 선원들의 고령화는 요사이 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토요일과 일요일, 명절 따로 없이 매일 운항해야 하고 바람 같은 기상 문제로 마음을 졸여야 하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젊은 직원들이 버텨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50명 가까운 선원이 근무하는 한 연안해운사의 경우, 근속 기간이 30년 이상 된 직원이 절반을 넘는다. 60세 정도가 그나마도 젊은 축에 든다고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힘든 환경 탓에 젊은이들이 선원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들어와도 몇 개월을 못 버티다 나간다"고 했다. 이어 "선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도 선원 수급이 어려운 하나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라도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글/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이미지/아이클릭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