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 차동철도 변화구가 주무기
프로데뷔 첫해 막상막하 맞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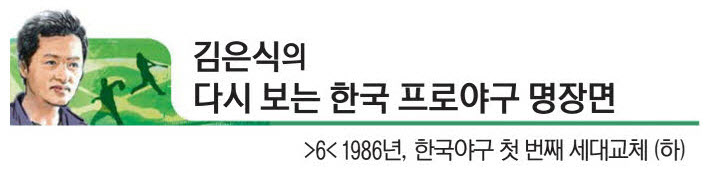
그 날 청보 핀토스와 해태 타이거즈가 내세운 선발투수는 각각 김신부와 차동철이었고, 두 사람 모두 그 해 한국프로야구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이었다.
차동철은 치열했던 1981년 광주일고를 이끌고 늘 전국무대에서 일정한 성적을 내던 에이스급 투수였다. 하지만 팀 내에서는 한 해 선배 선동열과 비교되고, 전국무대에서는 박노준, 김건우, 성준 같은 동기생들과 비교되며 조명받지 못했던 처지였다.
건국대를 거쳐 입단한 그 해에도 같은 광주 출신의 김정수에게 밀리며 큰 기대를 받지는 못 하는 처지였다.
반면 김신부는 일본 프로야구 난카이 호크스를 거친 재일교포였다.
한국만큼이나 대단한 고교야구 열풍이 불었던 1981년 일본에서 김신부는 거의 혼자 힘으로 고시엔 우승을 이끌며 일본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긴테스에 전체 1번으로 지명되었던 김의명과 관서지역에서 오랜 라이벌관계를 맺어온 투수.
김신부 역시 난카이에 1차로 지명됐고 김의명과 나란히 2억 원에 가까운(6천만 엔) 초고액의 계약금을 요구하며 자존심 싸움을 벌여 파란을 일으켰던 화제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결국 4년간 1군 무대에서 단 한 경기도 경험하지 못한 채 방출된 뒤 한국으로 건너왔고, 그 시점에서는 대학에서 4년을 보낸 차동철과 똑같은 23세의 동갑이었다.
그리고 어쨌거나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건 일본에서건 '프로야구 1군 무대'는 처음 경험하는 처지였다.
그 두 투수가 만났던 7월27일이 그 해를 상징한다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날 두 투수는 나란히 15이닝을 던졌고, 두 사람 모두 단 한 점의 실점도 하지 않았다.
한국프로야구역사상 전무후무한 '15이닝 완봉 맞대결 무승부경기'였다. 차동철의 기록은 10피안타6탈삼진이었고 김신부의 기록은 8피안타 10탈삼진이었다.
김신부는 원래 정통파 스타일에서 사이드암을 거쳐 언더핸드로 전향한 스타일로서, 직구도 시속 130킬로미터를 간신히 오르락내리락하던 '감속구 투수'였다. 그리고 차동철 역시 빠르기보다는 변화구로 승부하는 축이었는데, 특히 투심 스타일의 직구와 포크볼 같은 '떨어지는 공'을 섞어 던지면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투수였다.
나름대로 강했지만 더 강한 이들때문에 묻혔던 선수들.
그리고 힘은 부족했지만 그것을 우회하는 스타일로 버텨냈던 투수들. 그 두 사람은 그 해 나란히 10승을 올리며 기대 이상으로 활약했고, 또 각자의 팀에서 버려진 먼 훗날 LG 트윈스에서 잠시 한솥밥을 먹는 인연으로 재회하기도 했다.
세대의 구분이 꼭 10년이나 100년을 주기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사람이 나고 성장하는 것이 꼭 미리 정한 일정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1986년, 한국프로야구에는 유례 없이 좋은 투수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은 곧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축투수로 자리를 잡으며 그동안 괴물 같은 선수 한 명의 출현에 좌지우지되며 널뛰기하던 각 팀의 안정적인 기틀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에 더해 지난 해 후반기에야 첫선을 보였던 2년차 선동열이 무려 262.2이닝을 소화하면서도 0.99라는 기이한 숫자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시즌을 압도했다.
역시 실업팀을 거쳐 뒤늦게 프로생활을 시작했던 2년차 투수 김용수도 그 해 35세이브포인트를 기록하며 마무리투수 시대를 안착시키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섯 해째를 맞은 한국프로야구가 한 번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경험했고, 또한 뚜렷한 '업그레이드'를 완성했다.
더구나 박노준과 윤학길이라는 선두주자들이 출발선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김건우와 성준, 혹은 김신부와 차동철 같은 2인자 3인자들이 활개 쳐 날아오르며 그려내던 싱싱했던 풍경.
바로 그런 것들이 1986년을 더욱 멋진 해로 기억하게 하는 이유들이기도 하다.
/김은식 야구작가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2]상대 혼 빼앗는 MBC 청룡의 발야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4/20180409010006968000339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