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잇는 철길이 깔렸다.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딛고 분단의 세월을 달려온 우리에게 공존과 번영의 길이 열린 셈이다. 평화와 통일의 길은 멀지만 우리에게 행복한 걸음이 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의 기폭제가 됐다. 이를 통해 당면한 최대 과제였던 비핵화 실천방안이 논의됐고, 한반도에서 전쟁시대를 끝내는 군사 합의서까지 채택됐다.
경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면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 이제는 단순히 말로 주고 받는 평화와 통일이 아닌, 남북 간 신뢰 속에 이뤄지는 평화와 통일의 로드맵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이런 평화의 분위기를 아직도 풍전등화(風前燈火) 처럼 불안해 하는 사람도 많다.
그간의 남북 관계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까지는 남북교류의 개념조차 없었다. 민족의 비극을 겪은 우리는 화해하기 보다 벽을 쌓고 총을 겨눴다.
1970년대 들어서야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교류 협의가 이뤄졌고, 1984년에는 남북경제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의 붕괴와 개혁 개방 정책 등으로 북한과 한반도에도 변화의 기대가 커졌다.
실제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을 발표한 후 '대북경제개방조치'가 취해졌다.
이후 19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교류협력법)' 등 우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도 잠시,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분위기는 경색됐고 북한은 우리의 적을 넘어 세계의 적이 되기도 했다.
또다시 냉탕온탕을 반복하던 남북관계는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14년 개성공단 중단 같은 사태로 최대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그간의 냉탕온탕을 넘나들던 정황과는 사뭇 달랐다.
비핵화와 종전이라는 명확한 의제 속에, 북미 간의 비핵화·평화협상 담판에도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중재자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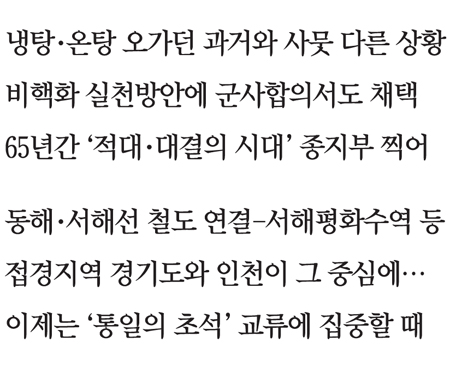
북한 지도자의 사상 첫 서울 방문도 머지 않은 시간에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또 한번 도약하고 진화하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두 차례 답방 요청에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셈이다.
이제 지난 65년간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는 마무리 지어졌다. 서해상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일대 각종 군사연습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단순한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제는 한반도를 시작으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할 때다. 평화가 일상화되고 통일을 위한 제도적 기틀도 마련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합의대로라면 올해 내 동해·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게 된다.
개성공단도 정상화되고 금강산도 다시 찾을 수 있다. 더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 문제는 남북이 더욱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말보다는 실천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과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중심에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가 있다.
경기도는 통일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이 되고, 인천시는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을 것이다. 평화와 통일시대, 경의선과 경원선을 타고 북한으로 여행을 떠날 날이 기다려 진다.
독일의 통일이 교류라는 초석을 통해 시작된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서로를 알아야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게 된다. 북한 사회의 변화 역시 교류만이 이끌어 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통일의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다. 통일은 분명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새로운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 준비와 실천만이 남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