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맞아가며 OB 우승 이끌어
심각한 '후유증'으로 십여 년 고통
최고령 승리등 박수받으며 마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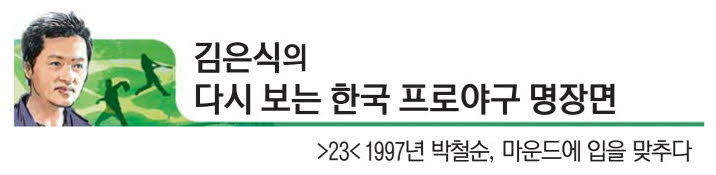
1997년 4월29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의 OB 홈경기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표가 모두 팔려나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그 뒤로 다시 베어스의 평일 홈경기가 매진되는 데는 무려 12년4개월이 걸릴 만큼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오직 그날 통산 76승을 기록했을 뿐인 '그저 그런' 한 노장투수의 은퇴식이 열린다는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파였다. 기록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박철순이라는 특별한 선수였기 때문이다.
배명고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1년을 보낼 때까지 체격이 좋고 공이 빠른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볼 게 없는, 그래서 전국무대에서 거둔 성적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박철순이 투수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공군 팀 '성무'에서였다.
그곳에서 그는 독한 근성의 사나이 이종도와 부대끼며 '드디어 야구를 레크리에이션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당대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던 명투수 남우식에게 과외교습을 받으며 '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군대 말년에 출전한 1978년 백호기 결승에서 연세대 최동원과 완투맞대결을 벌여 2-0으로 승리하며 비로소 세상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계기로 국가대표로 발탁돼 쿠바전 최초의 승리투수가 되고 다시 미국무대로 진출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대중의 기억 속으로 들어온 것은 역시 1982년, 프로야구 원년이었다.
그는 빠른 공을 주무기로 삼는 투수였지만, 간간히 너클볼과 팜볼 같이 생소한 궤적과 속도로 날아가는 신무기를 선보이며 상대 타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 해 팀당 80경기가 치러지는 가운데 그는 22연승을 포함해 24승을 기록했고, 그런 압도적인 활약으로서 팀에 역사적인 첫 우승컵을 안기게 된다.
하지만 정작 그의 이름이 야구팬들에게 각별하게 기억된 것은 오히려 그 뒤의 일들 때문이었다. 심각한 허리부상에도 불구하고 국소마취제를 맞아가며 경기에 등판해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후유증이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다시 부상부위에 직선타를 맞은 불운까지 겹치며 그는 병상과 연습장을 오가는 기나긴 세월을 시작하게 된다.
게다가 오랜 투병생활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겹친 그를 돕기 위해 구단 프런트가 주선한 광고 촬영에 나섰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까지 당하면서부터는 연습장에서보다 더 긴 시간을 병상에서 보내야 하는 신세로 몰린다.
지긋지긋하게 반복되었던 부상의 늪에서 헤어 나오는 데만 십여 년이 걸렸다. 그 사이 연봉은 줄었고, 병원비는 쌓였으며, 그 사이 억세진 두 아들을 지키고 키우는 것 역시 박철순 혼자의 몫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재기에 성공해 최고령 승리투수, 최고령 완투승, 최고령 완봉승 따위 기록들을 차례로 깨나가며 90년대 내내 7승에서 9승을 기록하는 듬직한 허리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결국 1995년에는 팀의 두 번째 우승에 작은 디딤돌 노릇을 해내기도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다 문득 멈춰 섰을 때, 프로원년을 함께 시작했던 이들 중 아직 현역으로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1997년, 그는 15년간의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응원팀에 상관없이 3만 명의 눈물어린 박수갈채를 받으며 마운드에 올랐고, 무릎을 꿇은 뒤, 투수판에 입을 맞추었다.
"입을 맞추고 싶었어.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곳이고, 내가 쓰러진 곳이고. 거기서 이기기도 했고, 지기도 했고, 실수도 했고. 한 번은 전날 비가 쏟아지니까 내일 경기 안 한다고 새벽까지 술을 퍼먹었는데 갑자기 날이 개서 비틀비틀 올라갔다가 마운드에서 토한 적도 있었지. 허허허. 거기서 물러나면서 정말 입을 맞추고 싶었어."
/김은식 야구작가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22]1996년, 괴물신인 박재홍 30-30시대를 열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10/2018100101000075500001381.jpg)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21]1995년, 방위병 출장금지 조치 (下)](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9/20180910010006444000313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