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항 갑문 관제탑에서 무전이 울렸다.
인천항에 들어오는 선박에 탑승한 도선사가 보낸 것이다. 'NGB'라고 지칭된 이 선박은 인천항과 중국 웨이하이(威海)를 오가는 3만 1천t급 대형 카페리선 '뉴골드브릿지7호'.
인천 내항에 있는 제2여객터미널에 입항하려면 반드시 갑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갑문 관제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10시 20분께 뉴골든브릿지7호가 갑문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갑문 주변에는 경고음이 울렸고, 1천50t에 달하는 외측 갑문이 천천히 열렸다. 배가 갑거(수로)에 완전히 진입하자 외측 갑문이 닫혔고, 배에서 내린 4개의 줄을 줄잡이들이 고정하기 시작했다.
인천항만공사 갑문운영팀 강석현 차장은 "내항과 외항의 수면 높이를 맞춰야 한다. 수로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배가 흔들려 갑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배를 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가 고정되면 수로에 물이 들어온다. 이날 10시 20분께 외항의 수위는 4.7m. 내항의 해수면 높이는 최소 7m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로에서 내항과 외항의 수위를 맞춰야 한다.
강 차장은 "내항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내항 쪽에서 (수로로) 물을 보내고, (배가 수로에 들어온 후) 외항의 수위가 높으면 바다 쪽 외항으로 물을 흘려보낸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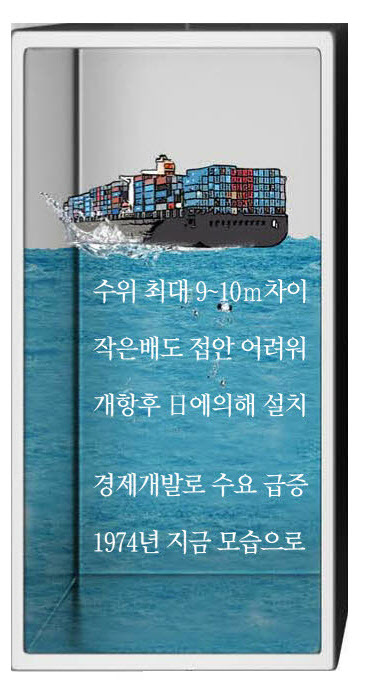
1883년 개항한 인천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9~10m의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해야 했다.
썰물 때 갯벌이 훤히 드러날 정도여서 큰 배는 물론 작은 배도 인천항에 접안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선박이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으면 작은 배가 다가가 사람과 짐을 날랐다.
김탁환과 이원태가 쓴 소설 '아편전쟁'에서도 이 같은 초창기 인천항의 모습이 묘사된다.
'인천은 수심이 얕고 아직 부두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상선이 곧바로 바닷가에 닿지 못한다오. 바닥이 평평한 짐배가 나가서 상선에 붙소. 승객과 상품을 짐배에 옮겨 싣는 게요.'
인천항을 통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일본은 만조와 간조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시설을 원했다. 이에 1911년 항만 설비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1918년 10월 27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갑문이 인천항에 설치됐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당시 7~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인천항의 화물 증가 추세는 이보다 3배가 넘었다고 한다. 경인 공업지역의 원자재와 소비재 물동량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갑문 안쪽의 인천항 시설은 4천500t급 3선석에 불과해 수도권 지역 물동량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1964년 인천항 갑문 제2선거 공사에 착수했고, 1974년 현재의 인천항 갑문이 설치됐다.
100년 전 축조한 갑문은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현재는 인천 내항 1부두 주변에서 일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 갑문은 최대 길이 306m, 너비 32m를 가진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5만t급과 길이 215m, 너비 19m 선박이 이동하는 1만t급 등 총 2개 수로로 운영되고 있다.
갑문 축조와 내항 확장으로 안정적인 하역 환경이 조성되면서 인천항의 수출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인천항사'에 따르면 인천항의 수출액은 1973년 3억 1천791만 3천 달러에서 갑문 완성 이듬해인 1975년 5억 9천941만 8천 달러로 급증했다. 197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4년 인천 남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인천 내항은 몰려드는 배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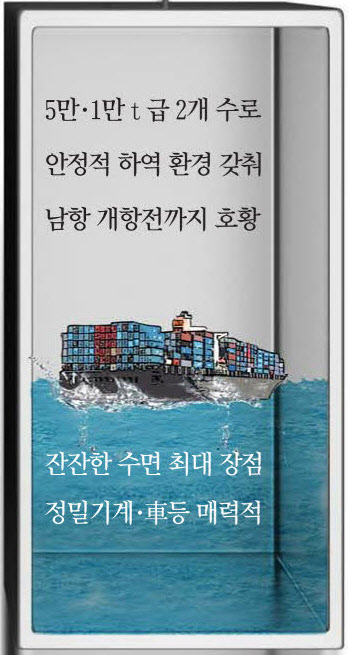
해양수산부가 1999년 펴낸 '수도권 항만 기능정립·재정비계획'을 보면, 수도권 화물의 인천항 폭주로 인천항의 체선·체화 현상이 가장 심했던 때는 1990년이다.
그해 체선율은 48.2%였다. 체선율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12시간 이상 대기한 선박의 비율을 말한다. 100대 중 48대가 12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인천항에 들어올 수 있었던 셈이다.
인천항의 체선율은 전국 항만 중 가장 높았다. 당시 평균 체선 시간은 70시간 정도로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바다에서 대기해야 갑문을 통해 인천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인천 남항에 이어 북항, 신항까지 문을 열면서 내항을 찾는 선박은 줄어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갑문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2005년 1만 3천140척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벌크화물 하역항인 북항이 개항한 2010년 8천395척,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내항 4부두가 가동을 멈춘 지난해에는 5천 52척만이 갑문을 이용했다.
2005년에 비해 60% 이상 입출항 선박이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물동량도 내항 하역량이 가장 많았던 2004년(4천529만t)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2천353만 3천730t으로 떨어졌다.
하역 장비의 발달로 수심과 관계없이 선박에서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다 보니, 30분 이상 걸리는 갑문을 출입하기 꺼리는 것이다.
하지만 갑문 속에 있는 내항은 아직 항만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갑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설명이다.
1978년부터 갑문에서 근무한 인천항만공사 김익봉 갑문운영팀장은 "갑문은 24시간 해수면 높이가 일정하고, 물이 잔잔하기 때문에 정밀기계나 자동차 하역에 적합한 항구"라며 "인천항 발전을 이끌어온 항구라는 자부심을 품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