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거처 옮겨 옥바라지 애쓴 모습 담아
월북 조각가 작품 '복식연구' 중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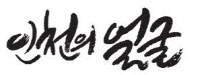
발등 너머로는 아들의 형상도 보입니다. 인천대공원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백범은 안두희의 흉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곽낙원 여사 동상은 그 두 달 뒤 완성되었습니다. 머리를 땋아 위로 얹은 것이며 치마저고리, 가냘프고 왜소한 얼굴과 몸매 그리고 짚신을 신은 발과 동냥 바가지를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모양까지.
어머니가 인천에서 고생하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들고자 애를 썼던 아들은 끝내 온전한 어머니 동상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인천 감옥에 갇히자 황해도 해주의 집을 폐하고 남편과 함께 거처를 인천으로 옮겼습니다. 안 해 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허드렛일을 했습니다.
인천 사람들이 서로 나서 백범의 방면을 위해 노력하고 파옥까지 시도한 데에는 곽낙원 여사의 애처로운 옥바라지가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인천의 이 곽낙원 여사의 동상은 많은 점에서 특별합니다. 19세기 후반 우리 아낙네들이 입은 옷차림이며 머리 스타일, 신발 등 당시 복식 연구에 살아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동상을 만든 이도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인물입니다. 동상 발뒤꿈치 아랫부분에는 완성한 시기와 함께 작가의 성을 나타내는 사인이 있습니다.
한자로 '朴'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작가는 경기중학교 미술교사 등을 지낸 박승구(1919~1995)입니다. 백범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가 버거웠던지 그는 6·25 와중에 월북했습니다.
인천 출신의 월북 조각가 조규봉(1917~1997) 등과 합작해 '중국인민지원군 우의탑'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곽낙원 여사의 동상은 백범을 백범으로 만든 인천의 근현대사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백범이 그렇게도 꿈꾸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남북이 하나 되는 길,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글/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의 얼굴'을 찾습니다. (032)861-3200이메일 : sa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