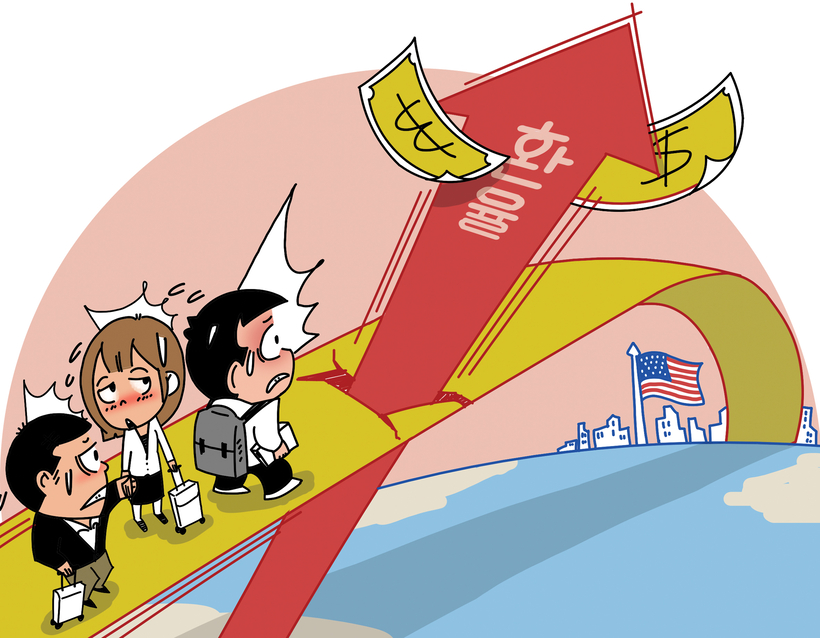팽목항 간 20여명 선체수색 트라우마 시달려
해경 계약 안맺어 '산재 배제'… 지원법 국회에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두컴컴한 선실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구조되기를 기다리다 마지막을 맞은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가장 먼저 선체 수색 작업에 나선 민간 잠수사들의 삶도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해역은 조류가 센 곳이다.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든 그들은 희생자 수습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잠수병의 하나로 뼈 조직이 썩어간다는 '골괴사' 판정을 받아 더는 잠수사로서 가족의 생계를 잇지 못하는 이들도 허다하다. 차디찬 주검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그들은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지난 16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에서 민간 잠수사 피해자 황병주(61), 하규성(51), 김상우(48)씨를 만났다.
첫 선내 진입을 하던 2014년 4월 20일,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 황씨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겠냐"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쿠웨이트에서 일하던 중 사고 소식을 접하고 즉시 귀국해 수색 작업에 합류했다는 하씨는 "당시 우리 집 애들도 고등학생이었다"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표정이 어둡던 김씨는 "국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세월초 참사 초기에 팽목항으로 달려간 20여명의 민간 잠수사들은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그해 7월 10일 이후 해경과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잠수사들과는 달리 이들은 부상을 당해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입은 수난구호 업무 종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수난구호법'에서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상자로도 지정되지 못했다. 김씨는 "제대로 치료받게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고 분노가 치민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업으로 복귀한 잠수사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생활고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민간 잠수사 김관홍씨는 2016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관홍이가 생전에 '형, 대리운전하면서 어떻게 애들을 키우지'라며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민간 잠수사 등으로 피해자 범위를 넓혀 발의한 이른바 '김관홍법'으로 불리는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획취재팀
▶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

■기획취재팀
글: 임승재차장, 배재흥, 김동필기자
사진: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안광열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