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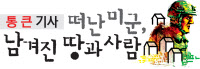
'도대체 어떤 수를 쓰면 저 껌을 쩌덕쩌덕 씹으며 지프차를 부릉부릉 몰고 다니는 코 큰 사람 호주머니에 든 신기한 달러 돈을 끌어낼 수 있을까'.
-박완서의 단편 소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중에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쓰는 문장이 있다. '개도 달러를 물고 다녔다'는 표현이다. 미군이 주둔한 지역의 성장 동력은 '유일무이' 미군이었다.
수십년간 주둔하던 미군이 떠났다. 그들이 두고 떠난 것은 낡은 군영만이 아니었다. 기지촌의 쇠락과 함께 기지촌 사람들의 삶도 저물어가고 있다.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는 캠프 펠햄과 여가시설 RC4(Recreation Center #4)가 있었다. 미군이 떠나고 난 캠프 펠햄 입구에는 빛바랜 환경정화 안내 표지판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낡아 버린 단층짜리 상가엔 여전히 '야생마', '모래시계', '클럽 앤젤' 등 유흥주점 간판이 달려 있었다. 한때 기지촌 여성들은 한 달에 1억원을 족히 벌었다고 했다.

파주 선유리 북적였던 거리 한산하다 못해 삭막
20년 일한 이응천씨 "2천명 주둔할땐 마을 활기"
저녁마다 북적였을 기지촌의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삭막하다. 37년 전 선유리로 시집온 문구점 주인 김복희(56·가명)씨는 기지 철수 전까지 미군을 상대로 철제 침대를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했다.
김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군들이 많이 주둔을 해서 양색시들 방에 둘 침대가 불티나게 팔렸다"며 "기지가 반환된 15년 전쯤부턴 활기가 사라져 가게 월세 내기도 버겁다"고 말했다.
기지 주변에서 장사를 하며 가계를 일군 상인들도 있었지만, 기지 안에서 일하며 자식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 많았다.
이응천(80)씨는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 하우즈의 실내체육관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기지가 폐쇄될 때까지 20여년간 일했다. 미군들에게 수영 강습 자격증 교육과 시설 관리 등 업무를 하며 세 자매를 키워냈다. 캠프 하우즈는 미 2보병사단 본부가 있던 곳이었다. 그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도 근무를 했다고 한다.
이씨는 "20년 가까이 기지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부가 눈에 선하다"며 "미군들이 2천명 이상 주둔을 할 때는 마을에 활기가 있었는데, 기지가 폐쇄된 뒤엔 공여구역 주변이라는 이유로 행위제한으로 묶여 마을 전체가 낡았다. 정당한 보상과 조속한 개발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두천 기지 건너 '캠프 보산' 새 이름 얻었지만
코로나 통제에 상인들 대리운전·알바로 생계
미군이 남아있는 동두천시도 도시 전체의 쇠퇴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캠프 케이시 맞은편에 형성된 기지촌은 '캠프 보산'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10분의1 수준으로 주둔하는 미군의 수가 줄어든 데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까지 통제하자 활기를 완전히 잃었다. 상인들은 대리운전을 하거나 과수원, 마스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 거대 군수공장이었던 인천육군조병창에 미군기지 '애스컴(ASCOM)'이 들어섰다. 81년간 굳게 닫혀 있던 금단의 땅은 시민에게 잊혀져 갔으나 높은 담벼락 너머 일했던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먹고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내준 곳으로 기억한다.

정근(86)씨는 1963년부터 10년간 애스컴 미군과 그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던 아리랑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일했다. 처음부터 아리랑 택시를 운행했던 건 아니었다.
그는 국제관광공사 산하 기관인 대한여행사에서 영어, 일본어가 가능한 운전원을 모집할 때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 정씨는 새나라 자동차가 수입했던 일제 세단을 국가 외빈 의전 차량으로 몰았다.
아리랑택시 기사 기지 야간통행증에 판문점行도
"부평~서울 요금은 3~4달러였는데 팁으로 1달러"
"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새나라 자동차가 제3공화국 4대 의혹 사건에 휘말려 영업을 중단했어. 기사들은 미군 부대를 오가는 택시가 없는 부평과 문산으로 가야 한대서 나를 포함한 청년들은 부평으로 이동했지."
미8군과 규약을 맺은 아리랑택시 소속 기사는 전국 미군기지 통행증과 함께 통행금지 시절 이용할 수 있었던 야간 통행증도 받았다. 택시 무전기 너머로 '원나인투'와 '투'라는 소리가 들리면 192번 건물에서 미군 2명이 탄다는 뜻이었다.
정씨는 애스컴 모든 건물에 있는 고유번호 '빌딩 넘버'를 외웠다. 주된 호출지는 미군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듣는 클럽이었다. 애스컴에는 이 같은 클럽만 23개가 있었는데 장교·하사관·사병 등 계급별, 인종별로 나뉘어 있었다.
목적지는 서울과 평택, 오산, 동두천이었는데 가끔 판문점을 향할 때도 있었다. 부평에서 서울까지 미터기 요금으로 3~4달러였는데 1달러를 팁으로 받았다.
"월급으로 2만원 조금 안 되게 받아서 살림 꾸리고 팁으로 내 용돈 쓰면 딱 맞았지. 그만둔 지 5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택시 타면 그냥 못 내려. 내가 (팁을) 받았던 그때 생각이 나서…."
아리랑택시 기사들은 차비 대신 종이 통행권을 받았다. PX(군부대 매점)에 가면 5센트, 1달러 통행권을 한데 모아 하나씩 뜯어 쓸 수 있는 책을 팔았다. 이들은 부대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부수입을 벌기도 했다. 걸리면 영업을 할 수 없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부대물품 암거래시장 부평 '블랙마켓'서 부수입
애스컴 축소 산단 노동자 생필품 거래로 바뀌어
이렇게 흘러나온 재화가 부평을 먹여 살렸다는 말이 나왔다. 문화의 거리 인근에 형성된 부대 물품 암거래 시장은 블랙마켓으로 불렸다. 블랙마켓은 우리나라 최대 암시장인 남대문시장에 공급될 만큼 규모가 컸다.
"알약 100개가 든 항생제 '암피실린' 한 병에 지금 돈으로 50만원 정도 했어. 고급 제화점 금강양화에서 신발 두 켤레 사고, 일류 식당에서 점심 먹고, 영화보고, 저녁까지 해결해도 남는 돈이었지."
애스컴 부대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한 1969년부터 부평 블랙마켓은 미군 물품이 아닌 인근 산단 노동자들의 생필품을 거래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정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리랑택시 운전직을 그만뒀다. 주변에선 "그 좋은 일을 왜 관두느냐"고 의아해 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게 큰 이유였어. 자식들 옷이나 학용품을 PX에서 사줬더니 다들 우리가 부자인 줄 알더라고. 이후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일을 찾았지."

42년간 미군 부대에서 일한 서충식(88)씨는 지프나 탱크 등 수송 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다루는 병기창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애스컴은 해방 직후 한국 전국 미군 부대에 무기·행정 지원 업무를 도맡은 군수지원사령부로 통신대와 식량·의류 보급창 등도 함께 있었다. 여러 부대에서 요청한 부품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종이 카드에 기록됐다. 이 카드를 냉장고 만한 크기의 컴퓨터에 꽂으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됐다.
"책을 들고서 각 창고에 가 부품을 받아왔었어. 애스컴엔 병기창 창고만 30개 정도 있었는데 걸어서 50분 정도 걸리다 보니 다들 차를 타고 다녔지."
업무를 하는 데 알아야 하는 단어는 숫자를 제외하면 영어였다. 서씨는 퇴근 시간인 5시가 되면 서울에 있는 영어학원을 가기 위해 부평역으로 달려갔다. 명동성당 인근에 위치한 학원엔 서씨처럼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
인천·대구 등 42년 근무 산전수전 겪은 서충식씨
"세상이 어지러울 때도 월급은 미뤄진 적이 없어"
서씨가 일한 지 10년 조금 지났을 때 애스컴 내 부대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부대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데 필요한 '이동비'를 더 달라고 집단 시위를 해서 월급 3배에 달하는 비용을 받았다.
애스컴 내 목공소 목수들은 떠나는 이에게 가로·세로 2m가량 되는 나무 상자를 4~5개씩 만들어줬다. 미군은 노동자 집 앞에 화물차를 갖고 와 짐을 실어갔다.
서씨는 대구 미군기지로 내려갔다가 1972년 미사일 부대가 부평으로 재배치되면서 인천으로 돌아왔다. 그는 "5·16 군사정변으로 세상이 어지러웠을 때도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월급은 단 한 번도 미뤄진 적 없었다"고 회상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황준성차장, 손성배, 박현주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김동철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