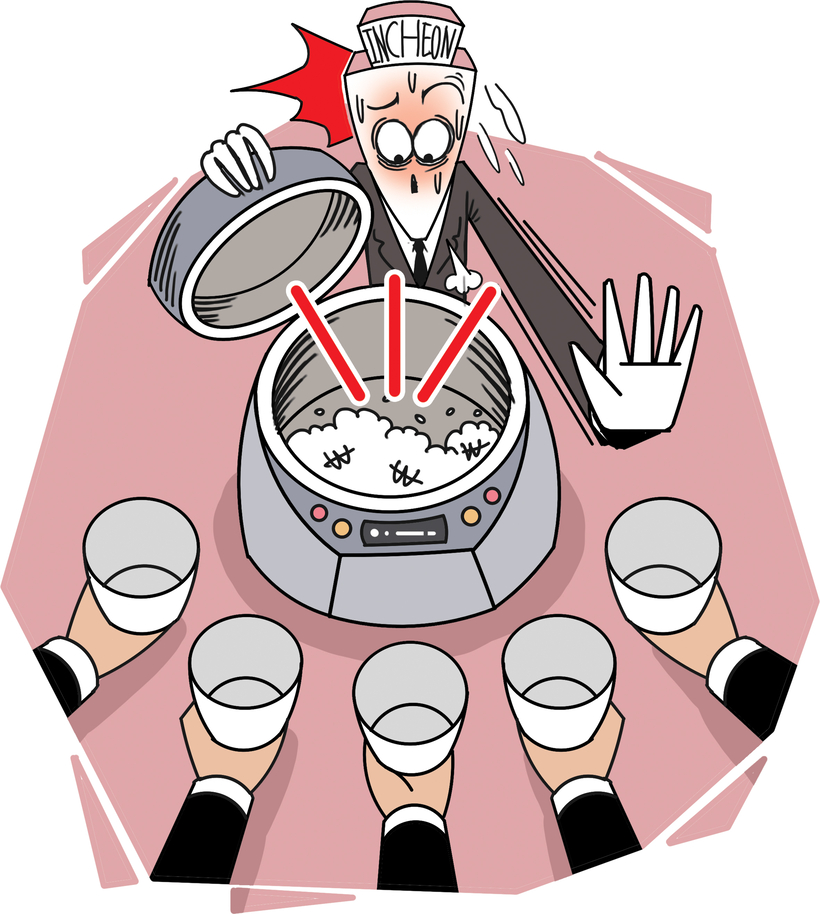어느 품이든 뛰어들면
솜이불이 되던 그 때.
뒷산에서 쑥 냄새 풍겨오면
앞 니 두 개 유난히 희고 큰
내 동생 서준이 손잡고
보물찾기 하듯 들이고 산으로
헤매고 다녔지.
개나리 꽃잎 뜯어
저녁밥 지으면
조각난 햇볕 한줌이 곁들여지고
수줍게 핀 제비꽃으로
꽃반지 만들면
고사리 같은 손에
봄은 곱게 내려앉았지.
붉은 해
수평선 가지에 홍시처럼
열릴 때까지 재잘거리며 놀다가
상희 할머니네 흑염소 두 마리
똥 누고 있던 그 길 거쳐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지.
그러면
마루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봄볕같은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는
달래, 냉이의 알싸하고 매콤한
된장찌개를 저녁밥상에
구수한 웃음으로 올려주셨지.
추억들이 둥둥 떠다니던 그 저녁
참말로 맛있었지
그 맛 정말 꿈만 같았지.
지금도 자글자글 주름꽃이 핀
우리 할머니 새카만 그 손이
눈물나게 그리워지는데…
햇살 곱던 계절, 그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