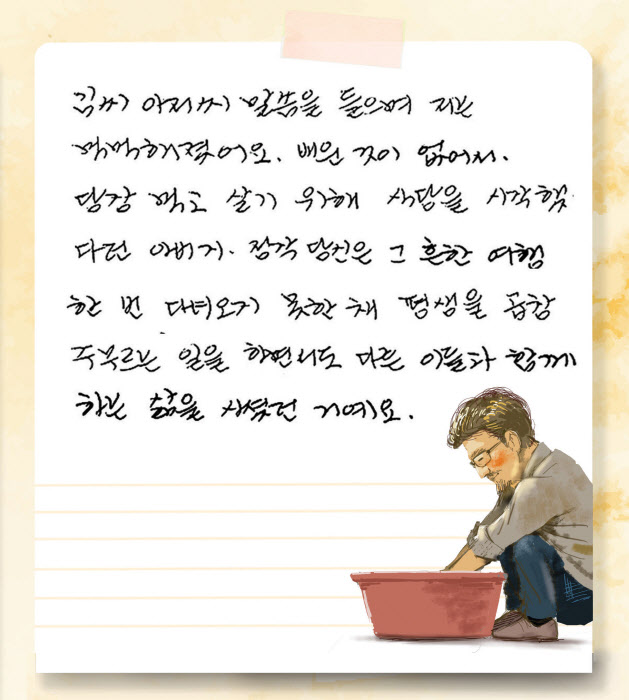

아버지. 민이에요. 요즘 들어 자주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른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늘 비릿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비릿한 냄새가 역겨워 곱창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도 자주 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마당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곱창을 손질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마치 웅크린 사자 같았어요. 고무장갑을 끼면 답답하다며 추운 겨울에도 맨손으로 곱창을 손질하느라 아버지의 두 손은 빨갛게 불어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버지가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지냈어요. 대신 두 살 터울인 혁이가 제 몫을 했죠. 툭하면 식당에 나와 잔심부름을 하고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다른 무엇보다 곱창을 잘 먹었어요. 아버지가 만든 곱창이 제일이라며 너스레를 떠는 혁이를 보며 저는 혁이가 틀림없이 아버지 식당을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근사하게 살 것이라는 치기 어린 결심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만만치 않은 세상은 저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혁이는 식당일과는 무관한 생활로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어 꾸려가는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다른 무엇보다 전문적인 배움이 없었던 터라 회사에 들어가도 몇 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저는 자신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고 결국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았죠.
"워쩌겄냐? 자리 잡을 때까지 내 일 좀 도와라. 나도 이제 일이 힘에 부쳐 힘들었는데 잘 되었어야. 내일부터 곱창 손질은 니가 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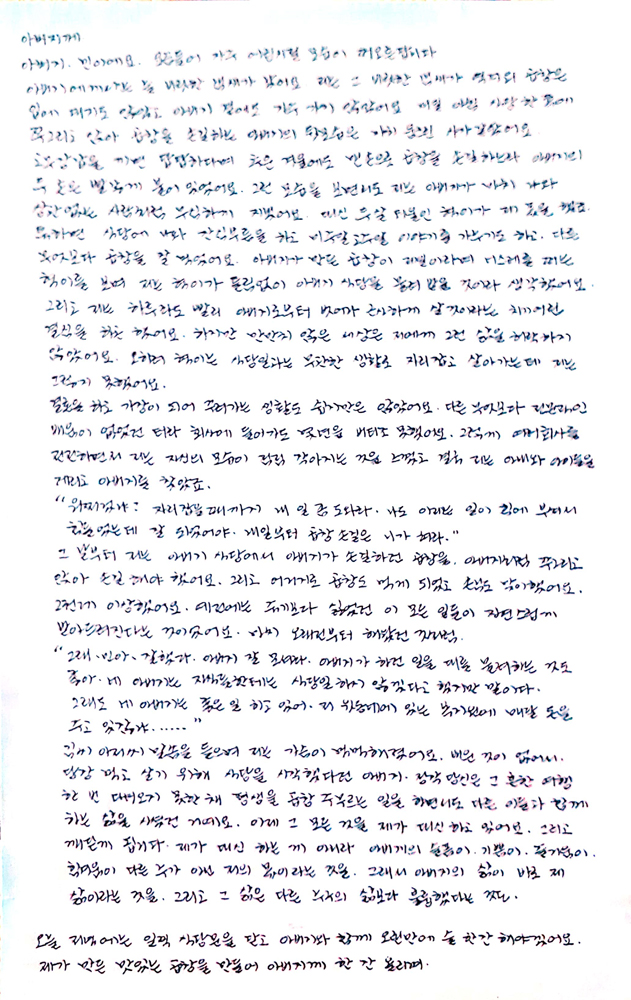
그 날부터 저는 아버지 식당에서 아버지가 손질하던 곱창을 아버지처럼 쭈그리고 앉아 손질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거지로 곱창도 먹게 되었고 손님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죽기보다 싫었던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그래 민아 잘했다. 아버지 잘 모셔라. 아버지가 하던 일을 대를 물려 하는 것도 좋아. 네 아버지는 자식들한테는 식당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이다. 그래도 네 아버지는 좋은 일 하고 있어. 저 윗동네에 있는 복지원에 매달 돈을 주고 있잖냐."
김씨 아저씨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배운 것이 없어서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식당을 시작했다던 아버지. 정작 당신은 그 흔한 여행 한 번 다녀오지 못한 채 평생을 곱창 주무르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제가 대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이, 기쁨이, 즐거움이, 힘겨움이 다른 누가 아닌 저의 몫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삶이 바로 제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은 다른 누구의 삶보다 훌륭했다는 것도. 오늘 저녁에는 일찍 식당 문을 닫고 아버지와 함께 오랜만에 술 한잔 해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