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덕포진교육박물관은 교사였던 김동선, 이인숙 부부가 집도 팔고 퇴직금도 털어서 만든 소중한 공간이다.
"지금은 보물이 됐지만 그땐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 같았죠. 어떤 분이 '김 선생은 뭐하려고 이렇게 쌓아 두냐'해서 웃었더니 '부부가 같이 미쳤군'이라는 얘길 들었어요." 이 관장이 주변 사람들이 말렸던 교육박물관 탄생의 비화를 털어놓았다.

교과서부터 작은 필기구까지 쉽게 버리지 못한 김 관장의 습성은 박물관의 밑천이 되었다. 김 관장이 교육과 관련된 물건을 소중히 모아온 데에는 '언젠가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박물관을 통해 아이들이 감성과 인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길 바랐던 것이다. 그저 하나의 바람에서 머물렀던 그 생각은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자 더욱 확고해졌다.
더는 교사생활이 불가능했던 이 관장은 학교를 그만두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김 관장은 "그만두게 해서 미안하다.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아내를 위로하고, 고향인 김포에 교육박물관을 세웠다. 3학년 2반은 이 관장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학급이다. 인터뷰를 위해 앉아 있던 교실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숙연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뭉클했다.
교과서부터 작은 필기구까지 한 데 모아
불의의 사고 후 더욱 확고해진 교육 이념
섬 폐교서 조개탄 구해오는 등 손때 가득

이 박물관 구석구석 김 관장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다. 섬에 있는 폐교에 가서 조개탄을 구해오기도 하고, 강원도의 학교에서 버리려 놔둔 책걸상을 새벽같이 나가 실어오기도 했다. 교과서나 옛 유물들을 기증해온 고마운 이들도 있었다.
"옛날 물건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온몸에 경련이 난다"던 김 관장의 열정, 그런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 않은 것이 뒷바라지였다"고 말한 이 관장의 따뜻한 마음이 한꺼번에 전해졌다.
그리고 풍금 소리에 눈물을 흘리던 관람객, 밥을 잘 안 먹던 아이가 박물관에 다녀간 후 달라진 일, 옛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며 후원금을 주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김 관장과 이 관장에게는 이 모든 것이 박물관을 만든 보람이자 재산이다.
"두 관장님은 무엇에 꽂히셨냐"고 질문했다. 이 관장이 거침없이 대답했다. "사랑에 꽂힌 거죠." 아내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 교사로서 가진 교육에 대한 사랑. 그러고 보니 덕포진교육박물관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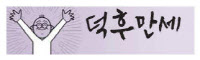













![[덕후만세·(1)] 파주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이영진 관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3/20220307010001147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