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어(歸漁)하고 하루에 18시간 넘게 강 위에서 살았죠."
김남성(53)씨는 '귀어(歸漁)인'이다. 서울에서 10여년을 살다가 IMF로 사업이 망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양평군'에 쫓기듯 정착했다.
"결혼하고 조금 지나서 30대 때 왔어요. 애가 한 살이었는데, 처음 딱 (양평에) 왔을 때는 뭘 해야 하나 막연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주변에서 '다슬기 잡으면 돈벌이가 된다'는 말에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귀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선 어업 경험이 전혀 없던 김씨의 그물은 반년 넘게 텅 비었다. "물이 다 똑같고 고기도 많은 것 같았지만, 전혀 아니더라고요. 물속은 전혀 달라요. 수초는 어디 있는지, 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이걸 알아야 하더라고요."
김씨가 물속을 깨우쳐 기술을 터득할 때까지 약 4년이 걸렸다. 하루 18~20시간을 배 위에서 보내며 삶은 계란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배운 노하우였다.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술과 경험이 필요해요. 여기 남한강에는 댐이 있는데, 언제 방류하는지, 장마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하루 18시간씩 고기잡는 기술 익혀
직판장·매운탕집 운영 등 노력에도
"안정적인 수입 유지하기 어려워"
매일같이 열심히 그물을 쳤지만, 수입은 여전히 불안했다. 김씨와 같이 남한강에서 다슬기를 잡는 어부(漁夫)들은 1년에 150~200일 정도 일할 수 있다.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다슬기 금어(禁漁)기간이고 겨울에는 강물이 얼어서 조업할 수가 없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세 배를 띄울 수가 없다.
다슬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야 했던 김씨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다. 첫 시도는 '직판매장'이었다. 이를 위해 김씨는 직접 어촌계를 꾸려 어부들을 모았고, 어부들이 잡은 쏘가리 등을 직접 팔기 시작했다.
그다음 '매운탕 집'을 열었다.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 김씨를 비롯해 어촌계가 모두 안정적인 수입을 찾은 듯했다. 그러나 안정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2년 전 매운탕 집 문을 닫았다.
"인건비가 한 달에 기본이 300만원에 가깝고, 식자잿값도 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죽 쒀서 남 좋은 일 한 거죠."
겨우 남한강에 자리를 잡았지만, 앞길은 막막했다. 직접 잡은 다슬기를 소쿠리에 담아 도로에 나가 팔기도 했다. 다슬기는 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모아두면 절반 이상이 죽는다. 중간 상인이 안 가져가면 다시 남한강에 놔줘야 한다.
"열심히 잡았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하루는 조업을 접고 직접 트럭 끌고 도로에 나가서 팔았어요. 근데 잘 팔리지도 않고 1년에 조업 기간도 많지 않은데, 하루 조업을 쉬는 게 더 손해더라고요." → 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경기도에 '민물어부'가 산다·(3)] 직접 발로 뛰어야 살아남는 어촌계 현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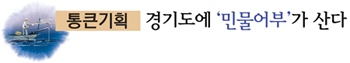













![[통큰기획-경기도에 '민물어부'가 산다·(3)] 직접 발로 뛰어야 살아남는 어촌계 현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4/20220407010001452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