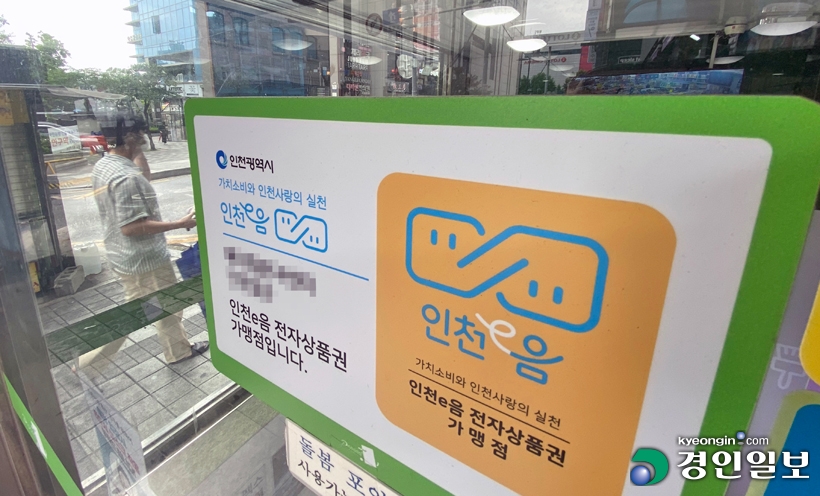
올해로 도입 4년째를 맞은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이 정책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인천e음은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정책으로 출발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복지 정책화한 측면이 있다.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인데, 정책개편과정에서 2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인천e음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 플랫폼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230만명 가입한 인천e음
인천e음 카드는 2018년 4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름은 '인처너(INCHEONer) 카드'다. 전국 최초의 전자식 지역화폐였다.
시민들의 소비가 인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이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컸다. 모바일 앱과 선불형 IC카드가 결합된 구조로 편의성을 높였다.
시민 공모를 거쳐 '인천e음'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듬해부터 캐시백 지급이 본격화됐다. → 표 참조

캐시백 지급을 위한 국비 지원이 결정된 것도 이때부터다. 인천e음은 배달 주문, 쇼핑몰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이후 인천e음을 도입하는 기초단체들이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등으로 확대되면서 '캐시백 10%' 지급이 본격화됐다. 국비와 시비에 지자체들의 예산까지 더해지면서 캐시백 비율이 높아졌다.
인천e음 카드 사용이 안 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출이 줄고, 그만큼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 매출이 늘었다. 약 239억원의 매출이 이전된 건데, 투입된 캐시백 예산(77억원)의 3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기관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애초 '골목상권 활성화 경제정책'
코로나 거쳐 '복지정책화'한 사례
가입자 이미 230만명 '매머드급'
코로나19는 인천e음의 사용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도입 초기 한시적이었던 인천e음의 '캐시백 10%' 지급 기간도 점점 길어졌다. 기초단체 재정 사정에 따라 캐시백 지급 비율이 달랐던 문제도 해소됐다.
가입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8년 1만2천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19년 92만9천명으로 늘더니 2020년 138만5천명, 2021년 218만4천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32만5천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4만명 정도 더 가입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시민 1인당 10만원)을 인천e음으로 지급한 것도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 정책이 복지 정책화됐다.

■ 생활 플랫폼化 모색 필요
코로나19 상황 완화는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로 이어졌고, 인천e음 캐시백 지급 비율도 10%에서 5%로 낮아졌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e음 카드 사용처의 업종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캐시백 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다시 소상공인 등 초점 개편 구상
전문가들 "공동체 이익 실현할 수단
市정책 공신력 가진 장점 활용 필요"
전문가들은 인천e음의 지역화폐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분야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전체 인구(295만명)에 육박하는 232만5천명의 가입자 수는 그 기반이 된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e음은 인천의 거의 모든 소매점포에서, 절대다수의 시민이 사용하고 있다"며 "인천시 정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공신력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장점을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인천형 생활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인천e음 정책 개편 과정에서 조금 더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