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때문에 울고 웃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옷, 음식과 더불어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집이 갖는 의미는 그보다 좀 더 복잡다단하다. 개인의 삶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의 중심에 집과 땅이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 장만을 어떻게 할지 다투는 예비부부의 이야기,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샀다가 대출금 부담에 잠 못 이루는 이야기, 집값이 떨어질까 단단히 뭉치는 지역 커뮤니티의 이야기 등은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집값이 너무 오르거나, 혹은 떨어져서 정부 지지도가 출렁이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에 정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한다.
한편에는 취약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추위와 더위를 온몸으로 견디는 이들도 상존한다.
한국부동산학회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집, 그리고 땅과 얽힌 인간사에서 부동산학의 역할을 찾는다.
서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한국사회는 특히 집을 가져야 한다는 욕망이 강하다. 그리고 정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비교적 크다"며 "부동산학의 존재 이유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다. 우리사회의 부동산은 '소유'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이를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보다 나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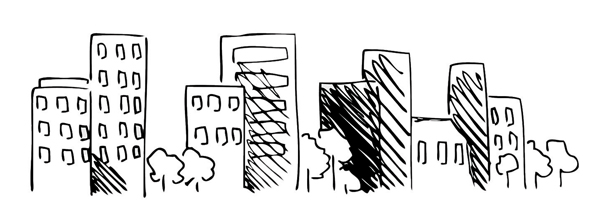
■ 부동산 학자로서 40년,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개선이 부동산학의 목적"
토지 제도의 역사는 깊다. 매 왕조마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땅과 집에 대한 욕망의 역사도 깊다. 그러나 부동산을 학문으로 연구한 역사는 비교적 길지 않다.
"부동산학이 우리 학계에 도입된 것은 1982년 정도다. 40년 가량이 됐다. 박사 학위도 2000년대 이후부터 등장했다. 실용학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점 등이 맞물려서 행정학, 법학, 도시계획, 건축, 경영이나 경제 등을 전공했던 다양한 분들이 부동산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쌓이면서 기틀이 마련됐고, 점점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서 교수는 "부동산 상황이 국가마다 다르다보니 연구하는 양상도 조금씩은 다르다. 이를테면 미국은 땅이 넓고 크다보니 어떻게 자본을 투입해 개발하고 분양할지에 대한 측면에 방점이 찍혀있다. 일본은 제도 중심의 학문, 유럽은 토지 경제 등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좀 더 복잡하고 종합적이다. 물리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 대해 복합적으로 연구가 이뤄진다. 특히 우리 부동산시장의 경우 정치, 그에 따른 제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학이 우리 학계에 도입되기 전이었지만 그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기도 했고, 공인중개사는 아예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다 1983년 무렵, 부동산학을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다. 하나둘 논문을 썼던 게 100여 편에 이를 정도다. 저서 역시 40편에 달한다.
그가 학자로서 걸어온 40년 동안, 한국사회 역시 부동산 개발로 쉴새 없이 요동쳤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가 개발됐고, 경기도에 1기 신도시가 들어섰다.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역시 온 사회를 흔들었다.
부동산학, 인간과 부동산 관계 개선이 목적
'이용' 중심으로 바뀌도록 점진적 지원 필요
자본주의 발전할수록 '부의 양극화' 가속도
그러는 사이 부동산은 훨씬 더 깊이 있고 복잡하게 인간사에 맞물리고 있다. 부동산학의 역할과 연구 영역도 그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4년 동안 역임했던 그가 공정주택포럼을 개설한 이유도 이와 맞닿아있다.
서 교수는 "학문의 목적은 결국 인간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고, 사회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해 인간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본래 목적"이라며 "어떤 제도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생기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떨어져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문제도 꾸준히 화두로 떠오른다. 주택시장이 좀 더 공정해지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지금의 수도권 부동산시장 총선 때까진 이어질 것…인위적 개입 줄이고 '이용 중심' 전환 필요"
최근 몇년 간 부동산 시장엔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엔 부동산 광풍이 불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역대급으로 치솟았던 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가 서서히 줄더니 지금은 10년 만에 가장 바닥 수준에 이르렀다.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취득, 보유, 양도를 억제하는 '3불' 정책을 폈었다. 여기에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맞물려 초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바꿔야 지금의 시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음 총선에서 정치 구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달려있다"며 2024년 총선까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에 정치·제도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리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서 인위적 개입이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얘기다.
그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특히 사회적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강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우리나라에선 특히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운데, 여기에 정부·정치권 개편에 따른 제도 변화가 계속 더해지면서 시장을 왜곡시켜 문제를 심화시킨다.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부동산을 소유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개편에 따른 제도 변화로 문제 심화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 정부의 해결 과제
동시에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 교수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부의 양극화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엄밀히 말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의식주를 지켜주는 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90%의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나머지 10%의 부동산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실현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학자로서의 그의 믿음이다.
인터뷰 말미에 문득 부동산 전문가인 그가 부동산 투자에선 얼마나 성공을 거뒀을지 궁금해졌다. "노 코멘트"였다.
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서진형 교수는?
▲1964년생, 경북 의성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대구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19대, 20대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전 국토교통부 국토공간정보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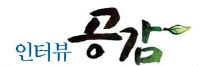


![국가로부터 노동자 지켰다… 역사가 기억한 인천 그 교회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12/news-p.v1.20250411.e4766fce815a48c7b69e5d3d79485a0a_R.png)

![[영상+] 바야흐로 팝업 전성시대… 갤러리아 광교점 ‘브레드이발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12/news-p.v1.20250411.88e57afd41334828a13097f85a0a9bcf_R.png)








![[인터뷰…공감] '국내 최초 자폐 장애인 교수' 윤은호 한양대 전임연구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9/20220920010006530000299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