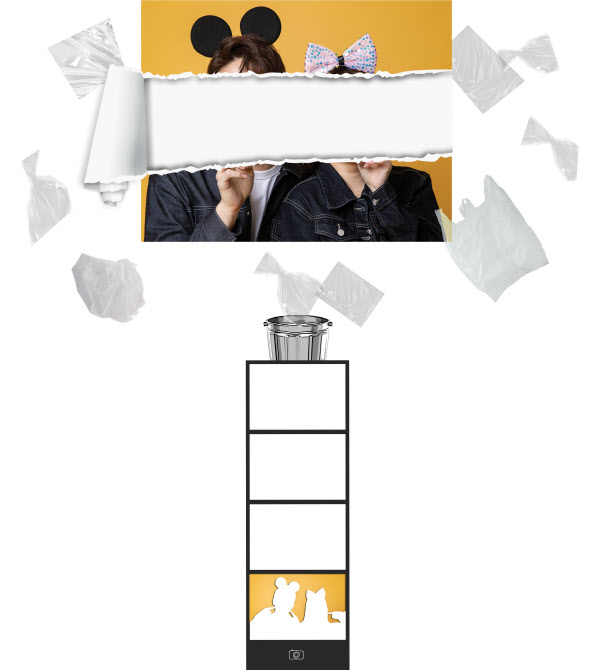
"친구들과 만나면 꼭 가요. 이젠 필수코스나 다름없죠."
'셀프사진관' 전성시대다. 특히 20·30세대에게는 만나면 꼭 찾아야 하는 필수코스이자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열풍이다.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셀프사진관에 가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흔한 일상이다.
대학생 김선태(24)씨는 "셀프사진관에서 친구·지인들과 사진을 찍는 것은 무언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라며 "젊은 세대의 필수 소비 형태로 정착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말에 찾은 경기도 내 셀프사진관 10여 곳의 내부 모습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진 찍을 때 활용하기 좋은 모자·선글라스 등의 소품들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날것의 사진을 담을 '비닐봉투'는 모든 사진관이 빼놓지 않고 비치해놓고 있었다. 사진을 찍은 후 따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넉넉한 양의 비닐봉투가 사진관의 한편을 채웠다.

■ '공짜' 비닐봉투 얼마나 낭비될까?
그렇다면 이 같은 비닐봉투들은 어디서 얼마에 가져왔을까. 도내 7곳의 셀프사진관에 따르면, 매장에서 쓰는 사진 보관용 비닐봉투 가격은 장당 1.5원에서 25원으로 제각각이었다. 이들 업체에서 소비하는 비닐봉투의 규모 역시 편차가 컸다. 한 달 평균 적게는 200장을 썼고, 많은 곳은 3만장 가량을 소비했다.
이를 종합하면, 손님이 많은 업체는 한 달간 최대 75만원 상당의 비용을 비닐봉투 구매비용에 쓰고 있는 셈이다.
구리시에서 셀프사진관을 운영 중인 손모씨는 "본사를 통해 비닐을 일괄 구매하는 곳도 있고, 업주들이 직접 사설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번에 구입하는 양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른데, 적지 않은 금액을 비닐 구입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비닐봉투 무료 제공
많은 곳 월평균 3만장 소비
24시간 운영 전력 낭비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3㎡를 초과한 도매 및 소매 판매업소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다. 33㎡ 내외 면적을 가진 셀프사진관들은 이를 비웃듯 1회용품 낭비의 온상인 셈이다.
셀프사진관에서 낭비문제는 비단 비닐봉투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대다수 사진관에 놓인 기계는 사진을 짝수로 찍게 설계돼 있다. 홀수 인원으로 사진을 찍을 때, 인원수에 맞춰 사진을 나눠 갖고 싶지만 별수 없이 한 장의 사진 필름을 추가로 뽑아야 하는 것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어 사시사철 전기가 소비되는 문제도 컸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기기,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환하게 켜둔 내외부 등도 전력낭비에 한몫하는 요인이다. 앞서 7곳 업체의 평균 월 전기요금은 30만~40만 원에 달할 정도였다.

■ "필요해서 가져가는데, 큰 문제라도?"
셀프사진관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서다. 취재진이 셀프사진관을 다니는 주변 20대 8명을 상대로 이용 현황을 물었더니, 한 달에 25회나 셀프사진관을 찾는 '단골' 이용객도 있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비닐봉투를 빼놓지 않고 꼭 쓴다"고 했다.
직장인 김태희(23)씨는 셀프사진관의 비닐봉투 낭비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봉투도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기에 꼭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장씩 사용 문구뿐 제한 못해
일회용품 규제 대안 준비 안돼
'33㎡ 이하' 매장은 적용 제외
취재진이 찾은 용인시 보정동과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죽전동) 인근 6곳의 셀프사진관은 모두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했다. '1장씩만 가져가 달라'는 권고 형식의 문구가 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돼 많은 양을 가져가도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대학생 고승완(22)씨는 "사진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을 가져가는 편"이라며 외려 비닐봉투의 필요성을 높이 샀다.
셀프사진관을 자주 이용하면서도 비닐봉투 낭비 등 환경문제에 신경을 쓰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대학생 한송희(22)씨는 "셀프사진관을 이용하면서 비닐 등 쓰레기가 낭비되는 것이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헐렁한' 관련 법, "정부가 적극 행정 나서고, 사진관도 변화 동참해야"
오는 11월 환경부가 종합소매업 등 일회용품을 쓰는 중소규모 매장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를 유예했던 1년 계도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셀프사진관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대안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더구나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인데, 셀프사진관 규모가 그 규모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법률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객도 '환경 악영향' 걱정
"종이재질로 바꾸면 좋을듯"
실효적인 '적극 행정' 요구도
이를 두고 셀프사진관을 자주 찾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안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끈다.
한송희 씨는 "카페에서 종이 빨대를 도입했듯, 사진을 보관하는 비닐을 종이 형태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태균(21)씨는 "비닐을 두고 고민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도 "비닐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환경문제와 관련지어 고민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셀프사진관 업체가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생 김지원(21)씨는 "환경친화적인 기업들이 사용된 용기나 포장지를 모아오면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행사를 본 적 있다"며 "깨끗한 비닐을 본사나 매장 측에 가져다주면 쿠폰으로 바꿔주는 식의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셀프사진관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혜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셀프사진관에서) 비닐봉투를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 소재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이도 궁극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유상으로 제공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직접 봉투를 챙길 수 있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이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만을 고수하고 있는데, 독려 차원이 아닌 현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강신우·강예진·서하나·여지우·임혜영 (단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경인일보 학생기자단)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204.0379f5406224439390b517694eb055ed_R.jpeg)






![[이슈&스토리] 내달부터 '아트페어' 잇따르는 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8/20230803010001494000063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