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는 천혜의 경관과 생태계를 품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린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는 1.71㎢ 면적에 10가구 남짓 사는 작고 조용한 섬은 최근 몇 년 사이 백패킹족(배낭 하나로 캠핑하는 사람)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 주말마다 200명 넘는 인파가 굴업도로 몰려들었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주말 직후인 지난 12일 오후 굴업도를 찾았다. 기상 악화로 주말에 배가 뜨지 않아 섬에 머문 외부인은 없었다. 그사이 섬은 조금이라도 쉬었을까. 이 잠깐의 기대는 '내가 가져온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린 선착장을 지나 다다른 목기미해변에서 곧 무너졌다.

해변은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다. 각종 스티로폼 조각과 페트병이 해변을 따라 길게 널려 있었다. 섬 방문객이 현지에서 버린 쓰레기와 외부에서 밀려온 쓰레기가 뒤엉킨 듯 보였다.
한자가 적힌 술 32병이 담긴 하늘색 플라스틱 궤짝 2개는 중국산 쓰레기란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해줬다. 일본어가 적힌 초록색 페트병도 밟혔다.
밀려온 외부쓰레기 가득한 해변
'한국의 갈라파고스' 명성 무색
녹슨 냉장고와 '대우전자' 상표가 찍힌 부서진 세탁기는 언제 어디서 버려졌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게 했다. 목기미해변 가운데 솟은 모래언덕에는 100개가량의 폐어구가 방치돼 있었다. 해변 끝자락 바위 사이사이에는 부서지다 만 스티로폼 부표와 페트병이 끼어 있었다.
이튿날, 물이 빠진 목기미해변을 다시 찾았다.
어제는 존재하지 않던 양주병, 장화, 심지어 성인 남성이 양팔을 벌린 너비쯤 되는 대형 플라스틱 정화조까지 '새로운 쓰레기'가 먼바다에서 떠밀려 들어와 박혀 있었다. 이대로는 굴업도를 더는 갈라파고스에 빗대며 추켜세울 순 없다.

수거 13만8천t… 발생보다 적어
배출감소 정책·사회적 노력 중요
바다에 잠겼거나 떠다니는 해양쓰레기 규모를 수치화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굴업도처럼 섬에 널린 쓰레기는 그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가늠케 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약 14만5천t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하천 등 육지에서 흘러온 쓰레기와 폐어구 등으로 분석한 수치라서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약 13만8천t으로 수거량이 발생량(추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경인일보 취재팀은 굴업도를 시작으로 인천·경기해역(경기만) 전반으로 확장해 해양쓰레기 실태를 확인했다. 취재 결과, 우리 앞바다가 쓰레기에 포위된 듯 쓰레기는 어느 곳에서나 걷잡을 수 없이 흩어지고 쌓여가는 중이었다.
중국·북한 접경지역과 한강 하구를 끼고 대규모 어장과 국가항만이 있는 인천·경기 앞바다는 대한민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이 섬마다, 지역마다 다른 만큼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애초 해양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태평양 한가운데는 한반도 면적 7배에 달하는 플라스틱 더미(GPGP·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가 섬처럼 쌓여 지금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태평양 저 멀리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인일보 취재팀은 해양쓰레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결국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는 과정도 들여다봤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글 : 박경호 차장, 김태양 기자, 유진주·한달수·변민철 수습기자사진 : 조재현기자편집 : 김동철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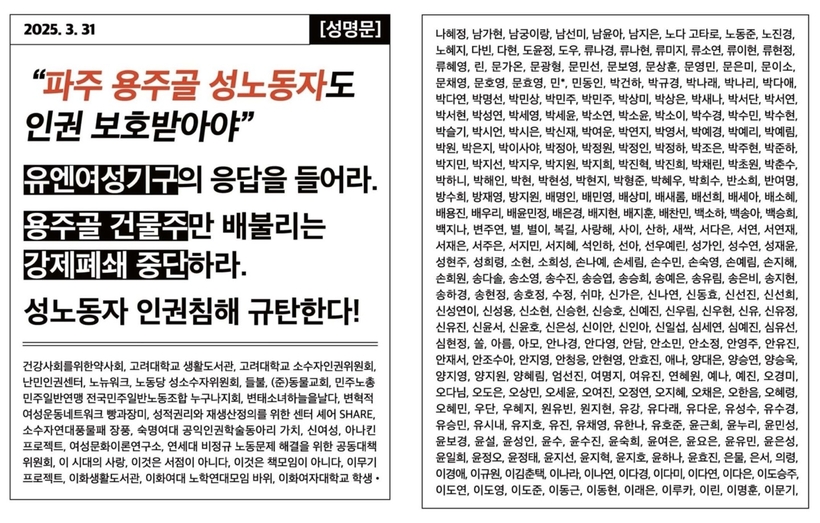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下)] 하얀 '스티로폼 파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7/20210726010004938_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