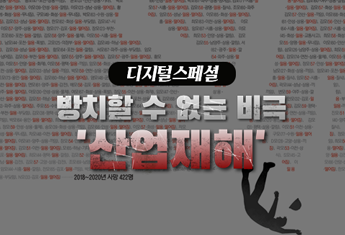한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2019년 1월25일 김포시 고촌읍의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함바 식당(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식당)에서 먹은 밥이 채 소화되기 전이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임시 포장된 언덕을 올라가던 레미콘 차량이 4m 아래 거푸집 작업장을 덮쳤다.
현장에서 형틀 목공 작업 중이던 이현재(가명·62)씨 눈앞으로 4t짜리 거푸집이 넘어왔다.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거푸집을 빠져나온 현재씨가 마주한 것은 전도된 레미콘 사이로 삐져나온 누군가의 '다리'였다. 커다란 레미콘이 전국 곳곳을 돌며 15년 넘게 함께 일한 두 살 아래 동료 배모씨를 깔아뭉갰다.
"레미콘에 깔려 다리만 보이는데 그때 느낌이, 죽었구나…."
그의 동료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와 그의 동료는 강원도 영월의 한 건설현장에서 처음 만났다.
"잠만 따로 잤지, 같이 밥 먹고 일하고 거의 종일 붙어 있는 친구였어. 현장에서 만났지만, 마음이 잘 맞아 오래 함께 일했지."
동료는 떠났고, 현재씨만 남았다.
거푸집 작업장 덮친 레미콘 차량
"밑에 깔린 친구 다리만 보였다"
2년 지났지만 아직도 악몽 시달려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사고가 현재씨를 괴롭힌다. 매일 같이 죽은 동료가 나오는 꿈을 꾼다. 수면제를 먹어도 4시간 이상 잠들지 못한다. 그러다 술에 손을 대고, 술 없인 잠들기 어려워졌다. 열흘에 한 번 입안을 점령하는 염증 탓에 밥맛도 잃어 점점 말라 갔다. 80㎏에 가까웠던 몸무게는 62㎏까지 줄었다.
"주위에서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힘들어 하냐'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정말 몰랐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
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노임도 없다. '생활고'가 현재씨의 삶에 멍에를 씌웠다. 사고 이후 9개월 만인 2019년 10월에서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뒤 겪은 '산재 트라우마'가 그의 진단명이다.
18개월간의 정부 지원 산재 피재자 요양 급여는 지난해 8월 끊겼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배운 일이라곤 목공이 전부인 그를 현장으로 밀어냈지만, 이내 못과 망치를 쥔 주먹에 힘이 풀렸다. 몸과 마음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그렇게 두 달여를 지내다 지난해 11월에서야 어쩔 수 없이 트라우마의 건설현장으로 다시 몸을 담기 시작했다.
9개월만에 '산재 트라우마' 인정
요양급여 끊겨 결국 또 현장으로
사고 이전 삶 회복 여전히 어려워
"출근 전날 다시 현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걱정돼 내리 악몽만 꿨어."
결국 그는 약을 늘렸다.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자신의 증상이 '트라우마'인지조차 몰랐던 현재씨는 사고 두 달이 지나서야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병원도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 회의적이었다.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항상 불안해. 사고가 내 잘못으로 일어난 것도 아닌데, 날벼락 같은 일로 몸도 아프고 트라우마도 겪으면서 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억울해."
시간 날 때 책을 읽고 삶의 재미를 찾아가던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누군가에겐 소소한 일상이 산재 트라우마 나락에 떨어진 현재씨에겐 고행이 됐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