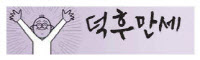남양주 모란미술관의 이연수(사진) 관장은 그냥 예쁜 것을 보면 좋았고, 누구보다 감성이 풍부했던 소녀였다.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때와 비슷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변하지 않은 미술에 대한 애착은 지난 30년간 미술관을 가꾸고 지켜온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2만8천여㎡. 넓고 파랗게 펼쳐진 잔디밭과 나무·꽃이 심어진 정원 사이에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조각작품 100여 점이 자리한 모란미술관은 조각전문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2만8000㎡ 정원에 국내외 100여점 자리
日 '하코네 미술관' 모델… 30년간 가꿔

"세계 곳곳의 미술관을 다니면서 내가 운영해 봐야겠다 생각한 곳이 일본 하코네 미술관이었어요. 조각이 좋더라고요." 조각의 매력에 끌린 이 관장은 본격적으로 조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작가들과 인연을 이어나갔다.
그런 이 관장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작품 중 하나가 그의 사무실에 있는 최의순 작가의 '빛'이라는 작품이다. 작품을 팔지 않았던 작가는 모란미술관에서 전시를 끝낸 뒤 이 작품을 이 관장에게 선물했다.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 관장이 전시하는 석 달 동안 매일 감상할 정도로 좋아했던 작품이었다.
"작품에 대해 말한 적도 없었는데 선생님이 느끼셨나 봐요. 전시가 끝나는 날 작품을 주시는데 너무 좋아서 쓰러질 뻔했어요. 10년 동안 수장고에 넣지도 않고 매일 본 거죠.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길 것 같아요."
최의순 '빛' 가장 특별 "10년간 매일 봐"
"더 바랄 것 없어… 떠난 자리 아름답길"
미술이 좋아서, 미술을 사랑해서 작품들을 보러 다녔고, 빠져들게 됐다. 좋아하는 것을 계속 보니 정도 들었다. 하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일은 절대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립미술관으로 자리 잡아 나가기까지 그만의 철학이 필요했다. 바로 '사람'이다.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배웠어요." 정말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이 관장은 작품을 선뜻 사지 못했다고 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이 보이면 꼭 어떤 작가인지 알아보고 산다고.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단다. "고(故) 이경성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작품이 사람이라고. 작품 속에 작가가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봐야 합니다."

나의 온 정신이 들어가 있는 '목숨' 같은 곳, 이 관장에게 미술관은 그런 존재이다. 인생 대부분을 쏟아부었고, 남은 이 관장의 인생 또한 이곳에서 흐를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그런 건 없다'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뿌리같이 내려온 미술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모인 것이 50년이에요. 소중한 이 재산에 더는 무언가를 보태고 싶지 않아요. 더 바라는 것은 없어요. 후회도 욕심도 없이 이연수가 떠나간 자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