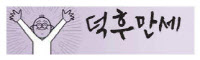속을일 없어 매력적…
"청자나 백자처럼 반짝거리거나 정교하진 않지만 옹기는 우리 옆에 늘 있어 왔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공기처럼요. 푸근하면서 편하고, 담담한 여백의 미를 가진 것이 옹기의 매력이죠."
파주 한향림옹기박물관 한향림 관장의 눈이 박물관 안팎에 가득한 크고 작은 옹기가 햇빛을 감싼 것처럼 반짝였다. "누군가가 이걸 모아서 보여줘야 한다면 내가 해야 하나란 생각을 했어요."
도예를 전공한 한 관장은 은사가 보여준 옹기에 대한 사랑과 우리나라의 옹기가 점차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수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짜를 만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옹기. 그래서 속아 살 일이 없다는 옹기는 한 관장의 남편조차 빠져들 만큼 매력적이었다. 부부는 함께 옹기에 대해 공부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고, 지역별로 옹기를 수집하며 분석했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1950년대 이전의 옛 옹기들과 무형문화재 장인들, 전국 팔도의 옹기장들이 기증해준 작품, 엄마와 할머니 세대가 쓰던 손때 묻은 옹기 등 850점 정도이다. 오래됐으면서도 기형이 완벽하고 문양이 좋은, 실용미와 예술미를 모두 갖춘 옹기가 한 관장의 컬렉션들이다.
원하는 옹기를 찾아 전국 팔도를 누비다 보니 밖에 내놓지 않은,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내는 데도 능숙해졌다. 10년 전쯤 전라도와 충청도를 돌다가 들른 한 옹기 골동품점에서는 좋은 물건을 내놓지 않았던 주인의 방에서 이불로 덮어놓은 옹기뚜껑들을 찾아내 사오기도 했다.
한 관장이 예쁜 소장품으로 꼽은 '쌀함박'은 중국을 통해 백두산 관광지에 갔을 때 구석에서 먼지가 소복히 쌓여있는 것을 용케 찾아 사온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지역의 골동품점 사이에서 '파주 헤이리 옹기박물관의 옹기는 내가 다 넣었다'는 가짜뉴스로 손님들의 환심을 사려했다고 하니, 과연 한 관장의 옹기 컬렉션은 '꾼'들에게도 인정받는 가치를 지닌 것이 확실했다. 그만큼 까다롭게 옹기를 골라 모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가장 좋아하는 옹기로는 투박하지만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질독'을 골랐다. 불길이 지나간 흔적이 남은 표면, 내부를 물레로 문지르지 않아 더욱 아름다운 문양, 이렇게 큰 질독은 잘 만날 수도 없거니와 예술적인 느낌도 물씬 나니 한 관장이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그렇게 30년 넘는 세월을 옹기와 함께해 온 한 관장에게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었다. 사립 뮤지엄을 운영하는 관장들이라면 한 번쯤은 했을 만한 고민, '이 일을 누가 이어서 해 줄까'란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이다. 인생을 온전히 쏟아부은 곳이니 그런 곳을 지켜간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소장품들을 끝까지 남겨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할지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한향림이 아닌 도자기와 옹기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게 남은 숙제입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