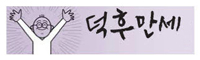그런 김 관장에게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관장님 호가 '등잔'이시라면서요?" 정말일까 싶지만 진짜다. 등잔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호를 그렇게 지었을까 싶었다.
"등잔이 돈이 되는 물건은 아니지만, 중요성으로 따지면 최고죠. 등잔이 없으면 일을 못 하고, 인생의 상당 부분이 밤이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등잔의 쓸모는 사라졌다. 집집이 가지고 있던 등잔들을 버렸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혔다. 하지만 오랫동안 어둠을 밝혀줬던 중요한 물건이기에 김 관장에게 있어 등잔은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자리했다. 그래서 그의 인생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고, 평생을 등잔과 씨름하며 많은 역사를 알아내기도 했다.

1969년 故 김동휘 '고등기전시관' 첫발
도자기·가구·민화 등 1천여 수집·소장
도자기·가구·민화 등 1천여 수집·소장
태어나 눈을 뜨면서부터 집 안에 보이던 게 모두 골동품이었다는 김 관장은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을 보며 부러워했다고 말했다. "우리 집엔 구닥다리들, 부서진 것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냈고, 그게 몸에 밴 사람인 거지."
마치 박물관 같았던 집과 등잔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깨닫고 꾸준히 모아온 할아버지와 아버지. 김 관장이 박물관을 운영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온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박물관에는 등잔을 포함해 도자기, 가구, 민화 등 3대에 걸쳐 수집한 1천여 점의 소장품이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연대도 다양하다. 1대 관장이자 설립자인 고(故) 김동휘 관장은 1969년 자신이 운영한 산부인과 병원 2층에 '고등기전시관'을 개관한다.
이곳은 지금의 한국등잔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 첫걸음이자 소장한 유물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장소가 됐다. 이토록 오랜 시간을 지켜온 사립박물관이 있을까. 역시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2020년 조족등·화촉 경기민속문화재로
"사회 문화에 기여… 꾸준히 나아갈것"
지난 2020년에는 박물관의 유물 두 점이 경기도민속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나는 발을 비추는 조족등이고, 하나는 혼례나 예식 등의 행사 때 사용했던 화촉이다. 박의 앞면을 잘라 만든 조족등은 어떻게 움직이든 항상 불이 박 안에서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화촉은 여러 빛깔로 물든 화려함 속에 모란꽃이 수놓아져 있고, 실제 민간풍속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더한다.

김 관장은 또 등잔이 온돌문화와 고인돌까지 연결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했다. 돌을 깨는 기술이 구들장에도 적용됐고, 좌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등잔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김 관장은 "등잔이 아니었다면 증명하기 어려웠을 이론"이라며 "이것이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학을 담아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후세가 계속해서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가진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 문화에 절대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꾸준히 가야죠. 지금 가진 재산은 없지만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니까요."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