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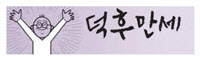
왜였을까. 김정옥 얼굴박물관장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며 진한 감동이 전해졌다. 그에게 얼굴박물관은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곳이었다.
"문화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한 무대이고, 누구나 그 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당초 얼굴박물관은 현대인이 과거의 문화예술과 만나 인간적인 대화를 하는 공간으로 생각했어요."
연극계의 원로 연출가로 한평생을 살아온 그가 지난 2004년 박물관을 열었다. 40여 년간 꼬박 모아온 수많은 소장품 앞으로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널찍한 계단이 자리한다. 박물관이면서도 극장이기도 한 '뮤지엄 씨어터'라는 특이한 공간은 그렇게 탄생했다.
오랜 시간 연극에 몸담았기 때문일까. 그가 '얼굴'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졌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든 허구죠. 인간과 관계가 있는 건데, 그 소통의 중심이 되는 것이 얼굴이에요. 소통의 통로인 거죠."
목각·도자인형·초상화 등 다양한 수집
원로 연극 연출가… "좋아하니까 계속"
아흔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소년 미소'
김 관장의 소장품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문관석, 동자석과 같은 돌사람(石人)과 목각·도자 인형, 초상화, 무속화까지 다양했다. 또 세계의 문화예술인과 배우들의 사진도 볼 수 있다.

어쩌면 각자의 개성을 가진 얼굴들이야말로 김 관장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로운 것이 예술'이라고 한 김 관장은 각기 다른 표정을 한 소장품이 그래서 좋았다고 말했다.
첫 소장품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다. "제일 처음 산 것이 도자기였어요. 거리에서 옛날 도자기 몇 개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리된 거였더라고. 외국에 유학을 가면서 우리 것에 관심이 생기게 됐고, 그 이후로 수집을 하게 됐어요."
형편이 닿는 대로 모았다고 한다. 집착하지 않으려고 했다지만, 좋아하는 것을 보면 사려고 노력했다. 싸게 파는 골동시장에도 자주 가고, 고가구를 사서 화가 친구가 가진 그림과 바꾸기도 했다.
그런 그는 골동품상에게도 신임이 두터웠던 모양이다. 늘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외상으로 물건을 살 때도 있었는데, 곧잘 내줬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대신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갚았다고 한다)
대학교수, 한국문예진흥원장 등 자리와 직위에서 자유로워진 김 관장이 여생을 뜻있게 보내기 위해 박물관을 운영한 지도 2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그는 박물관일뿐만 아니라 연극 관련 활동도 계속 이어왔다. 지치지 않고 한 길을 달려온 그의 인생이 존경스럽기도 했다.
"좋아하니까 한 거죠. 일종의 꾸밈이에요. 일을 꾸미는 걸 좋아하는 거죠. 연극도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거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표정'은 무엇인지 김 관장에게 물었다. "미소 짓는 얼굴이죠. 서로 증오하는 얼굴이 오래가면 추해지게 마련이거든요." 아흔을 넘긴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소년 같은 미소가 번졌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덕후만세·(9)] 용인 한국등잔박물관 김형구 관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7/20220715010002785_5.jpg)
![[덕후만세·(8)] 김포 다도박물관 손민영 관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6/20220619010003278_1.jpg)
![[덕후만세·(7)] 파주 한향림옹기박물관 한향림 관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5/20220529010012105000604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