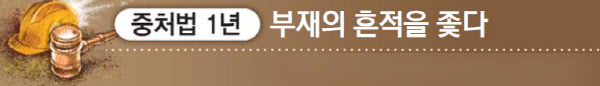자욱이 안개가 낀 지난 13일 오후 평택항. 끝이 안 보이는 축구장 35개(28만㎡) 넓이 항만에 형형색색 컨테이너 수백 개가 포진해 있다. 그 사이로 중장비들이 굉음을 내며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6층 높이 이동식 크레인(TC)이 하나에 20t가량인 컨테이너들을 천천히 옮기고 있다. 2년 전 선호씨는 이 중 300kg 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이곳에서 만난 50대 남성 김모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TC 운전을 10년째 하고 있다. TC는 마치 '움직이는 아파트'와 같은 모양새로 수십 t의 컨테이너를 나르는 만큼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김씨는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
"사람 부족해 10명할 일 8명 소화"
한 달전에도 거대장비 충돌 아찔
당국의 안전 점검은 잦아졌지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 요소들은 여전히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김씨는 "단속 기간에나 조심하라는 지시가 나오지, 현장은 늘 똑같다"며 대수롭지 않은 듯 이야기했다.
겨우내 폭설로 항만에도 눈이 쌓이면서 경로마다 미끄럼 구간이 생겼다. 제설작업자들이 화물차량 운반 경로 중심으로 눈을 치웠지만, 정작 TC 같은 중장비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방치하는 일이 많았다. 이 때문에 한 달 전에는 커다란 장비가 펜스에 충돌하는 아찔한 일도 벌어졌다.

상흔은 온데간데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재건'에 성공한 곳도 있다.
이날 오후 이천시 모가면의 한익스프레스 남이천저온2센터는 화물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와 팔레트를 짊어진 지게차가 바쁘게 오갔다. 막혀 있던 대피로, 우레탄폼 근처에서 튀던 용접불꽃 등 재해 원인이 곳곳에 퍼져있던 장소는 이제 화물 상·하차가 이뤄지는 도크 9개가 자리 잡은 대규모 신축 건물이 됐다.
이곳 물류창고 인근에서 만난 한 노동자가 어느 5층 건물을 가리키며 "저기가 3년 전에 불탔던 곳"이라고 짚기 전까진, 화염에 휩싸여 김형주씨를 비롯한 38명이 사망한 장소라는 걸 떠올릴 수 없었다. 2020년 4월 29일, 검게 그을리고 타버려 앙상한 철골만 남았던 공사 현장은 그렇게 어느새 계획됐던 물류창고 청사진 그대로 너끈히 일상을 회복했다.
책임자들 감형… "방지대책 없어"
청년노동자 김태규씨가 일하다 숨진 수원시 고색동의 공사 현장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며 사고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다. 16일 오후 여러 개의 기업이 입주한 이곳은 산업단지 내 여느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주차된 차들로 빽빽했다. 이곳에선 태규씨의 사고를 기억하는 이가 없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노동자는 "장소는 이곳이 맞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태규씨가 일했던 업체는 사고 직후 폐업했다. 태규씨 유가족에 따르면 별도의 재발 방지책 등은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사고 이후 현장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변함없는 일상으로 채워졌다. 태규씨가 일했던 업체 등 관계자들은 지난 2021년 2월17일까지 사고 이후 2년 가량 법정에 섰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다. → 관련기사 3면([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中)] 막을 수 있는 추락, 못 막는 사이 법은 '유명무실')
/이시은·유혜연·김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