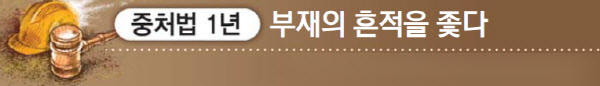"죽음에도 차별이 있나요?"
지난 2020년 12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나섰던 고(故) 김태규씨의 유족 김도현씨가 한 말이다. 도현씨는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이한빛씨 아버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제정에 앞장서왔다.
재계 논리 받아들여 법 개정 추진
노동계 "시행착오 기간 필요" 주장
유족을 중심으로 시민 사회의 연대가 이어졌다. 특히 산재사망 외에도 대구 지하철·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모여 중처법 발의로 이어졌다.
중처법 제정운동본부는 지난 2020년 9월 국민동의 청원 기준인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표였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중처법을 시행한 뒤에도 산재사고로 숨진 이들의 수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1~9월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510명으로, 1년 전(502명)보다 8명 늘었다.
이 같은 수치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노동계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시행착오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만큼 법 개정으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재계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최근 중처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는 사이 현장 노동자 중 일부는 중처법을 외면하기에 이르렀다.

평택항에서 이동식 크레인(TC) 운전 업무를 하는 김모씨는 "항만 작업은 여러 하청 업체가 일을 분업하는 형태인데 사고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가리는 게 애매하다. 따로 안전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위험한 현장이 발견돼도 본청이 따로 있으니 반영되기 어렵고 처우도 부족해서 뭔가 바뀔 거란 기대도 의욕도 없다"고 털어놨다.
화성 화일약품이 위치한 제약단지에서 만난 한 노동자는 "작업장 안전 수칙은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벌써 법을 뜯어고치려는 정부의 방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下)] 해외 사례서 찾은 방향성은?)
/이시은·김산·유혜연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