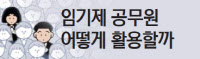공직사회의 '폐쇄성'을 쇄신하겠다는 기대감에 규모와 범위를 키운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준말·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총 인건비가 제한돼 있는 공무원 조직 운영 방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증원과 충돌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어공'이 더 많이 채용될수록 '늘공'이라 불리는 일반직 공무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 때문인데, 인구가 늘어 행정수요가 급증한 지역일수록 이에 대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게다가 변호사·노무사 등 정작 전문기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직군들은 정원 미달로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액인건비에 '일반직' 확대 못해
이른바 '어공'으로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은 지난 1998년 생산성과 전문성을 지향하는 '성과주의'를 공직에 불어넣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초기엔 연구나 실험 등 고도의 자격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에만 임기제를 제한적으로 운영했지만, 전문성에 대한 분야가 확대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분야로 급속도로 확대됐다.
실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2년 702명에 불과했던 국가 전체(국가직+지방직) 임기제 공무원은 2021년 2만4천760명으로 20년 동안 35배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공직 혁신으로 각광받던 어공이 이제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력을 제한하고 조직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가 기관의 조직에 대한 정원과 예산을 일정 비율 내에서 운영하도록 '총액인건비'로 제한했는데, 파주와 하남 등 인구 상승세가 지속되는 시군들은 이미 임기제를 지나치게 늘려 가중된 행정업무를 도맡을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무에도 임기제 공무원의 자리가 많아지며 보은인사나 특혜인사 우려도 강하다.
선거캠프 활동 등 인연 중요해져
"뽑을 사람에 따라 자리 만들기도"
특히 지자체가 2017년부터 단체장의 역점사업 추진과 보좌기구를 '전문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며 임기제 취지에 어긋나는 인사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용권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같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자격인데,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대신 선거캠프의 활동 이력과 지자체장과의 인연 등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셈이다.
변호사·노무사 자격증, 석·박사 학위 취득처럼 전문자격과 경력을 높이 요구하는 분야는 오히려 채용 수요에 비해 지원자가 없어 채용 재공고를 반복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시장이 뽑으라면 자리를 만들어 채용하는 게 관례다. 실제 전문분야가 필요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채용해야 할 사람이 먼저고 이에 따라 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다수인 게 사실"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3면([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中)]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 첫 등장… 지속되는 부작용)
/취재팀
※취재팀: 정치부 공지영 차장, 신현정·고건 기자, 지역자치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