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이태원'
되풀이해선 안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참사(慘事). 사전 뜻 그대로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추모 방식과 방법에 대한 논란도 수 십년째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 논란은 피해자, 유가족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상처다.
추모의 도리인 '우리가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각종 참사의 원인 만큼이나 여전히 후진적이다.
서울 성수대교 위령비는 일반인이 찾아가기 힘들 정도의 장소에 설치돼 있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터에는 백화점이 들어서 있다. 9년 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시설은 9년이 지난 지금도 지지부진하고, 이태원 참사 역시 포스트잇에 추모가 기대어 있는 상황.
이에 경인일보는 참사에 대한 추모 방안과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적 정비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 편집자 주

"형은 모두가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슬픔을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너희 죽음만 특별히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죽음은 위로받을 일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린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 단원고 희생자 이영만 학생의 형 영수씨가 단상 위에 올랐다. 영수씨는 먼저 떠난 동생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지난 9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사회가 조금은 알아줬으면 하는 작은 형의 소망을 천천히 읽어갔다.
누군가 희생된 일에 '적당히 해야 한다'는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영수씨는 말을 이어갔지만, 중간중간 '끼이익… 끼이익…'하는 소리가 끼어들었다.
한쪽선 '생명안전공원' 반대 집회
[[관련기사_1]][[관련기사_2]] 앞서 김종기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9년이 되는 이날까지도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호소하는 와중에는 "야, 세월호"라는 말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기억식이 열리는 곳의 반대편에서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 것.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화랑유원지 앞에서 '세월호 참사 9년 지금도 국가는 없다' 등의 팻말을 들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추모행사인 기억식이 시작하기 전부터 기억식이 끝난 후에도 "슬픔을 강요하지 마라", "유가족들의 탐욕스러운 이기심이 화랑유원지를 죽인다"는 등의 혐오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이어갔다.

이날 기억식이 열린 화랑유원지 일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이 추진 중이지만, 지금은 수풀만 무성한 채 텅 비어있다.
착공시기가 계속 미뤄지며 여전히 첫 삽도 못 뜬 것인데, 김종기 위원장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9년이 되는 이날까지도 우리 아들이 타지를 떠돌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현장엔 '미안하다' 포스트잇 가득
지난해 10월 29일 핼러윈을 이틀 앞두고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비슷한 처지다. 참사가 벌어진 지 170일이 지난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공식 조성한 마땅한 추모 공간도 없고, 유족 단체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치 중이다.
이태원 참사 역시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주체는 시민이다. 참사 직후 이태원역 1번 출구에 꽃을 놓고 포스트잇 메시지를 붙이며 압사 사고가 발생한 해밀턴호텔 옆 골목을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로 조성한 것은 추모를 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에서 나왔다.

이날 찾은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미안하다'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등 희생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일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추모 공간인 10m 가량의 철제 벽 중 고작 2m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상권 활성화와 보존 어려움 등의 문제로 추모 공간이 정비되고 있는데, 유족과 정부, 지자체 간의 추모관 조성 방안이 협의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만든 공간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 관련기사 3·4면([우리가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上)] 치유·반성 대신 책임 떠넘기기… 아픔, 아직도 '현재 진행형')
/신지영·신현정·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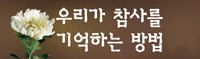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204.0379f5406224439390b517694eb055ed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