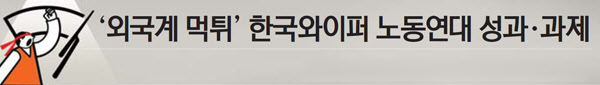'노동조합' 누구는 몰랐고, 누구는 싫어했다. 모두 눈앞 생계 때문이었다. 그런 그들이 노동조합에 발을 디뎌 생활한 경험을 이제 '보물'이라고 한다. 살아갈 길을 찾게 해줘서다.
자동차 와이퍼를 만들며 밥벌이를 했던 '한국와이퍼' 안산 공장 노동자 209명이 회사의 일방 청산 시도에 맞서 싸운 뒤 일어난 변화다. 그들은 외국인투자(외투)기업의 이른바 '먹튀'에 대항해 해고된 이들뿐 아니라 지역 고용 약자를 위해서 쓰일 '사회적 고용기금'이라는 전례 없는 결실을 맺었다.
알지 못했고 부정적 선입견의 노조
벌이 끊길 지경 이르자 눈에 들어와
1년간 투쟁 이어올 수 있던 원동력
소중했던 시간… 고용 약자 돕고파

노동조합의 끈을 잡기로 했다
김은숙(54)씨는 지난 2003년 한국와이퍼 안산공장에 입사한 20년차 '베테랑' 노동자다. 그는 둘째 아이를 가진 뒤 네 가족이 살 만한 집을 찾아 서울에서 안산으로 왔다. 국가 공단이 즐비한 안산이 수도권 신도시로 각광받던 시기였다. 그는 "맞벌이를 해야 살 수 있었다. 큰 기술이 없는 일자리를 찾다 집 근처 반월공단에 한국와이퍼 공장에 들어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동료들과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만든다는 것을 그때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최저시급 언저리 임금을 받으면서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노조활동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김씨와 10년째 같은 공장에서 일한 강명지(51)씨도 노조와의 인연은 그리 길지 않다. 그는 "직장 일도 고된데 집안일까지 도맡다 보니 노조에 대한 관심은커녕 그런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 시절을 강씨는 "빨간 날 규칙적으로 쉬고, 정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게 그저 좋았던 때"라고 짚었다.
벌이가 끊길 지경에 닿자 노조가 눈에 들어왔다. 회사의 '기획 청산' 로드맵이 수면 위로 올라온 때다. 지난 1월부터 209명의 공장 노동자가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며 공장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농성을 시작했다.
김씨는 "회사가 갑자기 떠난다고 했을 때, 뒤통수를 누가 세게 때린 기분이었다"고 했고, 강씨는 "이후 대책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와 거리를 두던, 강씨가 '떠밀리듯' 노조 조직부장을 맡은 것도 그 무렵이다. 이들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라며 노조를 믿기로 했다.

투쟁 속, 웃음꽃이 피었다
긴 투쟁기 속 지난 3월15일을 모두 잊지 못한다. 회사가 새벽부터 공장 기계설비를 꺼내려던 날이다. 강씨가 "경찰 버스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진을 치고 회사의 기계 반출을 방치하는 것을 보고 비참함을 느꼈다"던 그날이다. 이를 막아서다 조합원 몇은 뼈가 부러졌다.굳이 그날을 떠올리는 건 아픔 때문만은 아니다. 한바탕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났을까, "치킨 시켜먹고 힘내자"는 한 조합원의 우스갯소리에 이내 열패감에 휩싸인 공장의 공기에 활기가 돌았다.
강씨는 "즐겁게 웃으면서 하자는 얘기가 처음에는 농담처럼 나오다 농성장에서 윷놀이도 하고, 가위바위보도 하며 즐거운 분위기가 됐다"며 "1년여간 투쟁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나도 변했고, 우리가 변했다. 다른 변화를 만들고 싶다"
한국와이퍼가 일방적으로 기업 청산을 개시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16일 노조는 사측과 해고 노동자의 생계지원은 물론 재고용·직업교육 등을 돕는 사회적고용기금에 합의했다. 생계에 짓눌려 노조를 몰랐거나, 애써 거리를 두었던 이들이 노조라는 남은 하나의 끈을 부여잡고 만든 결과다. "노조 활동이 큰 경험이고 보물인 것"을 알게 됐다던 김씨와 강씨는 노조에서의 경험을 지역사회 고용 약자를 위해 쓸 생각이다.
강씨는 "노조에서 일하면서 '오지랖'같은 게 생겼다. 나를 지키는 데서 나아가 남을 돌보려고 하는 점에서 선한 오지랖이 아닐까.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겪었듯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고용 약자들을 돕고 싶다"고 다짐했다.
/조수현·유혜연기자 pi@kyeongin.com